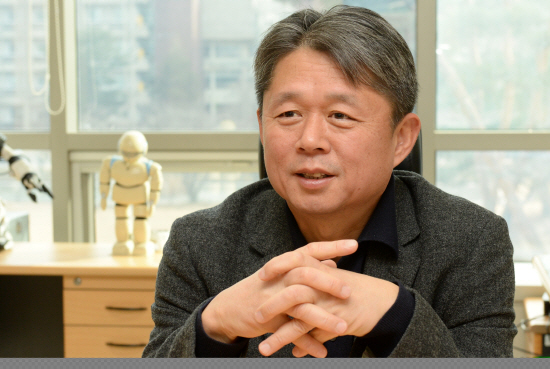|
|
"일본은 로봇 기술력이 앞서 있지만 크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연구를 위한 연구, 학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죠. 정작 무서운 것은 미국과 중국이에요. 특히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방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개발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중국이 로봇 분야에서 워낙 세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로봇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의 참여와 투자 확대가 절실합니다."
김문상(59)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로봇·미디어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이 로봇 비즈니스 생태계와 플랫폼을 구축하고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국내 로봇 산업이 성장하려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장악해야 하는데 한국 기업은 경험이 없고 의지도 부족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책임연구원으로부터 글로벌 로봇 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을 들어봤다.
김 책임연구원은 지난 1980년대 말부터 30년 동안 로봇 개발에 매진해온 국내 지능형 로봇 개발 1세대다. 실버케어 로봇인 '실벗(SILBOT)'을 비롯해 탁상형 얼굴로봇 '메로(MERO)', 2족 보행로봇인 '키보(KIBO)'가 김 책임연구원의 손길을 거쳐 탄생했다. 이 중 실벗과 메로는 상용화돼 일반에 판매되고 있다. 실벗은 일본 소프트뱅크가 지난해부터 판매하고 있는 감성로봇 '페퍼'와 견줘도 손색이 없을 만큼 우수한 기능을 갖췄다. 페퍼는 지난해에만 1만대 가까이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김 책임연구원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용료와 애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로 수익을 창출하는 소프트뱅크의 전략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일본은 1980년대에 '로봇 러시(Robot Rush)'가 일어나면서 전통적으로 연구인력이 많고 대학·연구소는 물론 기업들도 열심히 연구개발(R&D)을 하지만 사회구조 자체가 벤처나 신산업에 대한 지원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나라"라며 "그럼에도 소프트뱅크가 중국 알리바바, 미국 IBM과 협력해 로봇 비즈니스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생태계 선점에 나선 것은 워낙 진취적인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니와 혼다가 앞서 지능형 로봇과 2족 보행로봇을 개발하고서도 상용화에 실패한 데 반해 소프트뱅크는 일단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분석이다. 김 책임연구원은 향후 글로벌 로봇 시장은 생태계를 선점하는 국가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무서운 속도로 로봇 관련 기업과 기술을 빨아들이는 미국과 중국의 2강 체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이 로봇 회사를 대거 인수하고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솔직히 무섭습니다. 돈이 되겠다고 하면 기업을 인수합병(M&S)해 바로 플러그를 꽂습니다. 이들 미국 기업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바로 플랫폼입니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애플과의 싸움에서 힘들어하는 것은 자체 플랫폼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바이스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로봇을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지는 플랫폼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김 책임연구원은 중국의 '로봇 굴기(굴起)'도 위협적이라고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로봇 산업을 10대 핵심산업 분야로 지목하고 국가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중국 로봇 시장의 74%를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토종업체들의 기술력이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다. 김 책임연구원은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미국과 비슷한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다"면서 "재원과 시장이 있으니 기술을 갖고 있는 인력을 모은 뒤 제품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국내 로봇 산업은 94%가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돼 있고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은 발만 담그고 있는 상태여서 미국·일본은 물론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책임연구원의 분석이다. 삼성전자가 1990년대부터 로봇 연구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고 최근 SK텔레콤과 네이버 등이 뒤늦게 로봇 비즈니스에 뛰어든 상태다. 김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로봇 R&D를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 중 하나이고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했지만 상용화 단계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내 대기업들이 생태계 구축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경험이 없고 당장 돈이 되지 않다 보니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향후 로봇 시장은 산업·의료용뿐 아니라 생활지원 서비스 분야가 가장 유망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무인항공기(드론)는 이미 중국이 장악한 만큼 국내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빨리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철강·전자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새로운 산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국이 치고 나오는 속도를 보면 앞으로 2~3년, 길어야 5년 내에 거대한 로봇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면 우리나라는 미국·일본·중국이 선점한 생태계에서 기기만 파는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로봇 산업 성장을 위해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생활지원 로봇을 잘 만들어 보급을 확대하려면 정부가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못지않게 보조금 지급 등 상용화를 도와줘야 한다"면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들이 수조원을 투자하기 힘든 만큼 정부가 나서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