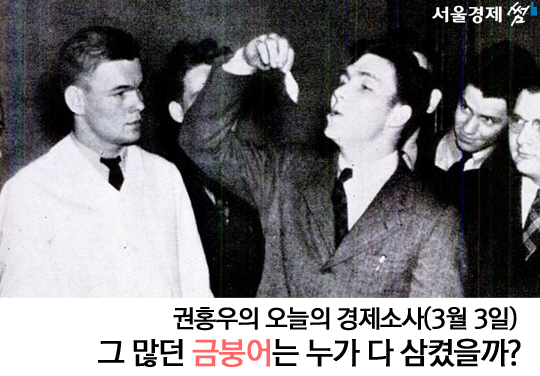미국의 수재들만 입학한다는 하버드 대학의 신입생 상견례. 새내기인 노스럽 워싱턴 주니어가 떠벌렸다. “나는 말이지, 살아있는 금붕어를 먹은 적이 있다, 이 말씀이야.” 반신반의 끝에 신입생들은 10달러 내기를 하기로 했다. ‘며칠 뒤에 사람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내기를 하자, 금붕어를 정말로 집어 삼키는지….’
소문은 순식간에 하버드대 캠퍼스를 퍼졌다. 이윽고 약속했던 날짜가 찾아왔다. 1939년 3월 3일, 저녁 학생회관. ‘공부벌레들의 미친 짓거리’를 취재하려는 기자들까지 몰려든 채 내기가 열렸다. 정작 내기는 싱겁게 끝났다. 작은 어항에서 8㎝ 정도의 금붕어를 꼬리부터 잡아 끄집어낸 워싱턴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는 으적으적 씹어먹었다. 카메라 후레시가 터진 후 주머니에서 칫솔을 꺼내 이를 닦은 워싱턴은 ‘쿨하게’ 한마디 던졌다. ‘비늘이 좀 걸리는군.’ (찰스 패너티 저, 이용웅 역, ‘문화와 유행상품의 역사’)
내기를 끝낸 워싱턴은 구매식당의 저녁 메뉴인 가자미 튀김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다. 내기는 여기서 끝났으나 워싱턴의 계산은 다른 곳에 있었다. 신입생 대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득표전략으로 삼았던 금붕어를 삼켰지만 개표 결과는 패배였다. 대신 이름만큼은 1939년도 하버드대 신입생 대표보다 널리 알려졌다.
금붕어를 삼키는 기행은 워싱턴의 이름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다. 펜실베이니아주 프랭클린 앤드 마셜 대학의 프랭크 호프라는 학생은 워싱턴을 겁쟁이라고 비웃으며 금붕어를 한꺼번에 세 마리나 먹어치웠다. 금붕어를 씹지도 않고 삼킨 그는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산 물고기에 소금과 후추를 뿌리는 퍼포먼스도 곁들였다.
호프의 기록은 이튿날 같은 반 학생인 조지 라브가 여섯 마리를 삼키며 깨졌다. 라브의 기록도 바로 무너졌다. 원조격인 하버드대학의 어빙 클라크라는 학생이 24마리를 꿀꺽 넘기며 사람들이 원하면 거미나 구더기, 딱정벌레까지 먹을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비 이성적 경쟁은 이때부터 불이 붙었다. 미시간대에서 28마리, MIT에서는 42마리를 삼킨 학생이 나왔다. 한 해부학 교수는 ‘보통 몸집의 성인 남자가 삼킬 수 있는 산 금붕어의 최대치는 150마리’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를 비웃듯 300마리를 삼킨 학생이 등장하고서야 광풍은 멎었다.
여학생들은 그나마 ‘덜 미쳤는지’ 직접 삼키기보다는 금붕어 모양의 예쁜 쿠키를 굽는데 관심이 많았다. 보스턴 대학의 여학생 베티 하인스는 금붕어 쿠키로 인기를 끌었다. 결국 금붕어 삼키기 열풍은 사건이 최초로 일어난 지 두 달 만에 붕어 모양의 과자만 남긴 채 기행이 사라졌다. 붕어빵은 유래가 달라 19세기 말 일본에서 시작됐다.
젊은이들은 왜 기행에 열광했을까. 20세기 유행을 사회학 측면에서 접근한 ‘문화와 유행상품의 역사’를 쓴 찰스 패너티는 ‘금붕어 삼키기야말로 모든 유행 중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라고 손꼽았는데, 명문 대학의 학생들이 왜 미친 짓에 나섰는가. 대공황의 와중에서 직면한 세계대전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정설이지만 기벽은 평화가 찾아온 뒤에도 이어졌다. 공중전화 부스에 많이 들어가기, 여학생 기숙사에 몰려가 팬티 얻어오기에서 스트리킹까지.
기성문화에 대한 조소를 담았던 금붕어 삼키기는 완전히 죽었을까. 의외로 생명력이 강하다. 1970년대에도 잠시 유행이 일었다. 당시 기록은 501 마리.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레오나드 맥마한이 금붕어 삼키기 대회에서 4시간 동안 1번에 3마리씩 167번에 걸쳐 모두 501마리의 금붕어를 삼켜 최고기록을 세웠다. 요즘도 잊을만하면 일어난다고….
금붕어 삼키기가 경기 쇠락기에 나타나는 반(反)문화의 치기(稚氣)라면 한국 땅에서도 언제 출몰할지 모른다. 과거와 달리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백수로 전락하는 ‘졸백’ 시대의 선택의 크기와 폭은 작디 작고 좁디 좁다. 뭔가를 깨트리는 작은 일탈을 통해서라도 위안을 얻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다. ‘젊은 세대를 위해 50~60대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물러나야 한다’던 서울대 송호근 교수의 제언이 머리를 맴돈다./권홍우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hongw@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