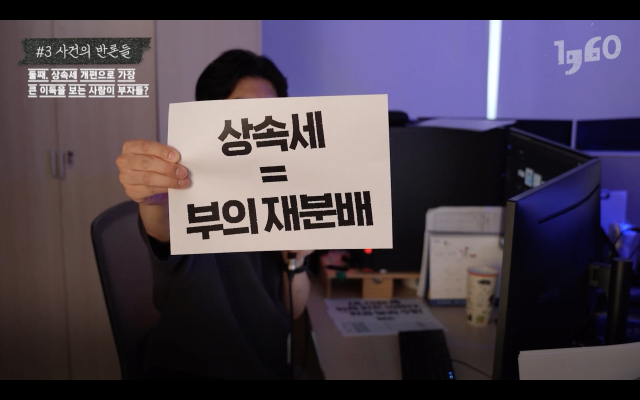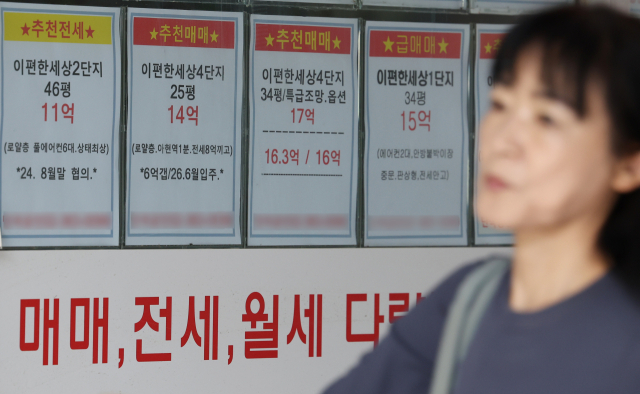|
정부의 창업지원금을 받기 위해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강요에 가까운 창업을 시도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현실은 정부의 지원금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앞다퉈 이 재원을 지원받기 위함이다. 문제는 이처럼 묻지 마 창업지원의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지난 2012년에 약 250억원의 예산으로 시작됐지만 올해는 총 735억원, 대학당 평균 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다 보니 대학들이 설익은 창업 아이템으로 무분별하게 창업을 시도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예비창업자 김모(26)씨는 최근에 황당한 경험을 했다. 그는 정부로부터 창업지원을 받는 몇몇 학생들과 함께 느닷없이 개인사업자 등록부터 서둘러 하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정부의 평가항목상 예비창업자의 사업자 등록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처지는 이해하지만 준비도 안 된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자칫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도 있다"고 성토했다.
대학들이 창업지원금을 받기 위해 앞다튀 창업에 뛰어들 것을 주문하면서 경쟁률 역시 해마다 다르지만 평균 5대1에서 10대1을 육박한다.
대학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창업했다 최근 폐업한 대학생 박모씨는 "3~4년 대학에 몸담아보니 대학들이 지원하는 방식은 교내 창업경진대회 개최, 공간 대여, 시제품 제작비 지원 등 천편일률적이고 실질적인 후속투자 연계 등으로 진화하지 않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뽑고 대학 지원으로 창업을 시작한 학생 중 일부라도 자체적인 투자에 나서는 진화된 지원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청 창업선도대학에 참가하는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3개월마다 실적을 내놓으라고 하고 창업지원을 해준 학생들은 폐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 법인이 유지되고 있는 극소수 업체들만 성공 사례로 우려먹는 게 대학들의 현주소"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최근 수도권의 한 대학이 자체적으로 개최한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한 심사위원은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최근 처음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했지만 신청학생이 고작 7명이었고 창업하기엔 준비가 너무 부족한 상태였다"며 "냉정하게 문제점을 말해주고 싶어도 대학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한 탓에 억지로 칭찬을 하며 창업을 독려했는데 이처럼 헛된 희망을 실어주는 게 과연 학생을 위한 길인지 회의가 든다"고 꼬집었다.
한 대학 교수는 "대학이 입학정원 감소로 고민하는 가운데 교육부의 대규모 대학 정원 조정사업인 프라임 사업 등 주요 정부 재정지원과 연구개발(R&D) 사업에 창업 분위기 확산 등의 요건이 성과지표로 포함되는 것 역시 대학의 조바심을 부추기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