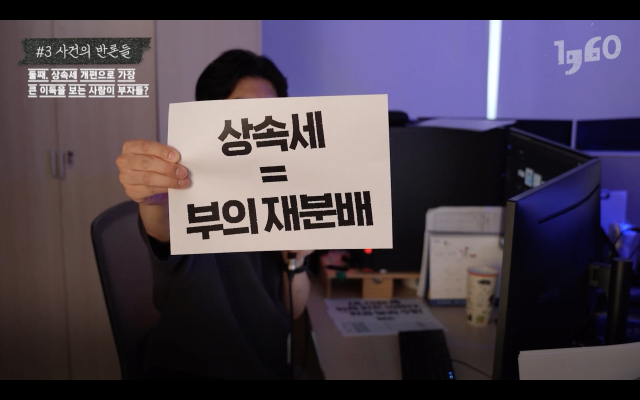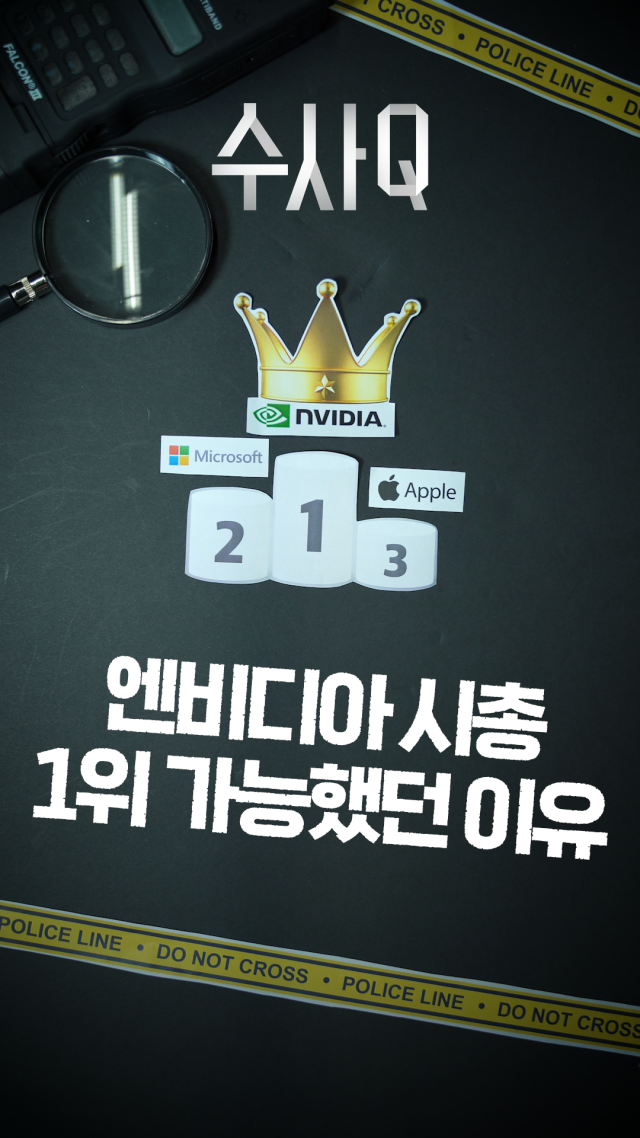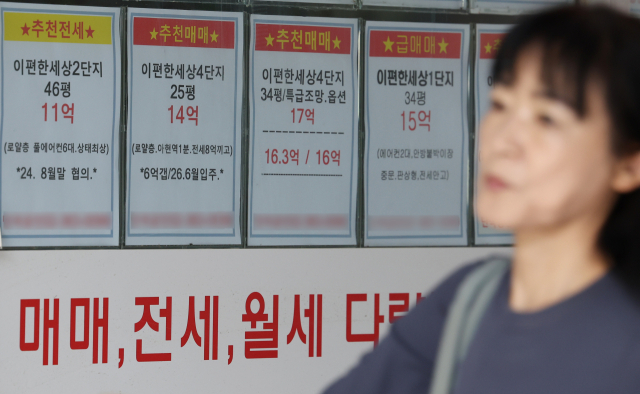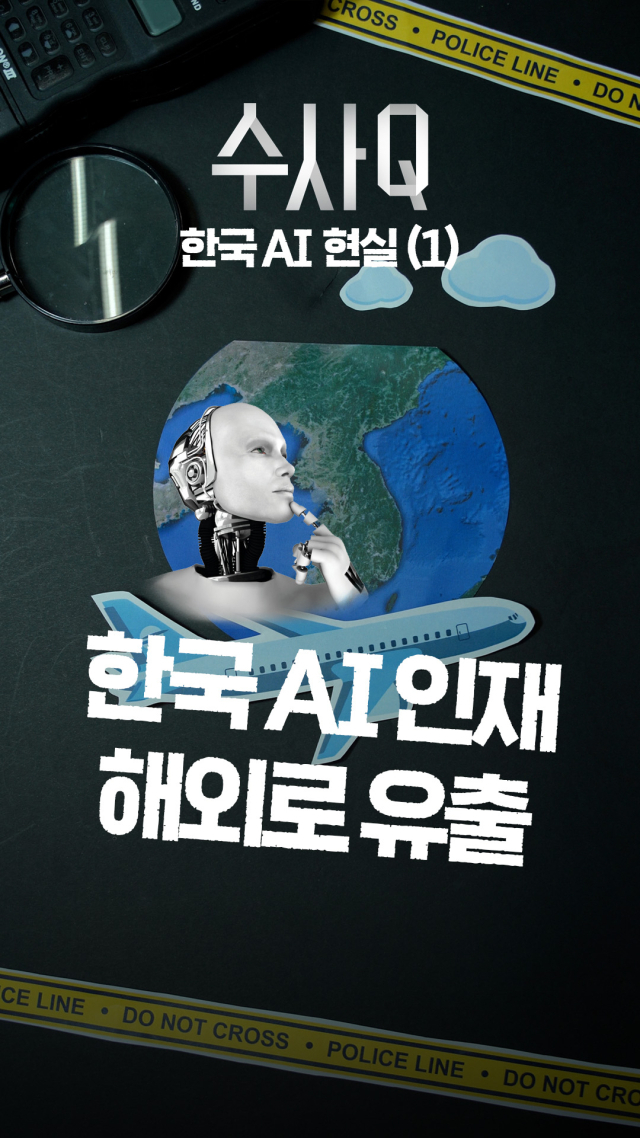하버드 의대의 신경과학자 베스 스티븐스 박사는 인간의 뇌 구조를 매우 정확히 알고 있는 학자다. 지난해 뇌 회로를 구성하고, 회로의 효율성을 높이는 미세아교세포(microglia)의 기능을 규명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현재 그녀는 이 세포가 가진 또 다른 기능들을 알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는 미 국립보건원(NIH)의 연구보조였을 때부터 인간 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교세포(glial cell)에 관심이 많았다. 교세포에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미세아교세포를 특히 좋아했다. 뇌의 10%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수년간 과학자들은 미세아교세포를 사실상 무시하다시피 했지만 이 녀석들은 시냅스를 정리하는 기능도 있다. 인간의 뇌에는 수조개의 시냅스가 있다. 그 숫자는 출생 직후 가장 많으며 자주 발화되는 시냅스는 강해지고, 그렇지 않은 시냅스는 약화된다. 미세아교세포는 바로 이처럼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냅스를 제거한다. 뇌 속의 환경미화원인 셈이다.
의학계는 몇몇 장애가 미세아교세포의 과도한 활동, 또는 너무 둔한 활동의 결과물이라 보고 있다. 이는 자폐증과 정신분열증, 알츠하이머병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세아교세포가 시냅스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뇌 회로가 잘못 연결되면서 발병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나는 미세아교세포의 기능 중 시냅스 정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최근 우리 연구팀이 미세아교세포가 배아 발생 단계에서 뇌에 유입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이토록 일찍 뇌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때부터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미세아교세포가 시냅스를 형성하는 한편, 새로 생긴 뉴런의 성장·발전의 제어에 도움을 준다는 게 내 가설이다.
작년의 성과로 맥아더 재단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미세아교세포가 관심을 받게 된 것에 감사한다. 심지어 우리 모친도 미세아교세포를 아신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팀은 미세아교세포가 신경질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나는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미세아교세포의 제어방식을 알아낸다면 앞서 언급한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제어까지 가능해지면 치료제의 개발도 꿈이 아니다.
시냅스 (synapse) - 한 뉴런과 다른 뉴런의 접합 부위. 정확히 말해 한 뉴런의 축삭돌기와 다른 뉴런의 수상돌기가 연결되는 부위.
서울경제 파퓰러사이언스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