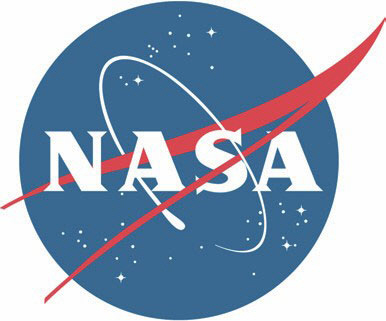1958년 창설된 미 항공우주국(NASA)은 지난 58년간 무수한 과학적 공로를 세웠다. 달에만 6차례나 사람을 착륙시켰고, 화성에는 다수의 로버를 안착시켰으며, 태양계의 모든 행성에 탐사선을 보냈다. 그리고 이제는 왜소행성 세레스나 목성의 위성 유로파처럼 더 다양한 천체로 탐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과학 기술적 성과에도 여전히 NASA가 사용하는 예산을 돈 낭비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NASA는 오히려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우량기업이라 할 수 있다.
NASA가 우리에게 준 것
NASA의 탄생은 냉전 덕택에 가능했다. 1957년 구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의 발사에 성공하자 당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우주경쟁에서 뒤쳐져 있음을 깨달았고, 그것이 이듬해인 1958년 7월 29일 NASA의 발족으로 이어진 것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우주법(Space Act)에 서명하면서 이 새로운 조직의 임무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주와 우주 기술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이에 미국은 평화적인 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추진하려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험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 모두는 그 혜택을 공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58년간 NASA는 우주라는 공간 속에서 인류와 지구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열어줬다. 아폴로 8호 임무에서 촬영된 그 유명한 ‘지구돋이(Earthrise)’ 사진을 통해 처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우주에서 바라보며 지구가 얼마나 푸르른 행성인지 알게 됐고, 1990년에는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빠져나가 태양계 전체의 모습을 한 장의 사진에 담아 보내주기도 했다.
지구로부터 59억5,000만㎞ 떨어진 곳에서 촬영된 이 사진 속 지구는 별과 별 사이에 있는 작은 점에 불과했다.
이후 수십 년간 많은 아이들이 장래희망을 물으면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고 답했다. 이 아이들이 그런 꿈을 품을 수 있던 것은 NASA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작년 7월 NASA의 뉴호라이즌 탐사선이 명왕성의 최근접점에 도달하면서 전 세계는 다시 한번 우주 탐사의 열기에 휩싸였다. 1930년 발견된 태양계 변두리의 천체인 명왕성은 한때 태양계를 구성하는 마지막 행성으로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존재지만 역설적이게도 뉴호라이즌호가 도달하기 전까지 정확한 모습을 알지 못했다. 지구에서 무려 48억㎞나 떨어진 천체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작년 7월 14일 명왕성의 진짜 모습을 본 세계는 흥분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리며 인류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했다. 비록 뉴호라이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 탐사선이 9년간의 여행 끝에 촬영한 명왕성의 근접 사진은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놀라움과 경이로움의 값어치
과학과 새로운 발견에 의한 영감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 중 하나다. 하지만 탐사, 특히 우주탐사는 절대 공짜가 아니다. 천문학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막대한 비용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로인해 우리가 체험한 경이로움과 놀라움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 우주탐사는 수지타산이 맞는 장사라고 할 수 있을까.
1972년 아폴로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래 NASA는 미 정부 예산의 평균 0.5%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4년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 약 3조 달러 가운데 NASA 예산의 비중은 1%에도 못 미쳤다. 그래도 큰돈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아폴로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됐을 때의 예산과 비교해보면 쉽게 계산이 나온다.
1961년 미국 대통령이던 존 F. 케네디는 1960년대가 끝나기 전 미국인을 달에 보내는 임무를 NASA에게 맡겼다. 당시 화폐가치로 NASA의 예산은 미국 국민 1인당 연간 20달러씩을 내는 꼴이었는데, 케네디 대통령은 이 금액를 26달러로 높여야 인간의 달 착륙이 가능하다고 여겼다.
이를 지금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국민 1인당 200달러가 넘는다. 하지만 2014년 미국 국민들이 NASA 예산으로 부담한 금액은 1인당 54달러 수준이다.
또한 케네디 대통령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5년 NASA는 무려 65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배정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작년 NASA의 예산은 175억 달러에 불과했다. 일례로 화성 탐사로버 큐리오시티의 대당 제작비는 무려 26억 달러나 되지만 이는 미국인 한 명당 41센트만 부담하면 되는 금액이다.
사실은 이렇다. 1972년 이래 NASA의 예산은 늘지 않았다. 오히려 75%나 깎였다. 그리고 그 상태를 42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 물론 아폴로 프로그램 시대의 예산을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만일 NASA가 그 시절과 같은 예산을 지원받는다면 어떤 일들이 가능해질지 궁금하기는 하다.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해선 안 되는 것
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 및 일부 회의론자들과 의 치열한 투쟁과 상관없이 NASA는 주목할 만한 과학적 업적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
다음 우주탐사 대상은 바로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다. 여기에 무인 탐사선을 보내 근접 비행 시키려 한다. 이 임무는 많은 천체 생물학자들의 흥분을 자아내고 있다. 유로파는 지구보다 많은 물을 지니고 있어 생명체가 존재할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NASA의 일부 과학자들은 2030년대를 목표로 화성 유인 탐사를 현실화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우주개발·우주탐사 프로그램에 있어 아폴로 때와 같은 호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미 정부가 그때처럼 많은 예산을 주지도 않을 것이며, 또 다른 냉전시대가 올 가능성도 거의 없다. 하지만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우주 저편에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인간의 의문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인간은 이제야 태양계의 껍질을 간신히 건드렸을 뿐이다. 수박 겉핥기 정도에 불과하다. 우주에 관한 궁금증은 아직 무수하게 쌓여있으며, 지금은 뭘 궁금해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미지의 질문들은 더 많이 남아 있다.
결국 로켓 발사와 로버 착륙, 우주 사진, 우주 유영 등으로 인류가 하나가 된,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경험에 비하면 거기에 지불한 비용은 아무 것도 아니다.
인류는 멈춰서는 안 된다. NASA의 표어에도 나와 있듯 위대한 업적을 향해 대담하게 계속 전진해야 한다.
서울경제 파퓰러사이언스 편집부/BY SHANNON STIR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