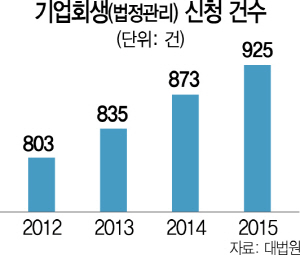31일 법원이 ‘대기업 맞춤형 기업회생’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금융권과 업계 일부는 법원의 판단이 무리라고 반박했다. 구조조정의 관건은 신속한 결단인 만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겠다는 법원의 방식이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법원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더라도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판사가 신속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하겠냐”면서 “주요 채권단만 참여하는 자율협약조차 합의되지 않아 적기를 놓치는 상황”이라고 반론을 폈다.
특히 조선·해운 업종에 무조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조선의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배를 주문한 선주가 이미 낸 선수금환급보증(RG)을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걸어둔 경우가 많다. 해운사 역시 법정관리에 가면 해운동맹(얼라이언스)에서 배제된다. 또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자율협약은 자금지원이 쉽지만 법원의 회생절차는 기업 보유자금만 활용할 수 있다.
실제 금융당국은 STX조선해양의 부실을 일찌감치 파악했지만 자율협약을 통해 자구안을 요구하고 부채규모를 줄이면서 서서히 청산시켜 왔다고 주장한다. 부실이 나타났던 2013년에 바로 법정관리에 보냈다면 실업자의 숫자나 협력업체의 피해규모가 더 컸다는 항변이다. 이번에 STX 조선 해양이 법정관리에 가게 되면 3,0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어지고 이 돈으로 50여 척의 수주 물량 중 90%까지 완성된 5척은 마무리할 자금이 된다. 건조 대금을 받아 추가로 배를 짓는 식으로 부실을 줄이면 회생할 수도 있고 청산하더라도 피해 규모는 줄어든다.
시중은행 기업여신 담당자는 “법정관리는 공평한 손실분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율협약보다 주주와 일반채권자·노동자의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다”면서 “금융채권이 많은 경우 영업력 훼손 없이 빠르게 정상기업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를 봐도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 제도만 두고 있지는 않는다. 우리와 가장 제도가 비슷한 일본은 과잉채무에 빠진 기업이 법정관리에 의존하지 않고 채권자의 협조를 얻는 사적정리 제도가 있다. 법정관리의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특별의결을 요구하지 않는다.
미국 역시 법정관리 전 사전조정제도를 둬 채무자의 절반만 동의하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한다. 법원이 구조조정 성공사례로 제시한 제너럴모터스(GM)는 미 정부가 주도했고 실무는 민간 구조조정 전문가에게 맡겼다. 영국이나 독일 역시 채권단이 주도하고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이 관여하는 사적구조조정 제도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파산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은 일본이나 영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의 모든 말을 다 고려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그룹별 의견을 수렴해 대표자가 전달하면 중구난방으로 주장을 펼 때보다 오히려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금융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과 법원 중심의 회생절차 두 제도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기업 상황에 맞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부실 초기라면 빠른 의사결정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자율협약이 유리하고 막바지라면 모든 이해관계자가 부담을 나누는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이 맞다”면서 “개별기업이 가장 적합한 방식을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