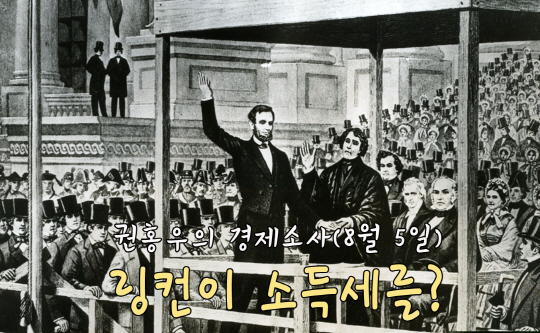1만6,000명. 남북전쟁 발발 직전 미군의 규모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연방군(북군)의 규모는 220만명. 병력을 유지하고 전쟁을 치르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다. 남북전쟁 발발 1년 전인 1860년, 하루 평균 17만2,000달러였던 연방정부의 하루 지출 규모가 섬터 요새의 포성이 울린 지 3개월 만에 100만 달러로 뛰었다. 전쟁 말엽에는 하루 380만 달러가 들었다.
가뜩이나 1857년 공황*의 여파로 재정 여유가 전혀 없던 상황. 북부는 자금 압박에 시달렸다. 링컨 행정부의 자금 조달 수단은 세 가지. 빌리고 찍고 거뒀다. 국채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새로운 지폐인 그린백(greenback)을 찍어내며 세금 징수를 늘렸다는 얘기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게 증세. 링컨은 특별 의회를 소집해 관세율과 재산세율 인상, 소득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혁을 밀고 나갔다. 링컨의 서명으로 법이 발효된 날짜가 1861년8월5일. 남북전쟁 발발 105일 만이었다.
소득세 부과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사상 세 번째. 전한(前漢)을 멸망시키고 신(新)나라를 세운 왕망(서기 10년께 징수)이 시초였다. 서구에서는 나폴레옹과의 전쟁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려던 영국의 소(小) 피트 총리(1798년 징수)가 처음. 미국은 중국과 영국에 이어 소득세법을 도입했다. 세율은 연평균 소득 800달러(2015년 14만5,000달러에 해당·비숙련공 임금 상승률 기준) 이상인 경우 3%를 일률적으로 거뒀다. 당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계층은 전체의 3%였다고 전해진다.
링컨 행정부의 소득세는 첫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세수가 부진하자 북부는 1862년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율도 전반적으로 올렸다. 연 수입 600달러 이상이면 3%, 1만 달러를 초과하면 5%의 세율을 매겼다. 새로운 소득세법은 세금 납부 기피자를 골라내기 위해 연방 징세관(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제도 도입까지 명시했다. 오늘날 미국 국세청(IRS)의 모태가 전비 마련을 위해 탄생한 것이다.
야당인 북부 민주당의 반대는 물론 위헌 논란에서도 소득세는 유용하게 쓰였다. 주로 관세에만 의존하던 국세 세입이 늘어나 북부는 전쟁비용의 21%를 세금으로 충당했다. 전비의 67%를 조달한 국채발행 다음으로 요긴하게 쓰인 것이다. 소득세는 1872년 소멸, 1893년 부활 과정을 거치며 위헌 논란**을 야기했으나 1913년부터는 연방의 항구적인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다. 2차대전과 한국전쟁 기간 중에는 세율이 92%까지 뛴 적도 있다. 2차대전이 한창일 때 루스벨트 대통령은 고소득자에게는 연간 2만5,000 달러 이상 소득에 대해 100%를 과세한 적도 있다.
주목할 대목은 미국에서 불복 소송은 많았으되 세금 포탈은 많지 않았다는 점. 92~100%의 세율을 적용받으면서도 기꺼이 세금을 냈다. 미국의 소득세 도입으로부터 155주년. 태평양 넘어 한국을 본다. 소득세는 세수의 3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세목이다.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얼마나 제대로 내고 있는지 의문이다. 온갖 탈세 의혹에도 고위 공직에 오르는 게 다반사다. ‘거래 관행’이라고 둘러대면 그만이고 대중은 곧 잊어버리니까.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hongw@sedaily.com
* 경제사가 찰스 킨들버거의 역저 ‘광기·패닉·붕괴, 금융위기의 역사’에 따르면 1857년 미국 공황은 인류가 경험한 최초의 국제적 공황이었다. 뉴욕의 보험회사 파산으로 시작된 이 공황의 기저에는 두 가지 원인이 깔려 있었다. 철도 붐과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금광 개발 열기(California Gold Rush)의 후유증이 그 것. 1848년 발견된 거대 금광의 금 생산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 설상가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금 14톤을 싣고 동부로 향하던 센트럴 오브 아메리카(Central America)호가 카리브해에서 침몰, 경제위기를 심화시켰다. 전쟁이 터지지 않았다면 링컨은 임기 내내 경기 침체에 시달릴 뻔 했다.
** 소득세를 둘러싼 위헌 논란은 연방 헌법 1조2절3항의 ‘직접세는 주의 인구비율에 따라 부과한다’는 조항을 둘러싼 해석 차이 때문이었다. 연방헌법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 미국 정부는 직접세인 소득세를 일부러 간접세로 분류하는 꼼수를 부렸다. 소득을 근거로 세금을 매겨야 하는 소득세를 인구비율에 따라 부과할 수 없었기에 ‘소득세는 간접세’라고 우겼던 것이다. 링컨 행정부도 남북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이 방법을 써먹었다.
소득세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은 1893년 발생한 공황을 맞아 더욱 불거졌다. 재정 확충을 위해 연 4,000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해 2%의 소득세를 부과한 윌슨-고맨법이 통과된 직후에는 소송도 잇따랐다. 대표적인 게 폴록 사건. 뉴욕의 농민금융신탁회사가 ‘납세의무가 있는 고객의 명단을 당국에 제출하겠다’는 통지문을 돌리자 소액주주였던 찰스 폴록은 ‘직접세인 소득세를 인구 비례가 아니라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은 1895년 4월8일 최종심에서 5대4로 폴록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재산가들은 환호했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대법원이 헌법 해석상 오류를 범했다’는 여론 속에서 의회는 1913년 ‘연방은 인구 수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징수할 권한을 갖는다’는 수정헌법 16조를 통과시켰다. 부자들은 폴록 판례를 근거로 ‘연방세금 무효’ 소송을 잇따라 걸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승소하지 못한 채 소송비용만 날렸다. 미국의 연방 소득세도 이때부터 굳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