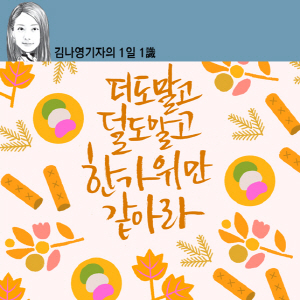‘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에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의 정취가 풍기는 듯하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우는 따뜻한 광경.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건 여전히 추석이 되면 그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지 못했던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만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명절하면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따라 붙기 시작했다.
가족의 품에서 환영 대신 상처만 받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같다. 차례상 분쟁·취준생 서글픈 추석나기·명절 전후 이혼율 급증 등 추석 연휴가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쏟아지던 기사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 아침에도 꼬리에 꼬리를 문다. 특히 올 추석에는 폭력사건이 눈에 띄었다. 추석 여행 대신 친정에 가겠다는 아내를 폭행한 남편, 재산 분배에 불만을 가지고 형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듣기만 해도 가슴이 턱 막힌다. 차라리 완전히 남이라면 세상이 흉흉하니 그런가 하고 넘어갈 텐데. 가까운 사람에게 가하는 무차별적인 폭력은 사는 게 어려워서라는 핑계가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생면부지의 제3자 ‘묻지마 폭행’과 남편이나 아내 심지어는 자식을 상대로 분풀이를 하는 건 엄연히 다르다. 전자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특별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뚜렷한 동기마저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가해자가 화가 난 그 순간 가까이 있던 누군가가 피해자가 되고 만 것. 도망간 아내에 대한 불만 때문에 성당서 기도 중이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노인에게 느닷없이 발길질을 하는 식이다. 그러나 가족을 상대로 하는 폭력은 관계와 동기가 분명하다.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촌지간이라고 해도 어쨌든 일면식도 없는 타인보다는 가까운 사이다. 둘 사이에 감정적으로 얽힌 특정 사건이 존재한다. 이유는 물론 다양하다. 툭 던진 말 한마디일 수도 돈 문제일 수도 있다. 서로에 대해 잘 알 테니 이해의 폭도 넓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섣부른 낙관인 듯 싶다. 강력범죄 대부분이 아는 사람을 상대로 일어나지 않던가. 실제로는 감정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내의 역치가 훨씬 낮게 작용한다. 사소한 일도 쉬이 넘어가지 못하고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내가 상대방을 잘 아는 것만큼 상대방도 나를 잘 알 거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기대가 독이 되기 때문이다. 본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반응에 대한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면 놀람과 더불어 서운함이 밀려든다. ‘우리가 어떤 사인데’ 또는 ‘네가 나한테 어떻게’라는 생각까지 이르면 분노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 부모에게 사정이 어렵다고 눈물로 호소했는데도 남동생에게만 재산이 돌아가자 결국 친정집에 방화까지 한 사건은 ‘가깝다고 생각한 누군가가 나를 내쳤다’는 생각이 발단이었다. 가족마저 나를 모른척 하고 있다는 인식이 이성을 마비 시킨 것이다.
‘동일시’하는 경향도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게 만든다.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내 맘 같지 않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었던 때를 찬찬히 돌이켜 보면 가까운 친구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타인’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보다 ‘나의 분신’ 정도로 인식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감정을 돌볼 여유도 가지지 못한다.
함께 살을 부대끼고 살아온 가족이라고 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인간은 입체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으니까. 의외의 행동을 벌이고 깜짝 놀랄만한 결심을 하는 이가 있다면 그건 사람이 변해서라기 보다는 그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 이제야 드러났다고 설명하는 게 더 적합하다. 또 내가 친근하게 느낀다는 이유로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주리라는 헛된 바람도 가지지 않기를 부탁한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가족이니까’ 이해해주겠지, ‘가족이니까’ 도와주겠지. 맡겼던 보따리 찾듯 무언가를 지나치게 당당히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자꾸 잊어버리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건 사람에 대한 배려다. 배려는 누군가를 잘 안다고 과신하는 순간 옅어지기 쉽다. 오랜만에 둘러앉은 밥상머리에서 눈만 흘기다 돌아가서야 쓰겠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길 바란다’는 말이 옛말로만 치부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