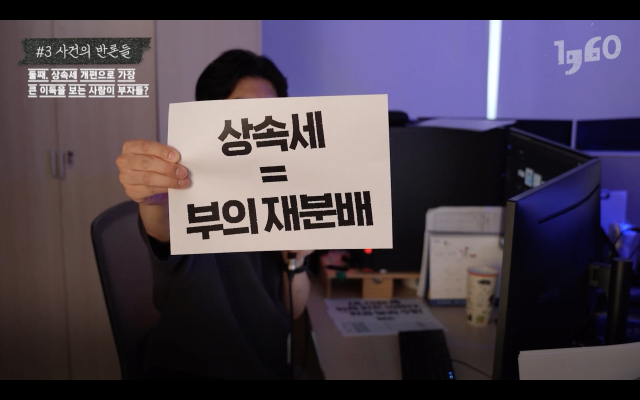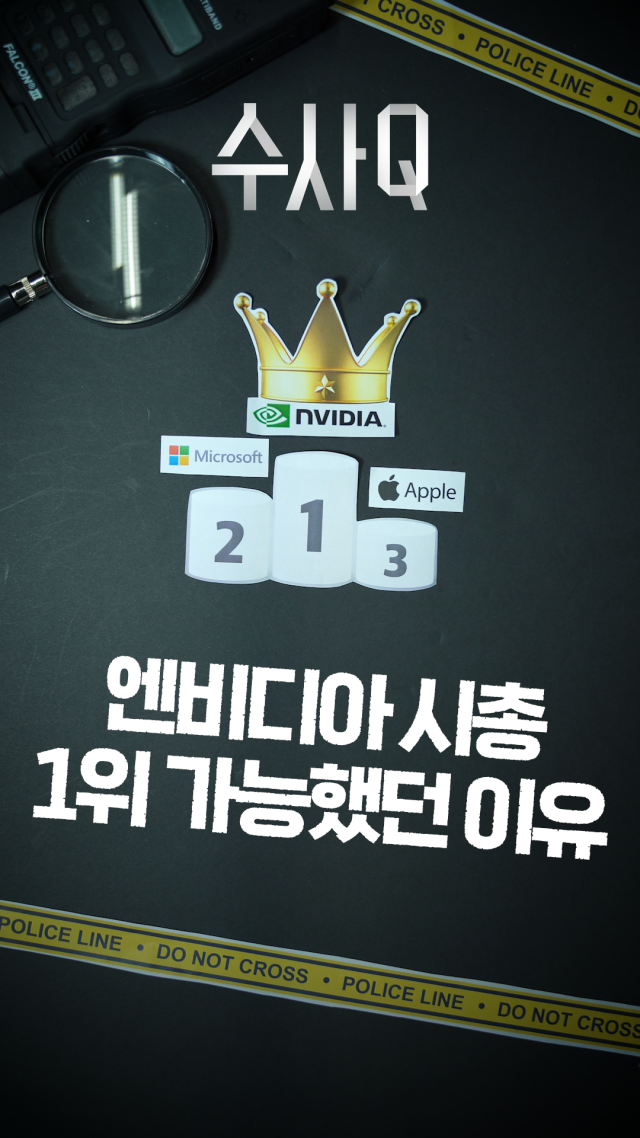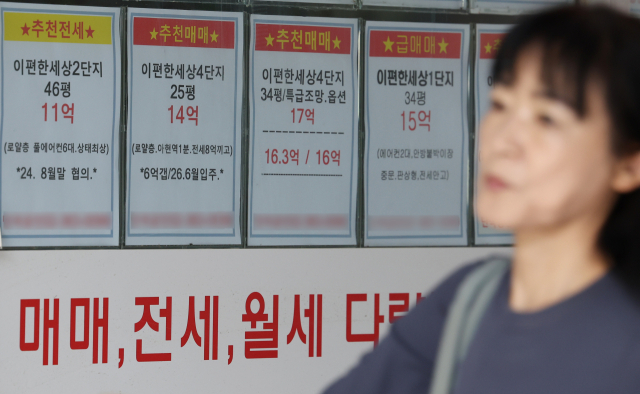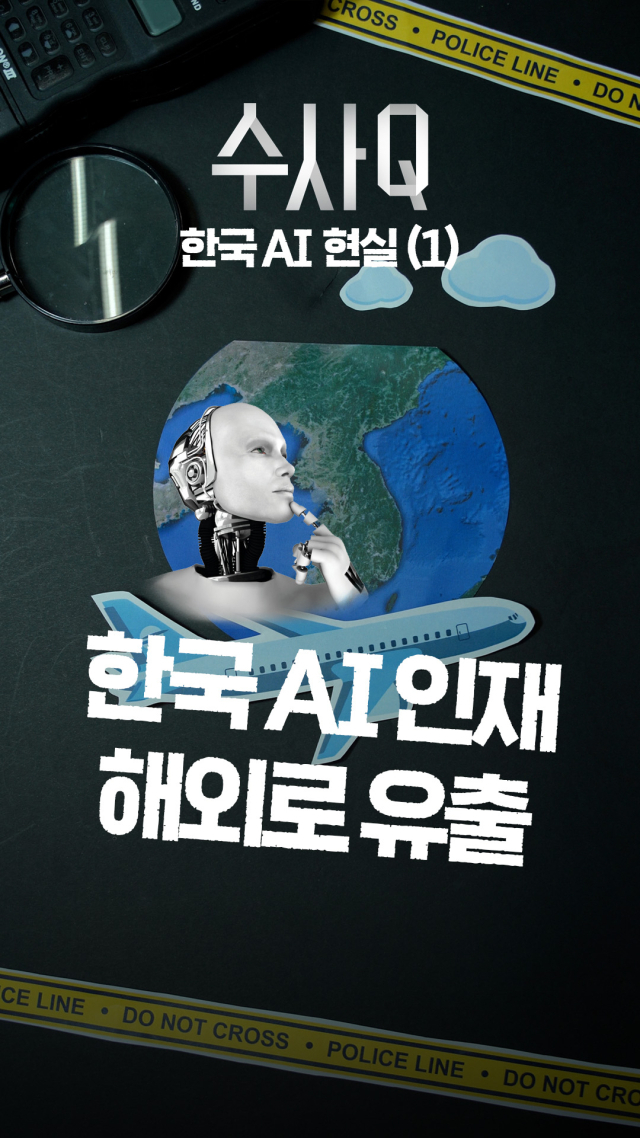인터넷이 디지털 혁명의 탄생 이었다면, 오늘날의 인공 지능은 성장을 향해 첫 걸음마를 떼어놓은 상태다. ①
오늘날의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알고리즘 데이터를 입력해 힘들게 인공 지능의 학습을 돕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인간 언어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각 언어별 특성을 익히는 등, 인공 지능의 지식을 엄청나게 늘리기 위해서는 자체 학습 능력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어떤 학자들은 인공 지능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경우 알고리즘을 수정해 주면 인공 지능은 다시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② 즉, 인공 지능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인간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학자들은 학습은 자각을 통해 얻어진다고 믿는다. 그렇기에 인간은 스스로의 한계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공 지능은 스스로의 결정을 반성함으로서도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 ③ 일각에서 증명되었다시피, 알고리즘은 스스로의 능력의 한계를 이해함으로서 옳지 않은 결정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④
그러나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 이 분야는 이상적이고 협력적이다. ⑤ 경쟁자들끼리도 오픈소스 코드를 통해 발전 내용을 공유한다.
업계는 자각을 지닌 소프트웨어가 몰고 올 파장에 대한 큰 질문들, 예를 들면 “인공 지능이 운영하는 세계 속에도 여전히 인간이 설 자리는 있는가? ⑥” 같은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때문에 연구자들이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1/ “아이들은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도, 세계 속에 빠져들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우는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를 기술 용어로는 무감독 학습이라고 부른다. A로부터 학습하지, 굳이 학습 내용을 일일이 입력해주는 B의 존재가 필요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A를 통해 바로 배우지 B의 존재는 그리 크게 필요치 않은 것 같다. 아이들은 남이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해도 말하기를 배운다.”
2/ “오늘날 우리는 45,000시간분의 음향 데이터를 가지고 대화 인식 시스템을 만들었다. 5년간 쉬지 않고 말해야 나오는 분량이다. 5년간의 대화 내용을 단지 며칠 만에 처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다. 그러나 우리 알고리즘이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는 데는 좀 짜증이 난다. 사람이라면 5년씩이나 계속 영어를 듣지 않아도 누구나 영어를 배울 수 있지 않은가?”
3/ “기존에 내렸던 결정이 아무리 서툴렀어도 좋다. 시스템이 그것들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면, 스스로의 한계를 알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스스로의 장점도 알게 되며, 합리성에 따르게 된다. 다양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이며, 완벽하지 않더라도 유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4/ “내가 만든 이 진화하는 인공 지능 도우미는 시각 기능, 자연어 기능, 다양한 수준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표정 생성 기능이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통한 예측 기능도 있다. 에릭이 10분 이내에 무엇을 할까? 그는 앞으로 얼마 정도 지난 후에야 사무실을 떠날까? 그는 달력에 적힌 약속 중 어떤 것에 불참할까? 등을 예측할 수 있다.”
5/ “오늘날 인공 지능 연구계는, 모두 함께 인공 지능을 사용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는 분위기다. 때문에 아이디어는 물론 소프트웨어까지 공유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세계를 더 좋게 만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발견 내용을 비밀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한다.”
6/ “그동안 열심히 했던 일자리에서 내쫓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에 대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연구하는 기술은 더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부의 재분배 방법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발 앞서나가는 자세로 이러한 문제들을 철저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서울경제 파퓰러사이언스 편집부/by DAVE GERSHGORN + MATT GILES

![[좌] 앤드류 응: 바이두의 수석 과학자<BR>[우] 에릭 호르비츠: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의 기술 연구원 겸 상무이사](https://newsimg.sedaily.com/2016/09/21/1L1I6YBZFL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