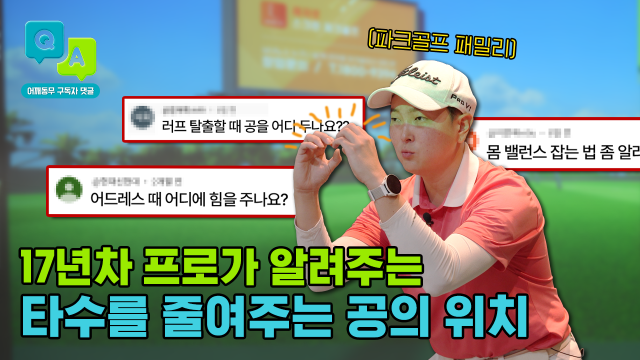브라질 리우올림픽이 한창이던 8월9일, 리우 인근 라파에 색다른 레스토랑 ‘레페토리오 가스트로모티바’가 문을 열었다. 올림픽 빌리지에서 남은 음식을 제공 받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이다. 이 레스토랑 주인은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 3개를 받은 이탈리아인 셰프 마시모 보투라. 그는 올림픽 선수촌에서 하루에 만들어지는 음식(250톤) 가운데 상당량이 남겨진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재활용할 방안을 궁리하다 무료 식당을 운영하기로 했다. 선수촌에서도 그의 뜻을 흔쾌히 받아들여 남은 음식을 기부했고 식당은 지역 주민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곳에서 올림픽 기간 중 제공한 식사는 수 톤에 달했다고 한다. 그만큼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든 셈이다. 이처럼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려는 시도가 지구촌 곳곳에서 활발하다. 특히 세계 음식물 쓰레기의 40%를 배출하는 유럽지역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체 음식의 3분의1가량을 버리는 식습관에 대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2억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이라고 비난하고 환경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음식 기부를 활성화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법까지 제정됐을 정도다. 이탈리아는 식품 기업이나 유통업체가 음식물을 많이 기부하면 쓰레기 처리 관련 세금을 깎아주고 복잡했던 음식물 기부 절차 및 문건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만들었다. 독일 식당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면 1∼2유로를 내는 ‘다 먹든지 돈 내든지(eat up or pay up)’ 캠페인이 한창이다.
영국에서도 첫 음식물 쓰레기 슈퍼마켓인 ‘위푸드(WeFood)’가 문을 열었다고 인디펜던트지가 최근 보도했다. 북부도시 리즈에 생긴 이 슈퍼에서는 유통기한이 갓 지났거나 품질이 좋지 않아 버려지는 음식을 모아 판다고 한다. 대다수 유럽국은 유통기한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데다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걸로 인정되는 사용(소비)기한이 유통 기한보다 꽤 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남은 음식에 이상이 없더라도 잔반은 잔반일 뿐, 이를 먹어야 하는 사람들의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 /임석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