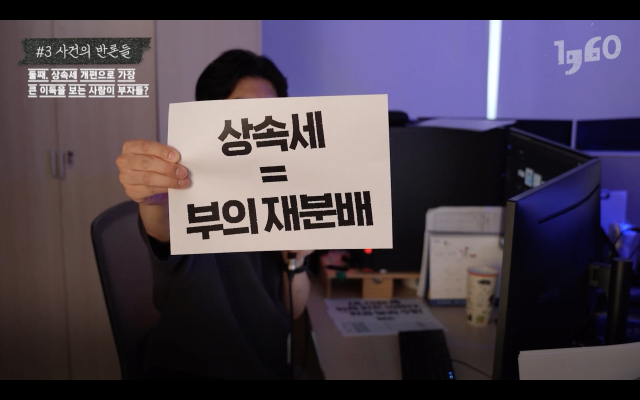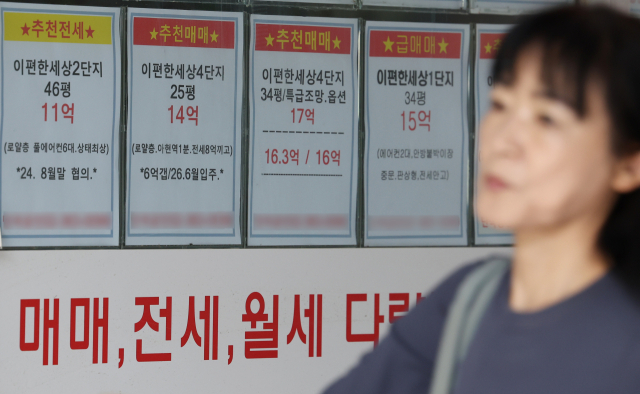평일과 주말 할 것 없이 하루가 멀다하고 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다.
물론 나도 그랬다. 기름값, 밥값 한 번 받은적 없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회비를 모아 아픈 동물들을 치료까지 하는 고정 봉사자들의 모습은 지금 돌이켜봐도 이유를 잘 모르겠다.
고정 봉사자 이모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하다보니 이렇게 됐다’고 한다. 시작과 끝이 정해지지 않은 일인 만큼 봉사에 대한 생각은 자유롭고 다양하다. 얽매이는 것이 아니므로 즐겁기도 하다. 물론 이따금씩 이를 넘어서는 아픔을 피할 수는 없지만.
7개월간 센터를 관찰하며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은 외로움이었다. 제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곳에 갇힌 동물들의 외로움이 먼저였지만, 그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 못지않은 외로움을 안고 있었다.
처음 친해진 이모는 매일같이 직원들이 출근할 시간에 맞춰 센터에 올라왔다. 고등학생 아들을 차로 등교시킨 뒤, 그 길로 센터에 온다고 했다. 이모는 6개월 이상 평일이면 어김없이 분양동에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이모에게는 갱년기가 왔다. 모든 것이 귀찮아진다는 그녀는 센터의 동물들에게 많이 의지했다, 그런 이모를 바라보며 이곳에서의 일상이 심리적으로 지치고 외로운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시작했다.
다른 한 이모는 개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안락사에 직면한 몇 마리는 그녀에게 입양됐다. 불쌍하다고 입양한 믹스견이 거대해지는 바람에 온 집안이 작살난다며 불평불만을 해도 나중에는 항상 괜찮다고 했다. 유학간 자녀, 사업차 육지와 섬을 오가는 남편으로 인한 외로움을 센터 식구들로 치유받는 것 같았다.
방학이 되면 꾸준히 센터를 찾는 학생들도 많았다. 몇몇 여고생들은 동물을 너무 좋아하지만 집에서 기를 수 없다며 정기적으로 센터를 찾아왔다. 하루에 버스가 몇 번 오지 않아 멀리 떨어진 제주대학교 정문에서 택시를 타고 다닌다고 해 몇 번 집에 데려다줬다.
한국인 남편을 둔 홍콩국적의 한 누나는 고양이동을 전담한다. 늘 좁은 케이지에 갇혀있는 고양이들에게 그녀는 엄마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녀가 봉사를 시작하고 두 달여 만에 고양이동은 마치 고양이카페처럼 몰라보게 달라졌다.
센터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 일부는 법인 설립과 함께 분양될 수 없는 동물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애견카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처음 말이 나왔을 때부터 나는 사업성이 없다고 극구 말렸으나 일이 어떻게든 풀려가고 있는걸 보면 이들의 열정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들은 모두 센터를 통해 위로받는다. 각자의 아픔, 각자의 외로움을 버려진 동물들에게 투영해 아낌없이 돌보다 기쁜 마음으로 분양한다.
정에, 사랑에, 사람에 대한 외로움을 다 아는 듯 센터의 동물들은 봉사자가 어디에선가 쉬고 있으면 조용히 주위를 둘러싼다. 이들을 보고 있자면 꼭 말은 통하지 않지만 서로의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인력이 부족한 센터는 언제나 봉사자의 손길이 절실하다. 최근 주말봉사가 활성화되며 많은 사람들이 센터를 찾는다. 서울에서 장기여행을 온 사람도, 아이 손에 이끌려 온 부모도, 호기심에 찾는 청년도 모두 처음에는 땀만 뻘뻘 흘리다 청소가 끝나고 나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논다.
한발 떨어져 봉사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비루한 일상에서 언제 저렇게 웃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거짓웃음과 과잉친절, 헛된 배려에 취해 사람에 대한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유기동물센터는 잠시나마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식 없이 웃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