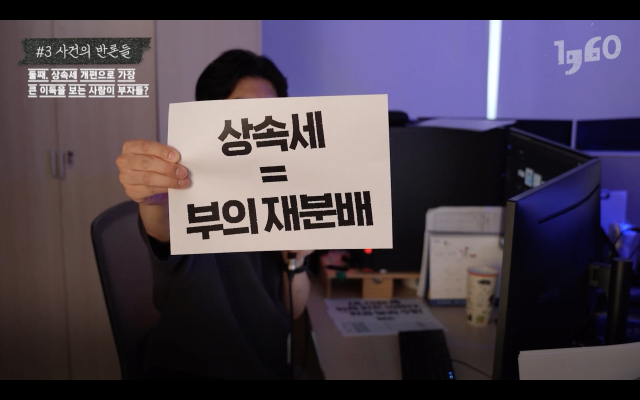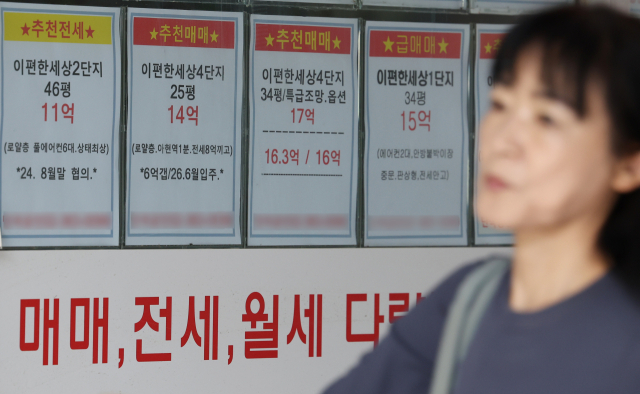우리나라 조선산업이 과거 국가 차원에서 진행된 조선업 구조조정 실패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일본에마저 밀릴 위기에 처했다. 한국 조선업이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최강이라던 일본을 제친 지(수주잔량 기준) 17년 만이다.
저유가와 경기침체로 선박 발주가 꽁꽁 얼어붙은 것은 전 세계 조선업계가 공통으로 겪는 현상이지만 유독 국내 조선소들의 일감이 빠른 속도로 줄어든 결과다.
이 때문에 대량실직과 도크(선박건조대) 폐쇄가 잇따라 오랜 기간 쌓아올린 조선산업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혹독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아 조선소들의 ‘보릿고개 넘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영국 조선·해운 전문분석 기관인 클락슨리서치는 이달 초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 조선소의 수주잔량을 각각 2,046만CGT와 2,006만CGT로 집계했다. 양국 간 수주잔량 격차는 불과 40만CGT다. 이는 4만CGT급 초대형유조선(VLCC) 10척에 불과할 정도로 근소한 차이다.
조선업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수주가뭄이 지속된다면 향후 1~2개월 내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주잔량 순위가 역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2000년 1월 당시 세계 1위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던 일본을 제치고 선두에 올라섰다. 이후 일본과의 격차는 점점 커져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2008년께 제일 크게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급부상하는 중국에도 밀려 3위로 처졌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한중일의 수주잔량이 함께 줄었지만 대형선박 위주로 수주한 우리나라 조선소의 일감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빅3’ 내 순위는 중국·한국·일본으로 재편됐다.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이 순서가 중국·일본·한국으로 바뀔 처지에 놓였다.
과거 두 차례의 정부 주도 구조조정을 경험한 일본 조선업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글로벌 경제 모범생’답게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외형을 축소해 업황 악화에 대비할 수 있는 단단한 체력을 갖췄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그 중 하나다.
하지만 그보다는 조선산업의 외형이 급격하게 쪼그라드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투자가 위축되고 핵심 인력들이 우리나라와 중국 등으로 유출돼 쇠락의 계기가 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조선업계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약화된 일본에 밀려 다시 3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은 “우리나라 조선업계 전반에 의기소침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조선산업이 사양산업화될까 심히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일본 조선소의 수주잔량 격차가 빠르게 줄어든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 조선업계가 수주한 척당 크기가 일본보다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선박 1척을 인도하면 일본은 2~3척을 인도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주잔량이 줄어드는 구조다.
실제로 우리나라 수주잔량이 톤수(CGT) 기준으로는 40만CGT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척수로 보면 483척으로 일본의 833척보다 훨씬 적다. 그만큼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수주한 선박의 척당 규모가 크다는 의미다. 선종 역시 일본은 상대적으로 건조가 쉬운 벌크선이 주력인 반면 우리나라는 수익성이 좋고 건조가 어려운 컨테이너선 위주다.
글로벌 조선업계의 판도가 급변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조선업계의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내년을 최악의 시기로 보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 협약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는 국제항로를 오가는 모든 선박은 연료유(油)의 황산화물(SOx) 함유 비율을 현행 3.5%에서 0.5%로 낮춰야 하는데 이 같은 새로운 선박 규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선사들이 내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선박을 발주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내 조선소들은 업황 개선 시점까지 버틸 방법이 뭔지에 방점을 두고 경영전략을 짜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각 조선사가 자구 계획을 확대하고 대대적인 사업재편을 하는 것은 내년 시황이 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