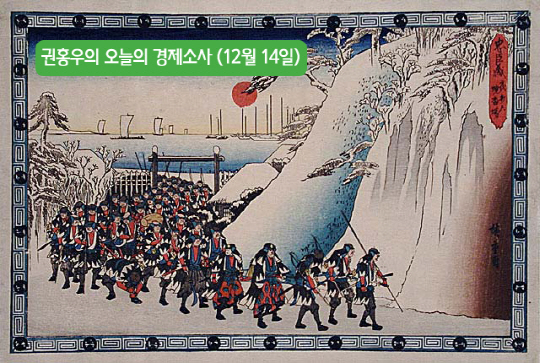‘주신구라(忠臣藏).’ 연말연시면 으레 일본의 TV에 등장하는 특집극 소재다. 세계 최장의 공연물이며 근대 일본의 정치 교육물. 개항 이후에는 일본 국민을 국가와 왕에 목숨을 바치는 황국신민(皇國臣民)을 양성하는 재료로 쓰였다. 요즘도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 빠짐없이 나온다. 서구 세계에서도 유명하다. 미국 자본으로도 수차례나 영화가 제작됐다. 주신구라의 소재는 간단하다. 주군을 잃은 사무라이 47인의 복수극.
이야기의 발단은 이렇다. ‘하급 다이묘(영주) 아사노가 수도인 에도에서 다른 다이묘인 기라에게 상처를 입혔다.’ 아사노가 분개한 이유는 술수에 빠져 격식과 예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돼 위신을 잃었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사노는 술책을 꾸민 기라의 얼굴에 칼자국을 남겨 무사로서 위신을 세웠으나 ‘할복’ 명령을 받았다. 쇼군(將軍) 앞에서 칼을 뽑았다는 이유에서다.’ 단순히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일본에서 1701년 초에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다.
사건의 이름은 ‘겐로쿠 아코(元祿 赤穗)사건’. 도쿠가와 막부의 5대 쇼군인 도쿠가와 쓰네요시(德川綱吉)가 통치하던 겐로쿠(元祿:113 대 일본국왕인 히가시야마의 연호) 시대에 아코번(赤穗藩)의 번주와 그 가신 사무라이들이 일으킨 사건이라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발단은 아코번의 다이묘 아사노 나가노리(淺野長矩)가 영접 임무에 차출되면서부터. 아사노는 일본 국왕을 모시는 조정의 신하로 막부와 중개 역할을 맡고 있던 코케닌(高家旗本) 기라 요시나카(吉良義央)를 영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조정 인물에 대한 막부의 영접 임무는 보통 10만석 이하의 소규모 다이묘에게 맡기는 게 보통으로 경비가 많이 들어 대부분 꺼렸으나 아사노는 꺼리지 않았다. 영지의 소금 생산이 늘어나 경제력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라 요시나카는 직할 영지가 4,800석으로 아사노보다 낮았으나 유명 가문 출신이어서 웬만한 다이묘는 아래로 보던 인물이었다. 아사노 역시 만만치 않았다. 군웅이 할거하던 시대인 센코쿠 시대의 사무라이 기질까지 갖고 있었다.
아사노는 내심 가문으로도 누구에게 뒤질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소규모 다이묘이지만 유명 집안에서 분가해 나온데다 일본에서는 영웅으로 떠받들던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외가쪽 후손이라는 자부심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문제는 성미가 급했다는 점. 접대 연회장에서 기라 요시나카에게 ‘접대 방식을 모르는 시골 영주’라는 모욕을 당하자 명예를 손상 당했다고 여기고는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았다.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이마에 상처를 냈지만 에도(지금의 도쿄)가 발칵 뒤집혔다.
아사노의 행위 자체는 사무라이들로부터 무사로서, 사나이로서 당연한 행동이었다는 칭송을 받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쇼군 도쿠가와 쓰네요시가 있었다. 사실상의 국왕인 쇼군 앞에서 칼을 뽑았다는 자체가 불충이던 시대에 아사노에게는 할복 명령이 떨어졌다. 소동이 일어난지 7시간 만에 에도의 번가(藩家·지방 다이묘들이 에도에 마련했던 저택)로 돌아온 그는 배를 갈랐다. 아사노’가 소유한 장원도 모두 몰수됐다. 아사노는 무사로서 명예는 높였으나 쇼군에 대한 불충의 죄를 죽음으로써 씻었다.
남은 문제는 가신 그룹. 사무라이 180명을 포함해 300여명의 가신들의 처신이 전국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아사노에 대한 처분이 과했으며 기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이익도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신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사무라이 기질이 강했다’는 평을 들어온 아코번의 가신들이 억울하게 죽은 주군과의 ‘기리’(義理)를 지키려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에 이목이 쏠렸다.
막부는 완전 무장한 정예 병력을 아코번에 보내 가신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나섰다. 예상과 달리 아코번의 무사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 막부에 맞서 싸우자’는 강경파의 주장은 허공에 사라졌다. 가신들의 우두머리(家老)인 오이시 요시오(大石良雄)는 아코번의 성을 접수하러 온 막부 사무라이들에게 순순히 모든 것을 내놓았다. 오이시에게는 비난이 쏟아졌다. ‘은혜를 모르는 자, 개보다도 사무라이….’ 싸쓰마의 한 사무라이는 얼굴에 침을 뱉었다.
아코번의 사무라이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말 그대로 주군이 없는 떠돌이 무사(로닌·浪人)가 된 아코의 사무라이 가운데 일부는 오이시를 죽이러 찾아왔다. 여기서부터 사실에 대한 추론이 둘로 갈라진다. 오이시가 진짜로 복수할 마음이 있는 사무라이들을 가려내기 위해 일부러 막부에 순응하는 척 했을 뿐이라는 설과 다른 사무라이들의 거사가 익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다 나중에 합세했다는 해석이 엇갈린다.
분명한 사실은 사무라이들이 철저한 눈속임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오이시는 1년여를 술만 마시며 윤락가에서 보냈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 여사의 명저 ‘국화와 칼’에 이 장면이 자세하게 나온다. 베네딕트 여사에 따르면 어떤 로닌은 치밀한 복수를 위해 의부를 죽였고, 어떤 로닌은 친 여동생을 원수인 ‘기라’의 첩으로 바쳤다. 모두가 옛 오코번의 사무라이들을 경멸했다. 가족도 친구도 떠났다. 오코번주 아사노의 죽음은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갔다.
반대로 로닌들은 숨어서 자신들의 복수 의지를 다졌다. 1702년12월14일(일본력) 눈 오는 에도의 밤 거리에 47인의 로닌이 모였다. 기라가 연회를 베풀어 경호가 허술했던 날, 저택을 습격한 로닌들은 기라의 가솔들을 닥치대로 베고 죽였다. 기라는 집사로 변장해 피했으나 이마에 남은 흉터로 정체를 확인한 로닌들은 자신들의 주군이 죽은 것과 같이 할복 자살하라고 요구했다. 거부하는 기라의 목을 로닌들은 주군인 아사노가 할복자살한 칼로 내려쳤다. 죽은 자는 기라 뿐 아니다. 호위 무사는 물론 여자와 아이를 포함해 기라 집안의 18명이 죽고 22명이 다쳤다.
복수를 이룬 47인의 로닌은 원수 ‘기리’의 목을 창끝에 매달고 열을 지어 에도 시내를 당당히 행진해 나갔다. 시민들은 열광했다. 로닌들을 경멸했던 가족과 친구들은 땅에 엎드려 울고 주변의 다이묘들도 달려 나와 경의를 보냈다. 주군인 ‘아사노’의 묘에 당도한 로닌들은 ‘기라’의 목과 함께 칼을 바쳤다. 스토리는 끝이 아니다. 이젠 쇼군에 대한 ‘주(忠)’의 차례가 남았다. 주군에 대한 의리와 쇼군에 대한 충성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할복자살이었다. 47인의 로닌은 주군과 쇼군에 대한 충성을 되새기며 한꺼번에 자신들의 배를 갈랐다.
여기까지가 ‘겐로쿠 아코 사건’의 전모다. 물론 사실 관계에 적지 않은 이론이 존재한다. 아사노와 기라의 개인 원한 관계부터, 쇼군가의 갈등, 소금 생산 신기술을 둘러싼 음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가지 시각은 정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이와 관련한 연극과 영화, 소설, TV 드라마, 만화가 새로 나온다. 일본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수십 차례 영화와 연극이 만들어졌다. 주신구라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일본의 ‘킬러 콘텐츠’로 통한다. 일본에서는 사건이 일어난지 1년 만에 민속극이 선보이고 1748년부터는 에도와 각 도시에서 가부키 ‘가네다혼주신구라(假名手本忠臣藏)’가 공연된 이래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 군정기 초기에 잠시 중단됐을 뿐이다.
미 군정이 이 공연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일까. 국가와 일본 왕을 위해 죽으라는 충(忠) 사상을 왜곡 전달하는 도구로 봤기 때문이다. 동물 도살 금지령을 내리는 등 에도 시대 15명 쇼군 가운데 가장 이색적인 군주로 꼽히는 쓰네요시는 로닌들에게 할복을 명령한 뒤에 아시노의 동생이 영지를 이어받게 하고 막부의 중앙관직을 맡겼다. 사무라이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이 담겼다. 개항 이후 서구를 따라잡으려는 메이지 유신 직후 일본 국왕 메이지는 로닌들과 아사노가 묻힌 곳에 칙사를 보내 로닌들에게 의사(義士)라는 찬미를 보냈다.
문제는 하도 많이 다뤄져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부터는 허구인지도 불명확한 채 일본을 미화하는 한 가지 방향으로만 나가고 있다는 점. 모두 11단으로 구성된 가부키 ‘가네다혼주신구라(假名手本忠臣藏)’가 사실에 근거한 대목은 단 4개 단 뿐이다. 또 있다. 가령 47인의 로닌은 할복 명령을 받고는 모두 의연하게 자결했을까. 일단 죽은 로닌은 46인이다. 로닌 한 명은 87세 천수를 누리고 1747년에 죽었다. 테라사카라는 이 로닌이 왜 살아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고향에 돌아가 복수의 완결 소식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와 도망쳤기에 살아남았다는 설이 나돈다. 할복하는 순간에도 십중팔구는 두려움에 떨어 사실상 처형하고 할복한 것으로 꾸몄다는 설도 전해진다.
실상이 어떻든 일본의 각급 학교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시민들은 온갖가지 작품으로 주신구라를 접한다. 판타지 소설로 변형시킨 주신구라만 수백종이라고 한다. 연말이면 일본 열도에서는 주신구라 이야기로 구시대의 무사도와 신세대가 만난다. 한국에서도 요즘 집단 자살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복인지, ‘활복’인지….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