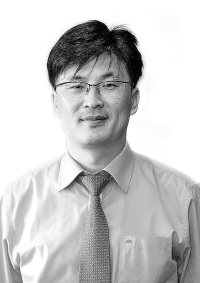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경제계를 어수선하게 하는 통계 하나를 내놓았다. 건국 이후 처음으로 제조업이 -1.8%(2014년 기준) 성장했다는 내용이었다. 전쟁의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이끈 제조업의 몰락 신호였다.
1년이 지난 후 올해의 통계는 지난해보다 더 나빠졌다. 제조업 성장률 -3.0%. 최순실 사태를 고마워해야 할 성적표였다. 곧이어 통계청이 내놓은 통계도 대동소이하다. 서비스업을 제외한 1만2,460개 기업의 매출액은 지난 2013년(2,257조원)을 정점으로 해 2014·2015년 내리 꺾이고 있다. 창업한 후 5년을 살아남은 기업은 네 곳 중 한 곳에 불과했다. 신생 기업의 75%가 5년 내에 사라지거나 활동을 멈췄다는 얘기다.
은퇴·실업자를 흡수하는 자영업은 또 어떨까. 2015년 국내 자영업자 수는 479만명으로 이 가운데 21.2%는 연매출액이 1,200만원이 안됐다. 1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고 있다.
가계 사정도 마찬가지. 중추인 40대 가구주의 가구소득은 올해 3·4분기 0.03%가 줄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처음이다. 물가를 고려한 가계 전체의 실질소득도 감소(-0.1%)했다. 5분기째 감소 혹은 0%다. 가계신용은 매년 100조원 안팎씩 늘더니 올해 3·4분기에는 1,295조원을 넘어섰다. 머잖아 1,5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가계부채의 질은 더 좋지 않다. 금리의 부담이 큰 저신용층(신용 7~10등급)의 대출 규모도 90조7,000억원이다. 가계 부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역시 165.4%로 2010년 이후 가장 높다. 원리금 상환 비율은 26%로 소비가능액의 4분의1가량을 금융부채를 갚는 데 쓴다. 부채는 많고 소득이 줄어드니 매달 100만원도 쓰지 않는 가구의 비중은 13.01%에 달해 2003년 카드 대란 때와 같은 저소득층의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다. 자연스레 ‘가계소비 위축→기업매출 급감→일자리 감소’의 악순환은 더 심해졌다. 특히 각종 고용대책에도 청년실업률은 2012년 7.5%이던 것이 매년 상승해 올해는 9.9%에 달했다. 체감실업률은 이미 10%대를 훌쩍 넘어섰다.
위기의 질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나 심지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좋지 않다. 1997년이나 2008년에는 제조업 경쟁력이 중국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선진국이나 산유국 등으로의 수출을 늘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국가의 외환이나 일부 기업이 위기였을 뿐 복합 위기는 아니었다. 더욱이 위기의 돌파구였던 수출마저 2년 연속 줄었다.
이런 와중에 최순실 국정농단을 계기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광장을 밝힌 촛불의 힘에 대통령도 탄핵돼 대한민국은 진공 상태다. 그런데도 최고 권력과 결합한 농단 세력은 한결같이 부인할 뿐 책임을 지는 이도 없다. 권력을 좇는 자들은 ‘유리한 수’를 놓는 데 몰두하고 정치에 휘둘렸던 기업도 묘수가 없다.
암울한 통계만 남은 2016년에 이어 오는 2017년 대한민국에 대해 섣불리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이유다. fusionc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