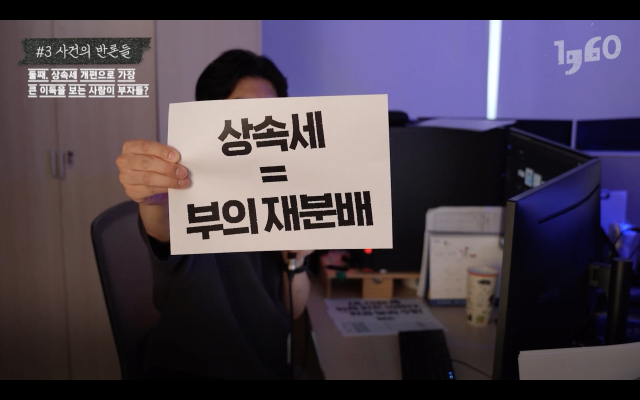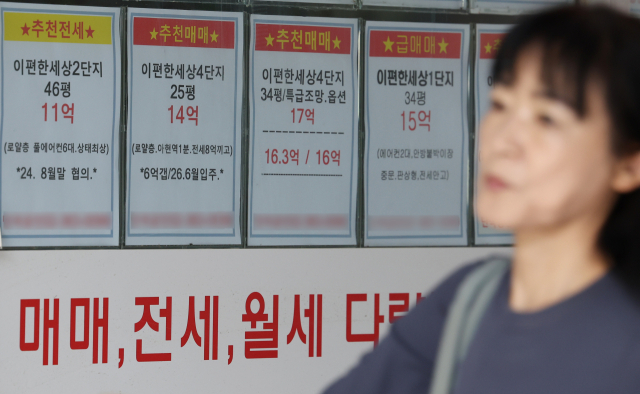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금융권에 대한 주요 감독 제도에 대해 제도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위원 절반은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위원회 설치 방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를 공약했는데 이 기구를 금융위와 금감원 중 어느 곳이 관할하느냐를 두고 팽팽한 기 싸움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에는 금융소비자보호처라는 실무 부처가 있어 만약 금융위 산하로 재편될 경우 금감원 입장에서는 권한과 조직이 줄어드는 셈이 된다.
기업 공시에 CSR를 포함하겠다는 구상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기업들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매출, 영업이익, 채무 현황 등 재무 상태와 경영 현황만 공시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CSR 성과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연례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최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이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시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자 판단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 같은 공시 의무조항 확대가 과도한 경영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인데 감독기구가 나서 ‘착한 기업’이 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이중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북핵, 통상임금, 한중관계 경색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최악인 상황에서 CSR로 사실상 의무 지출 항목을 더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