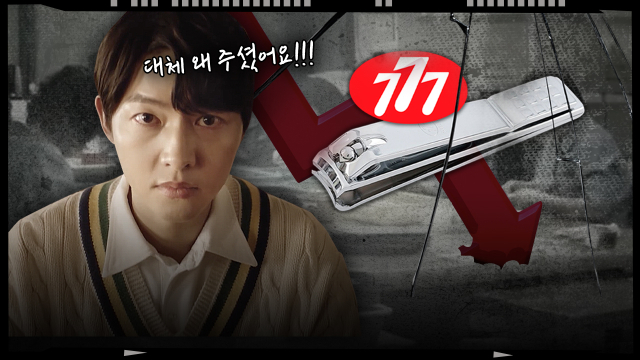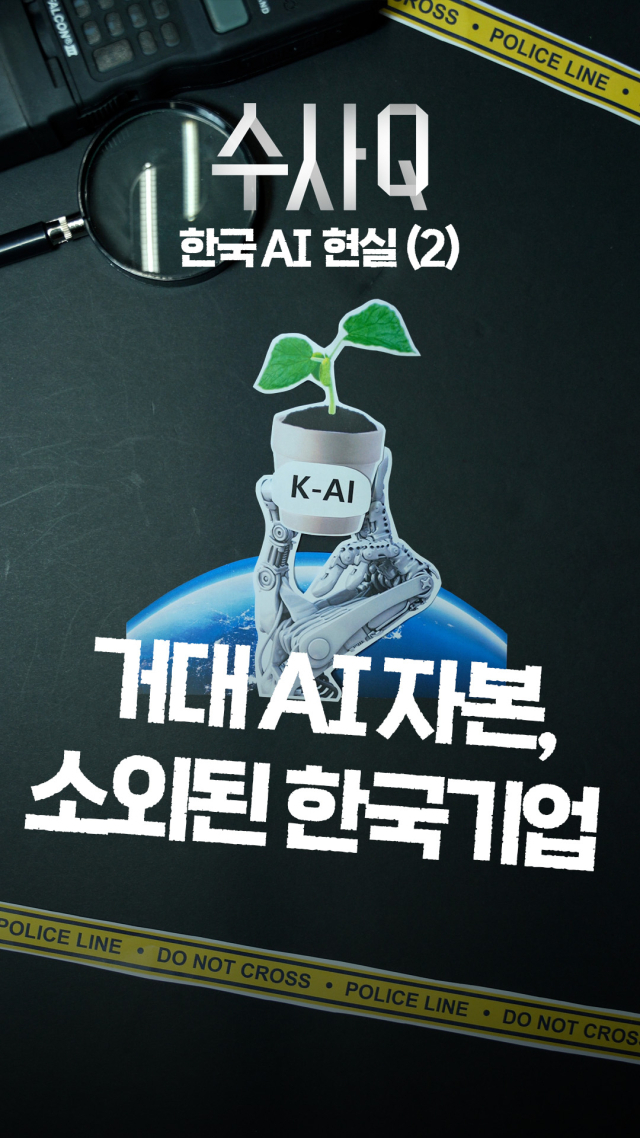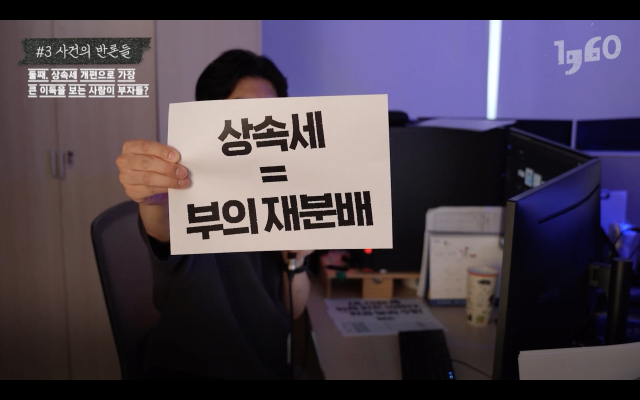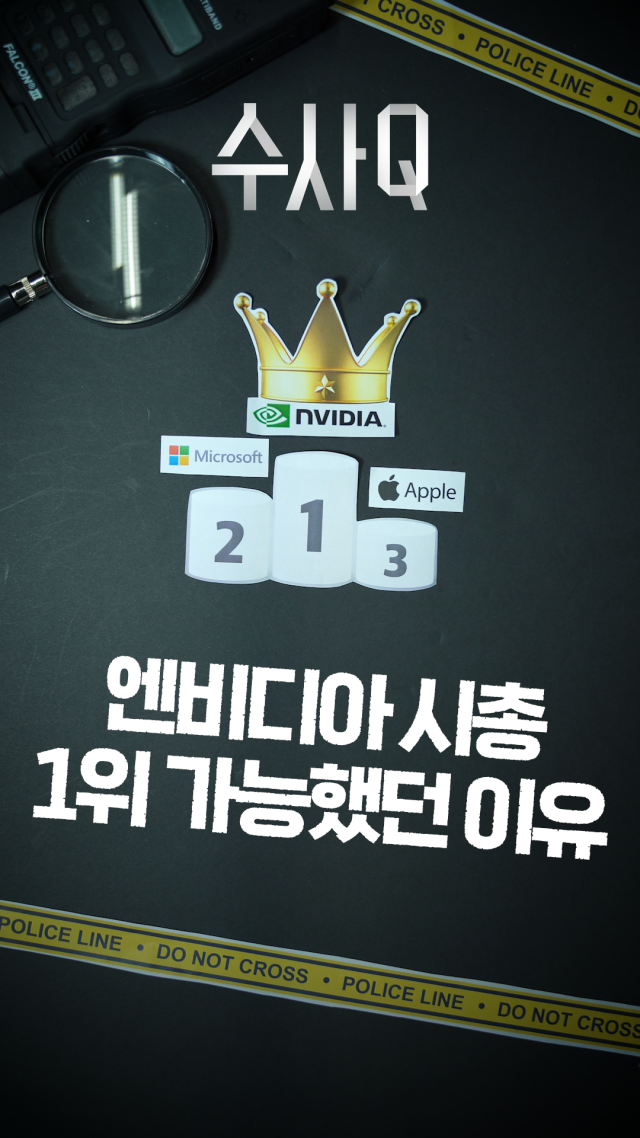외환위기가 발생하고 15대 대선이 있있던 1997년 딱 1년 전에 일어난 민주노총 전면 파업은 파국을 예고한 전조와 같았다. 항상 그랬듯 경제위기와 맞물리는 정치 이벤트는 ‘국운 쇠락’을 유인하는 방아쇠 역할을 했다. 기업의 환골탈태를 유인할 구조조정, 노동 및 공공개혁은 표 계산에 여념 없는 정치인들로 모두 ‘올스톱’ 됐다.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리더십이 절실했지만, 국회는 선거 운동으로 상임위조차 열기 어려울 정도였다. 당연히 포퓰리즘이 극에 달했다.
지금 상황도 당시와 비슷하다. 재계에서는 올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조가 타협에 더 미온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귀족노조의 잇속 챙기기가 더 노골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 부담을 늘리는 각종 정책을 소통과 설득 과정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노조 문제와 편향적 정책으로 골병들고 있는 와중에 외생변수마저 덮쳐 설상가상이다.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구사하는 미국, 북핵 해법을 놓고 틀어지고 있는 일본·중국과의 관계는 기업 경영에 직격탄이 될 지경까지 왔다. 외환위기가 금융발 위기였다면 지금은 실물경제가 그 출발점이라 불안감이 더 크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1997년 IMF, 2007~2008년 금융위기, 2017년 실물위기 등 근 10년 주기로 경제가 출렁거리고 있다”며 “현재 위기는 구조적 성격이 강해 과거 위기보다 극복이 더 어렵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포퓰리즘 득세, 수출 고전 등 닮은 환경=1997년 전후와 2017년은 데자뷔 같은 구석이 많다. 우선 정치 시즌이 경제위기와 겹쳐 있다. 외환위기 때는 김영삼 정권 말기로 대선을 앞뒀고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새 정권이 부임한 초기다. 20년 전에는 대선 시즌을 맞아 각종 개혁 작업이 좌초했고 현재는 친노조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책 쏠림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각기 다른 이유지만 노조에 힘이 너무 실리고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기는 매한가지다.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제조업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도 비슷하다. 외환위기 직전에는 매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7~9%까지 떨어졌다. 현재는 수출이 나아진 모양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착시가 많다. 올 9월만 해도 수출이 전년 대비 35% 늘었다. 그러나 반도체 증가율이 전체의 28%인 반면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와 가전제품 수출은 모두 16% 줄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빼면 우리 수출은 고작 10%대 증가에 그친다. 제조업 가동률도 올 7월 73.1%에서 8월 72%로 낮아졌다. 굴지의 대기업 중 제대로 굴러가는 곳은 LG·SK 정도뿐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주변국 압박서 냉엄한 현실 깨달아야=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1997년 12월18일은 외환보유액 역사에도 의미 있는 날이다. 이날 외환보유액은 34억달러로 역대 최저였다. 현 외환보유액(3,848억달러)과 비교하면 이는 극명히 드러난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IMF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 아시아통화기금을 통해 1,000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IMF에서 유일하게 거부권을 가진 미국이 일본에 “한국을 도와주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며 없던 일이 돼버렸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IMF의 위상이 커지기를 바랐다. 냉엄한 국제질서의 한 단면이다. 이는 지금도 통용되는 교훈이다.
요즘 재계에서는 “경제가 경제 논리로 풀리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최근 미국의 삼성·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예고 조치, 자유무역협정(FTA) 폐기까지 염두에 둔 재협상, 안보에 의한 수입제한을 뜻하는 무역확장법 활용 등을 단순히 경제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 대기업 임원은 “우리보다 훨씬 무역흑자를 많이 내는 중국·일본을 놔두고 한국만 건드리는 것을 봐야 한다”며 “미국이 한국에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관점이 통상 문제의 시작이지만 안보에서 양국 간 트러블도 (통상 마찰의) 원인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도 “지금은 정치·안보 불확실성이 경제를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실물경제 위기라 부담 더 커=현 위기가 충격요법이 통했던 외환위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기업발 위기라 ‘퍼펙트 스톰’과 같은 파괴력은 덜해도 환부 방치 시 ‘끓는 물 속 개구리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실물에서 위기가 불거지면 국가 전체로 잠재성장률을 까먹게 된다”며 “정부도 빚이 많아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최근 정부가 혁신성장론을 꺼내 든 것은 다행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교수는 “기업을 옥죄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생존을 모색하도록 숨구멍을 터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훈·한재영기자 s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