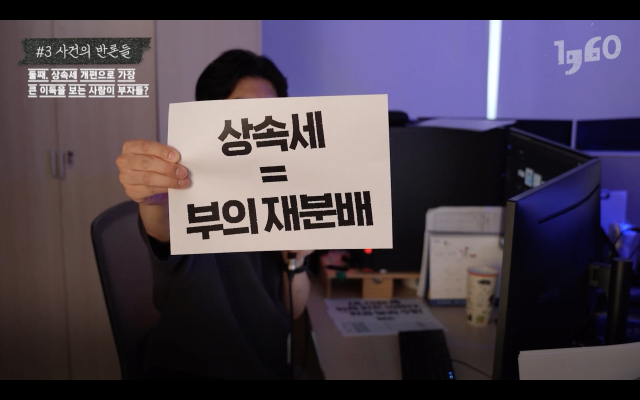1990년 여름. 미국 벤처캐피털 업체 세콰이어캐피털의 돈 밸런타인 총괄파트너 사무실에 7명의 인사가 찾아왔다. 이들은 당시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잘 나가는 벤처기업 시스코시스템스의 부사장들. 밸런타인은 이 회사 지분 30%를 쥐고 있었다. 7인의 요구는 창업주인 샌디 러너 고객서비스 담당 부사장을 해고하라는 간단하지만 충격적인 것이었다. 샌디 부사장이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는 게 이유였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모두 회사를 떠나겠다는 협박도 곁들였다. 그러잖아도 회사 운영을 둘러싸고 샌디와 마찰을 빚고 있었던 밸런타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샌디에게 사직을 요구했디. 지분 30%와 부사장 7명의 지지, 게다가 이사회까지 등에 업은 밸런타인을 샌디가 이기기는 불가능했다. 샌디는 결국 회사를 떠났고 남편이자 공동 창업자인 렌 보색 최고과학자(CSO) 역시 그 뒤를 따랐다.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미국에서는 창업자가 회사에서 쫓겨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자신이 세운 애플에서 퇴출당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소셜커머스 업체 그루폰의 창업자인 앤드루 메이슨은 실적 부진을 이유로 이사회에서 해고당한 후 직원들에게 ‘나 오늘 잘렸다’는 메시지를 남겼고 테슬라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도 신혼여행 겸 투자유치를 위한 여행 도중 페이팔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빼앗겼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것은 이사회가 강력한 권한을 쥐고 경영을 감시했기 때문. 창업주라도 경영을 잘못하면 언제든 쫓겨나는 풍토가 미국에서 자리 잡은 이유다.
또 한 번의 창업자 퇴출사태가 터졌다. 할리우드 영화 제작·배급사인 와인스타인컴퍼니는 8일(현지시간) 이사회를 열어 창업주이자 공동회장인 하비 와인스타인의 해임을 e메일로 통보했다. 와인스타인은 영화 ‘시네마 천국’과 ‘펄프 픽션’ 등을 제작해 유명해졌지만 수십년간 여배우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추문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사회 구성원인 와인스타인의 동생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사회 남성 구성원의 3분의1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사회를 가진 기업이 과연 있을까. /송영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