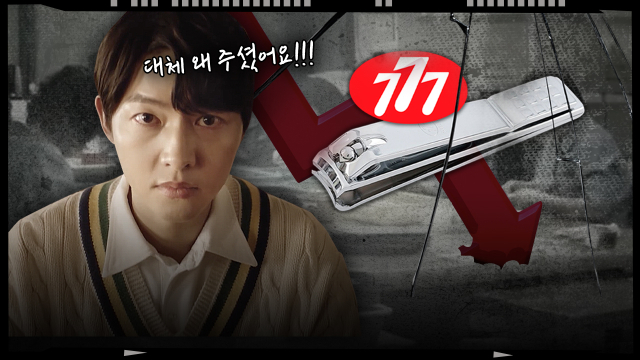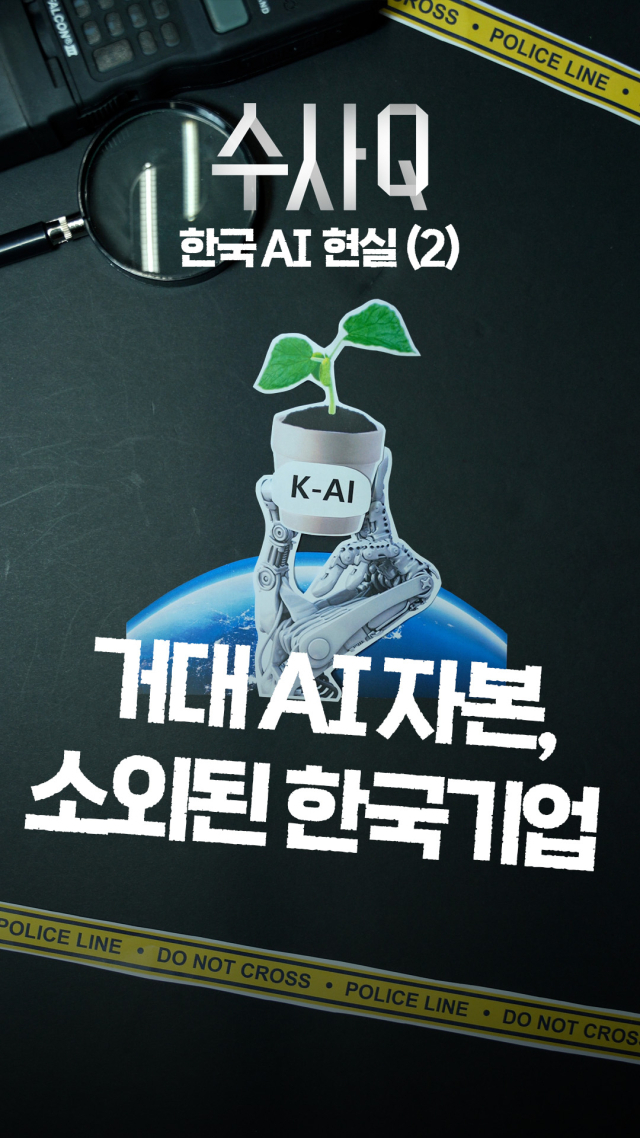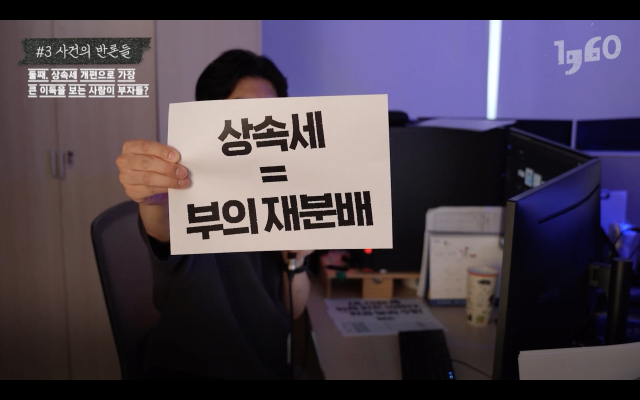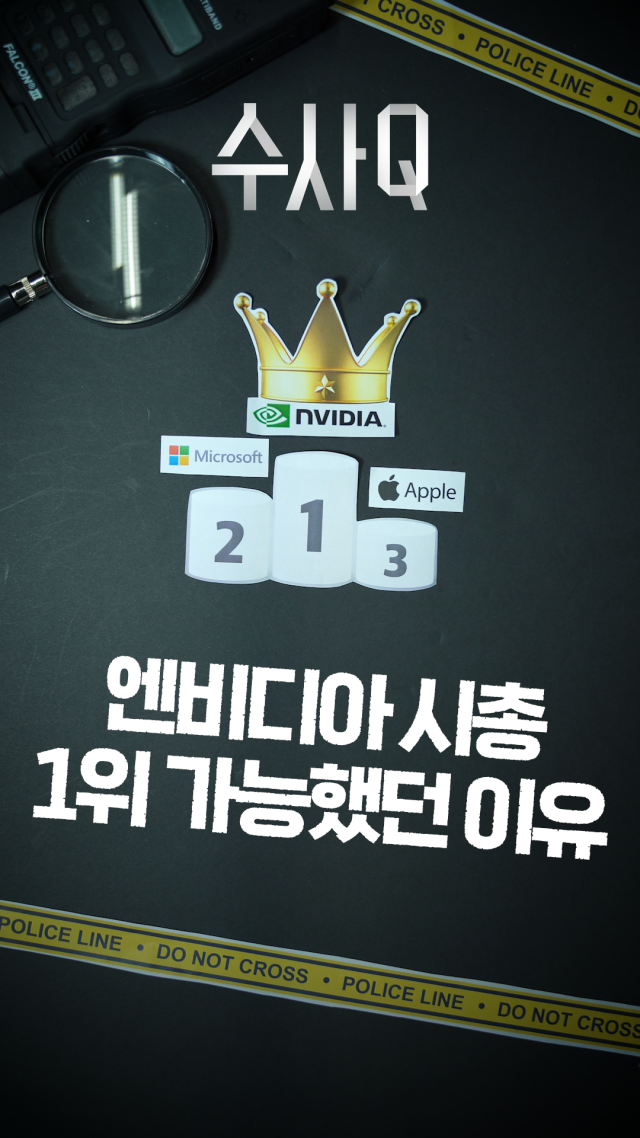지난 1997년 1월6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대기업들은 은행에서 무차별적으로 돈을 빌려 문어발식 확장을 진행하고 있었다. 은행은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공여자인 동시에 채권자로서 감시의 역할도 하는 여신심사기관이어야 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대형 금융기관은 퇴출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에 젖어 과도한 여신을 남발했다. 수출 첨병이었던 기업들은 소리 없이 곪아갔다. 부채비율은 400%까지 올랐고 차입금 의존도는 50%를 넘어섰다. 당시 부채비율은 일본(193%)의 두 배 수준이었다.
문제는 김 전 대통령이 금융개혁을 입에 올린 지 20여일도 안 돼 터졌다. 1월23일 재계 서열 14위인 한보그룹을 시작으로 삼미·진로·대농·한신공영·기아그룹 등이 부도의 길로 접어들었다. 기업들이 무너지는데도 금융개혁법안은 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의 반대로 무산됐다. 결국 국제통화기구(IMF)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결정한 다음해에 여야 합의로 금융개혁법률을 만들어 금융감독과 구조조정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미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도산한 뒤였다.
20년 전 외환위기는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젖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과신한 것이 큰 원인이었다. 구조조정에 대한 노력은 미흡했다. 경상수지 적자가 쌓여가는데도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심 악화를 우려해 원화 강세 정책을 폈다. 세계화로 대외 쓰나미가 한국을 덮치는데도 정부는 표심을 놓치기 싫어 물가 안정에만 몰두해 낮은 방파제를 쌓고 있었다는 얘기다.
반도체 슈퍼 호황으로 월별 수출액이 사상 최대(551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위기를 말하는 것도 당시의 데자뷔 때문이다. 자동차와 철강·화학·반도체 등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들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웠다. 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를 제외하면 뚜렷이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주력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드론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곳은 없다. 조선과 해운은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은 원천기술을 해외에 의지한 채 덩치 키우기를 하다가 무너졌다”며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경제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이동하기는커녕 범용제품으로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이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은 보호무역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며 우리 산업을 옥죄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위기의식 실종이다. 정부는 1997년과 같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성장을 자신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외부의 파고가 국내를 향하는데도 물가 누르기 등에 집중했던 20년 전처럼 ‘소득주도성장’으로 3%대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전체 부가가치는 낮아지는데 정부는 산업 재편으로 미래의 파이를 더 키우기보다는 현재 기업이 가진 돈을 더 분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투자 유치와 고용 확대를 위해 미국과 일본·프랑스 등 글로벌 선진국들이 법인세를 낮추고 있지만 정부는 역주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가 무엇인지, 산업 고도화를 위해 어떤 전략을 펼 것인지에 대해서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를 비롯해 정부 정책은 노동 유연성과 효율성을 키우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기업 이익이 꺾이면 당연히 소득과 성장에 대한 기대도 낮아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