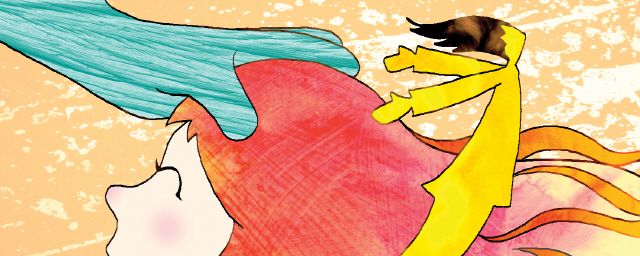유명 작가의 명언이나 영화 속의 명대사가 아니라도 좋다. 내 안의 빛이 되어주는 말들은 언어의 정교함보다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따스함’을 품고 있다. 걸핏하면 상처받고, 너무 자주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나에게는, 주머니 속 손난로처럼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타인의 말들이 너무도 그리웠다. 힘들 때마다 나를 일으켜주는 문장들, 혹은 문장이나 대화를 뛰어넘어 존재하는 비언어적 표현들은 나에게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주곤 했다.
내가 기억하는 첫 번째 ‘빛이 되어 준 말’은 고등학교 선생님의 칭찬이었다. 고교시절 나는 국어시간을 워낙 좋아해서 그 시간이 시작되기 전엔 마치 소풍 가는 날처럼 두근두근 설레곤 했다. 열일곱 살의 나는 교지편집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생애 처음으로 긴 글을 써서 ‘과연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하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국어선생님께 내 글을 보여드렸더니, 메모지에 5장이나 빼곡한 글씨로 ‘이 글의 어떤 점을 고쳐야 할지’를 적어주셨다. 문장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선생님이 나를 위해 무려 다섯 장의 메모지를 빼곡하게 채워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눈물겨웠다. 그래도 조금 서운했다. 한 마디라도 칭찬을 해주시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며칠 후 친구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반이 아닌 다른 반 국어수업에서, 선생님이 나에 대한 칭찬을 침이 마르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내 얼굴은 빨개졌지만, 너무 행복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내 안의 빛이 되어 준 두 번째 말, 그것은 대학교 졸업반 때의 문학사 수업시간이었다. 친했던 선배들은 모두 졸업하고, 자주 보던 친구나 후배들도 군대 가거나 취직하고, 나는 외롭게 대학원 입시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는 너무 외로워서 글쓰기밖에 친구가 없다고 느꼈다. 한국현대문학사 수업을 들었던 건 ‘공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낯익은 것’이 내게 하나라도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친밀했던 모든 대상을 한꺼번에 잃은 내게 낯익은 유일한 대상은 문학이었으니까. 나는 마치 유일한 친구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 아이에게 필사적으로 올인하는 외로운 아이처럼, 그 수업에 매달렸다. 첫 번째 과제는 ‘순수문학과 참여문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라’는 간단한 문제였는데, 나는 마치 사생결단을 하듯 열심히 글을 써갔다. 첫사랑에게 연애편지를 쓰는 풋내기처럼 나는 ‘쓰고, 찢고, 쓰고, 버리고’를 반복하며 밤새 글을 써갔다. 그 다음 주, 교수님은 들어오시자마자 평소처럼 출석도 안 부르시고 대뜸 물으셨다. “정여울이 누구야?” 나는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싶어 겁이 잔뜩 난 채로 쭈뼛쭈뼛 손을 들었다. 너무 떨려서 그 순간 무슨 말을 들었는지 가물가물하지만, 열심히 잘 썼다는 칭찬이었음은 기억한다. 교수님은 며칠이 지난 뒤, 수업도 시작하기 전에 대뜸 나를 부른 진짜 이유를 말씀해주셨다. “눈이 부셔서. 네 글은 정말 눈부시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수업을 듣는 내내,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도 모르는 내 눈부심을 알아준 선생님이 계셨기에, 나는 태어나서 가장 외로웠던 1년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 지금도 나는 ‘최고다’ ‘멋지다’라는 말로는 도저히 성에 차지 않을 때, ‘눈부시다’라는 말을 쓰곤 한다.
가끔 ‘젊은 나이에 너무 다작아닌가’라는 평가를 듣고 슬퍼질 때가 있다. 자꾸만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주체할 수 없는 나에게, ‘다작이다’라는 비판은 내 존재자체를 공격하는 아픈 칼날이 된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나의 자연스러운 나다움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얼마 전 이 모든 아픔을 한꺼번에 치유해줄 아름다운 응원군을 만났다. 한 독자가 내게 이런 댓글을 써준 것이다. “정작가님, 오래오래 다작해주세요. 지금보다 더 많이 써주세요.” 내가 ‘다작’이라는 공격에 상처받았다는 것을 그는 눈치 챈 것일까. ‘다작해주세요’라는 말은 ‘나는 당신의 있는 그대로를 아끼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처럼 들려 또 한 번 눈물이 핑 돌았다. 쉴 틈 없이 쏟아지는 아이디어가 죄라면, 나는 더 열심히 죄를 짓고 싶다. 나는 지금보다 더 맹렬하게 다작하고 싶다. 내 안의 빛이 되어준 그 따스한 말들과 함께, 나는 오래오래 다작하고 싶다. 눈부시게 반짝이는 내 안의 별들을 찾아, 끊임없이 다작하고 싶다. 나의 체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열정이 허락하는 그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