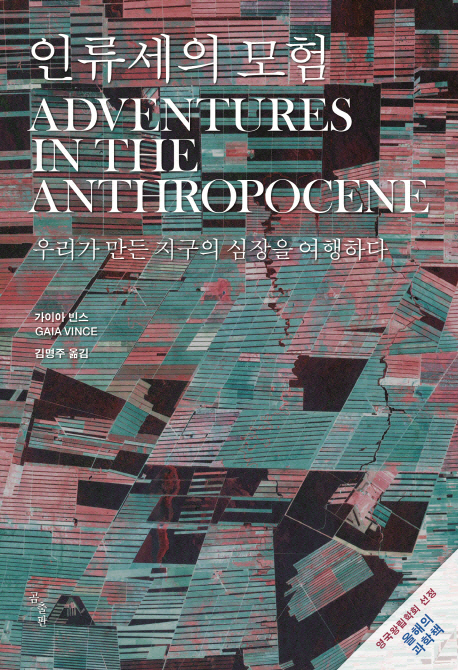인류세(Anthropocene)는 네덜란드 화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파울 크뤼천이 제안한 용어로 새로운 지질시대 개념이다. 신생대 제4기의 홍적세와 현세인 홀로세에 이은 세대를 가리킨다. 흔히 지질시대는 소행성 충돌이나 화산 폭발같은 지구 안팎의 대규모 물리학적 힘이 갈라놓는다. 하지만 크뤼천은 현재 지구의 공식적 지질시대 구분상 홍적세는 맞지만 ‘바로 지금’의 지구는 분명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류에 의한 자연파괴로 지구는 지난 46억년 역사의 그 어느때보다 더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인제공자인 ‘인류’를 시대명에 붙여 2002년 ‘네이처’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인류세를 처음 사용했다. 그가 던진 ‘인류세’라는 돌은 지질학자들의 생물학적 연대 결정 문제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현재 영국 지질학회는 인간이 지구 생물권에 초래한 변화를 근거로 이 새로운 시대를 공식적으로 등재하는 과정에 돌입했다.
책은 왜 ‘인류세’가 공인되고 통용돼야 하는지를 탐색한다. 대기·산·강을 시작으로 숲과 암석, 도시까지 지구를 10개 범주로 나눠 과거의 자연과 인류가 바꿔놓은 현재를 비교하며 미래를 생각한다. 저자는 영국의 과학·환경 전문기자이며 이 책을 통해 영국왕립학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과학책’인 윈턴상을, 첫 여성 수상작가로 거머쥐었다.
우선 대기부터 보자. 이산화탄소 농도는 홀로세 평균보다 50% 가량 높다. 이것이 서로 다른 지질시대로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지구 전역의 날씨가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 기후 변화의 여파로 지구상의 생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날씨만 바뀐 게 아니라 강의 물길이 바뀌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식작용에 해안선이 달라졌다. 수백 수천 년 자연의 물리력이 조금씩 이루던 그 변화를 인류는 고작 몇십 년,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바꿔버린 것이다.
기술력이 이뤄낸 상전벽해(桑田碧海)라고만 여겼다가는 나라 잃고 땅을 치는 맥수지탄(麥秀之嘆)할 일이다. 바다는 산성화와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수온 상승으로 어종 뿐 아니라 바다생물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폭풍은 더 강해지고 사막은 점점 넓어지고 있으며 숲이 사라지니 서식지 없는 야생동물의 수도 급감하고 있다. “지구는 여섯 번째 ‘대멸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할 정도로.
책의 핵심적 매력지점은 저자가 변화하는 지구의 최전선을 확인하기 직접 찾아나선 세계 곳곳의 생생한 현장감이다. 히말라야산맥의 인공 빙하에서부터 하얗게 칠한 페루의 산, 몰디브해의 전류가 흐르는 산호초, 카리브해의 쓰레기 섬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에 시름하는 지구,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책은 아메리카 대륙의 끝 파타고니아, 사하라사막과 메콩강, 남미의 세렝게티 판타나우, 갈라파고스제도, 아마존의 열대우림, 파나마운하를 누빈다.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분지, 콜롬비아 북부의 판자촌 비야에르모사, 리우데자네이루의 가장 오래된 빈민 주거지 호신야를 방문하고 친환경 미래 도시 톈진의 에코시티까지 다녀온다. 저자가 발굴해 낸 각종 사례는 강렬하고 이를 표현하는 문체는 유려하다. 그래서 과학책의 형식을 가진 여행책같다고 느껴질 정도다.
현재를 진단했으니 중요한 건 미래다. 저자는 변해버린 지구를 다시 홀로세의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 그리하여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해법”을 고안하는 사람들의 고군분투에 주목했다. 때로 무모해 보일 만큼 독창적인 발명과 그것들이 만든 비범한 결과에 미래가 있다고 봤다. 책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다. 애초에 인류가 전 지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비결은 창의성과 협력에 있다. 저자는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집단지성이 부와 지리적 공간, 계급, 성이라는 억압을 뛰어넘어 인류를 새로운 협력의 수준으로 이끌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