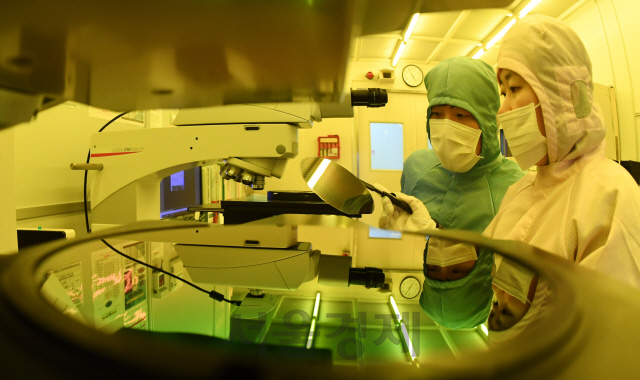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소재 조달과 관련해 가장 원하는 1순위는 무엇일까.
소재 국산화도, 소재 공급처 다변화도 아니다. 기존대로 일본 소재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전가의 보도처럼 소재 국산화, 공급처 다변화 카드가 해법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일본 소재를 그대로 쓰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낫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에 균열이 가면서 우리도 소재 국산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맞는 얘기다. 하지만 부품소재 국산화가 정치권에서 난무하는 당위론으로만 접근할 경우 더 큰 낭패로 이어질 소지도 다분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당장 소재 국산화를 바라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괴리가 크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분업 구조 하에서 대기업은 소재 국산화가 절체절명의 과제가 아니다. 소재 국산화가 대기업에 의미가 있으려면 원가절감이 가능해야 한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소재 조달처가 바뀌면 생산 라인을 새로 손봐야 한다. 소재 교체는 설비 하나하나에 변화가 동반될 수 있는 변수다. 그 정도 비용 부담을 떠안더라도 소재 조달처를 바꿀 만큼 이득이 있어야 소재 국산화의 가치가 생긴다는 의미다.
반면 중소기업은 수익성이 담보돼야 한다. 수천억 투자해서 고작 몇 백억 벌어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 어렵사리 국산화를 한들 시장이 작다든가 원가경쟁력이 약하면 국제 분업의 비교 우위에 따라 굳이 국산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 중소업체로서는 이런 소재를 개발해 시장화될 때까지 살아남기도 쉽지 않다. 고순도 불화수소 등의 국산화에 성공하더라도 공급처가 국내 기업으로 한정된다면 중소기업이 투자에 나서는 것은 해당 기업의 리스크만 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소재 국산화와 같은 거대 프로젝트가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돌발 몽니’에 대한 해법으로 추진되면서 시장에서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제 논리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졌으니 이번 기회에 소재 국산화 드라이브를 제대로 거는 것은 맞다”면서도 “소재 강국을 따라 잡아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산과 인력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라도 국산화할 품목에 대한 철저한 시장 분석과 함께 일본 사태 해결 이후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이게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소재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시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하고 여기에 맞춰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이 소재 국산화 바람에 설비를 늘렸다가 후일 사태가 해결되면 투자 자체가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험성도 다분하다.
그런 맥락에서 한일 갈등을 감정적으로 부추기는 정치권 등이 문제를 더 꼬이게 할 수 있다. 가령 일본 소재 기업이 규제에 따른 수익 악화를 염려해 일본이 아닌 해외에서 소재생산을 늘리는 것을 두고도 일본기업이 한일 경제전쟁에서 패했다는 식의 분석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 기업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기도 하다. 일본 소재를 그대로 써야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대로 한일이 ‘강대강’으로 대치하게 되면 일본 소재 기업이 파산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장의 현실을 호도해 소재 국산화의 큰 그림 자체를 어그러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에는 신중해야 한다. 재계의 한 임원은 “‘제로섬 게임’ 관점에서 소재 국산화에 접근할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소재 국산화의 패를 다 보여주게 돼 앞으로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글로벌 무역에 보호주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소재 공급처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커진 것은 틀림없다”며 “그래도 최선의 해법은 일본과의 거래를 정상화하는 것이고, 그런 흐름 속에서 소재 국산화를 통해 우리 힘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