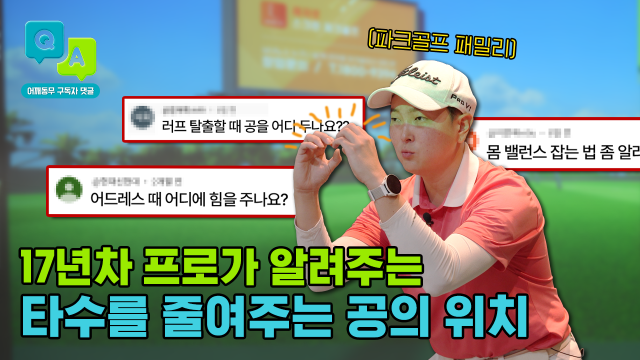나치 독일이 자행한 인종주의적 만행은 ‘홀로코스트’ 만이 아니었다. 친위대원(SS)과 ‘순수 혈통’을 가진 여성이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생겨난 아이들을 입양시키거나, 우수 혈통의 아이들을 다른 나라에서 독일로 강제로 데려오기도 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독일어로 생명의 샘을 뜻하는 ‘레벤스보른’. 프로젝트 주동자들은 나치의 패망 후 모든 기록을 없앴고, 피해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자라났다.
신간 ‘나는 히틀러의 아이였습니다’는 레벤스보른 피해자 중 한 명인 잉그리트 폰 윌하펜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의 기록이다. 저자는 10살 무렵 자신이 위탁 아동이었으며 ‘에리카 마트코'란 원래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저자는 “과거에 매달리는 것보다 현재를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나름 스스로 설득하고 살았지만, 과거에서 무얼 발견하게 될지 두려워 문제를 회피했음을 알고 있었다”며 “독일 적십자사에서 친부모를 찾고 싶으냐는 전화를 받았을 때 드디어 진실을 알아낼 기회가 왔다고 느꼈다”고 돌아본다.
결국 그는 20여 년 간의 조사 끝에 자신이 유고슬라비아 첼예라는 도시에서 강제 납치돼 독일로 이송된 25명의 아이들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책은 여성의 임신·출산을 통제하는 국가 권력의 잔인함, 순수 혈통과 우수 인종에 대한 기이한 신념으로 아이들을 납치해 그들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국가주의와 인종주의를 고발한다. 우수 혈통이 존재한다는 우생학적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돼 폐기된 지 오래다. 하지만 저자를 비롯해 이 신념에 따라 레벤스보른 프로젝트에 동원된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크고 작은 상처에 시달린다. 자신의 뿌리를 잃어버린 채 살며 좌절과 슬픔을 겪었고, 과거를 알게 된 후에는 나치의 인종주의 정책의 산물이라는 수치심과 마주해야 했다.
책은 오늘날의 인종주의적 흐름을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한다. 인종주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아이들까지 이용했던 나치의 모습을 과거의 일로 치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인들의 ‘인종청소’ 학살이 국제사회를 경악케 한 것이 불과 20여 년 전이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불거진 민족과 지역, 종교, 인종 간 차별과 증오의 행렬은 우려할 만한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최근 들어 ‘#StopAsianHate’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살아가는 아시아계에게 차별과 증오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욀하펜은 “역사의 교훈은 우리가 이제껏 역사에서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배워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코로나 사태 초기 ‘우한 폐렴’으로 부르며 중국과 중국인을 경계한 우리도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1만6,000원.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