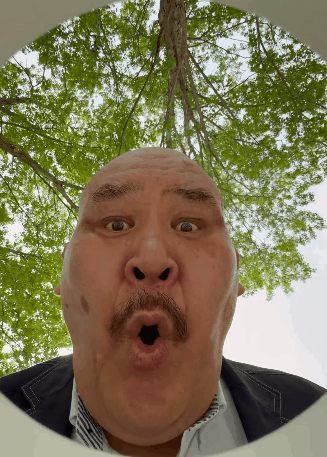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비중을 현재보다 2배 넘게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발전 비율(RPS) 상한선이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높아진다.
RPS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한 제도다. 남동발전 등 연간 500M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업자에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할 경우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량을 채우는데 이 비용은 한국전력이 보전해준다.
RPS는 도입 당시 2%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상향되면서 올해 9%까지 높아졌다. 정부는 내년에 10%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법정 상한이 25%로 상향됨에 따라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9차 전력수급계획과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 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든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태양광 설비가 증가함에 따라 REC 발급량이 수요를 초과했고, 이에 따라 REC 가격이 급락해 시장에 팔지 못한 잉여 REC가 발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6년 REC 평균가격은 13만9,200원에 달했으나 이후 계속 하락해 2019년 6만5,000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건 만큼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력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RPS 비율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은 통상 4,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발전사들이 추가 비용을 한전에 청구하면 한전은 정부에 전기요금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지난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요금을 결정하는 총괄원가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RPS 비용 등 기후·환경비용 변동분을 감안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한전의 요구를 외면하기도 쉽잖을 것으로 보인다.
값싼 원자력발전 대신 경제성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점도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지난해 기준 신재생에너지 구입단가는 1kWh당 79.04원으로 원자력 단가(59.69원)보다 32%이상 비싸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