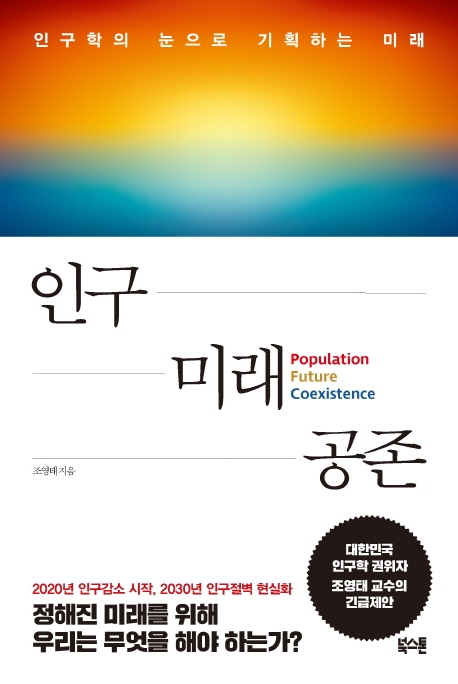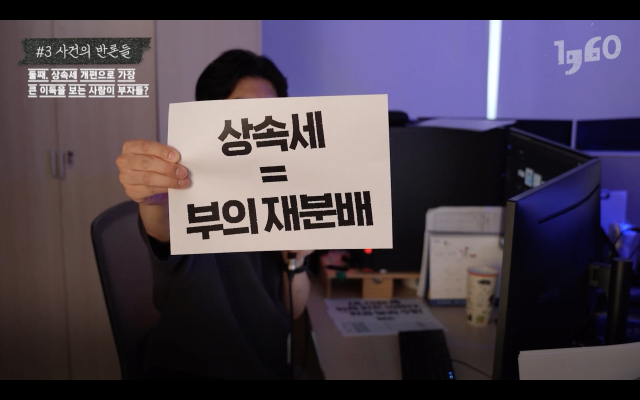2020년 대한민국에서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시작됐다. 인구학에서 데드크로스란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대로라면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수는 지금보다 3,000만 명 넘게 줄어든 1,800만~2,000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그리고 2,600~2,700년 경, 마지막 한국인이 사망하게 된다. 600년 후 벌어질 극단적인 ‘대한민국 종말론’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의 인구 감소는 더는 내버려둬선 안 될 코앞의 위기다.
국내 인구학 권위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신간 ‘인구 미래 공존’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짚어보고 인구학적 관점에서 한국 사회와 기업, 개인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제안한다.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 무렵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매년 40만~50만 명씩 줄어들기 시작한다. 참고로 지난해 기준 서울 강남구 인구가 54만 명이다. 저자는 “오늘의 인구는 한 세대 전의 인구 변동에 의해 이미 정해졌고 30년 뒤의 인구 역시 정해진 미래”라고 말한다.
‘미래를 위해 아이 많이 낳자’는 구호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저자는 ‘많이 낳자’는 출산 장려보다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앞으로의 사회를 예측해 대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상황이 최악인 것은 아니다. 지금보다 합계출산율이 더 낮아져도 10년 정도는 출생아 수를 매년 20만 명 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정밀한 예측과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면 2020년대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저자의 판단이다.
책은 ‘조급할 것도 없지만, 마지막 기회인 2020년대를 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인구의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공존’을 제시한다. ‘여자가 애를 더 낳아야지’,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장년층이 일찍 물러나라’ 같은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 공존이 아니라, 제한된 공간에서 서로가 피고 지는 시기를 달리함으로써 경쟁을 피하는 지속 가능한 생존 방식으로서의 공존이다. 저자는 정해진 미래, 즉 2030년의 인구 절벽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춰 큰 그림을 그린다. 우선 내국인을 대상으로는 정년 연장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주도해 인구 절벽 시작 시점을 2040년 뒤로 미루고, 그 사이에 외국인의 이주를 비롯한 또 다른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공존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2040년대 이후는? 저자는 “대안이 반드시 인구가 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과학 기술, 혹은 메타버스 세계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1만 7,000원.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