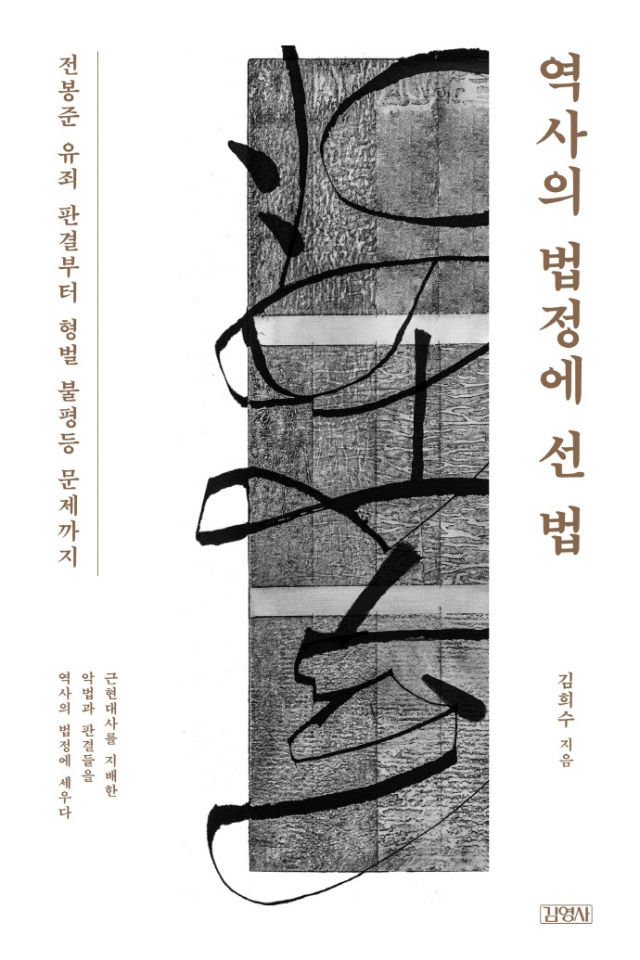'유전무죄, 무전유죄'. 1988년 인질범 지강헌이 법정에서 남긴 말이다. 당시 재판정에서는 범죄자들의 자기 정당화 논리로만 기록됐지만, 이 말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 앞의 평등에 대해 말할 때마다 언급되곤 한다.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속 시원하게 답하기는 어렵다. 법을 만들기 전부터 반복되어온 질문이지만,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 보면 사실 법 앞의 ‘불평등’이 오히려 보편적 현상이었다. 민주주의가 뿌리 내린 오늘날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졌는지는 의문이다.
검사 출신의 김희수 변호사가 쓴 '역사의 법정에 선 법’은 인류 역사상 오랜 기간 논쟁거리가 되어온 형벌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다. 저자는 왜곡된 법의 역사를 법률사적·법철학적 관점에서 추적하며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법이 어떻게 남용 되었는지, 어떤 논리가 정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는지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법의 잣대로 되짚는다. 책은 법을 향한 일종의 고발장인 셈이다.
책은 우리나라 근대 법원의 첫 판결인 전봉준 유죄 선고부터 일제 강점기 을사늑약과 국제법·식민지법의 정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적법성 문제, 권력자들에 의해 자행된 헌법 파괴, 고문·가혹 행위로 조작된 사건의 법 논리, 형벌 불평등 문제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과 판결들을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살펴 봤다.
우리나라 근대 사법제도의 출발점은 갑오개혁이다. 갑오개혁 이후 설립된 최초의 근대 법원이 내린 첫 번째 판결은 동학농민혁명군을 이끈 녹두장군 전봉준 등 5명에 대한 판결이었다. 재판소는 이들에게 지금의 법으로 치면 군사반란죄에 해당하는 '군복기마작변관문자부대시참(軍服騎馬作變官門者不待時斬)'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저자는 이 재판을 ‘어둡고 우둔한 시대의 자화상'이라고 지칭한다. 부패하고 무능한 조선이 법 제도는 도입했으나 근대 법 이념은 뿌리내릴 수 없었고, 근대 법원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없었던 점을 이유로 꼽는다. 근대 정신이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근대의 틀만 갖춘 사법 체계가 제 역할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혁의 지도자들에게 내린 판결은 가혹했다.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와 예수에 대한 판결이 정의라는 이름의 모순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소크라테스는 다른 신을 섬기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이유로, 예수는 신을 모독하고 로마 황제에 반역한 죄로 각각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드러나듯 역사에서 정의가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정의가 승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고 책은 전한다.
20세기 들어서는 제국주의라는 이름으로 법과 정의가 남용됐다. 일제는 자유와 평등,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소위 문명론을 앞세워 식민지 지배를 합법화했다. 일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근거로 삼은 문명론이란 근대 문명에 뒤떨어진 곳들을 밝은 세계로 인도한다는 이념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독립운동 행위는 곧 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제법 사상의 뿌리라는 문명론은 허구에 불과하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주장과 달리, 당시 국제법상 식민 지배나 문명국위 기준에 대해 정해진 바는 아무 것도 없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형벌 불평등은 현대사회에서도 계속됐다. 그 배경에는 권력자들이 자행한 헌법 파괴와 대량 생산된 악법이 있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52년 1차 개헌을 시작으로 1987년까지 총 9차례 개정됐다. 문제는 대부분 권력자에 의한, 권력자를 위한 권력 구조 개편이었다는 점이다. 책은 누더기 개정으로 문제가 된 대표 사례로 '초원복국 사건' '삼성 X파일 사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등을 들고 있다.
15만 원을 훔친 사람에게는 실형이, 1,500억원을 횡령한 사람에게는 집행유예가 버젓이 선고되는 현실, 소득 격차가 아무리 커도 동일한 과오에 대해서는 같은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는 모두 실질적인 형벌 불평등, 즉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이 가난을 처벌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책은 진단한다. 폐지인 줄 알고 주운 종이 상자에 든 감자 다섯 알 때문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독거 노인, 혼자 두 아이를 키우다 우윳값 73만 원을 연체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미혼모 등 현재 우리나라에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감옥에 가야 하는 사람이 한 해 4만 명에 달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책은 형벌에도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형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일수벌금제(차등벌금제) 도입과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 벌금 분납·연납 명문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법 또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숙제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러했듯 내일도 정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1만4,800원.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