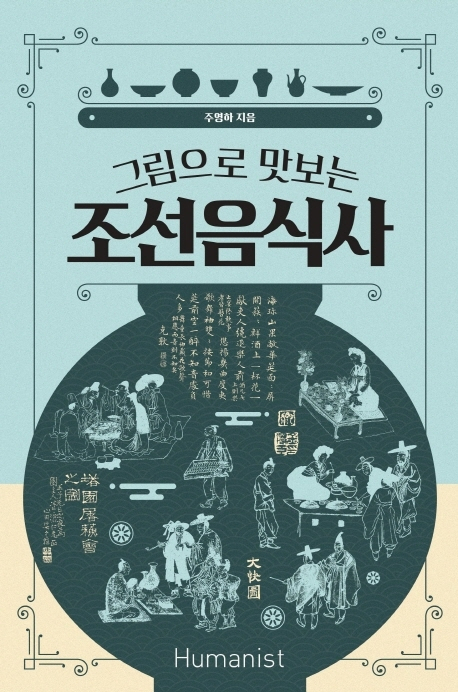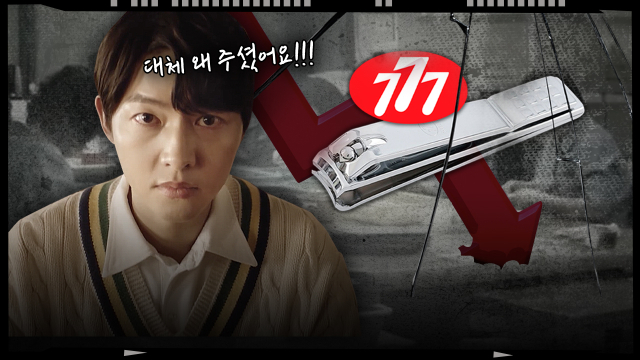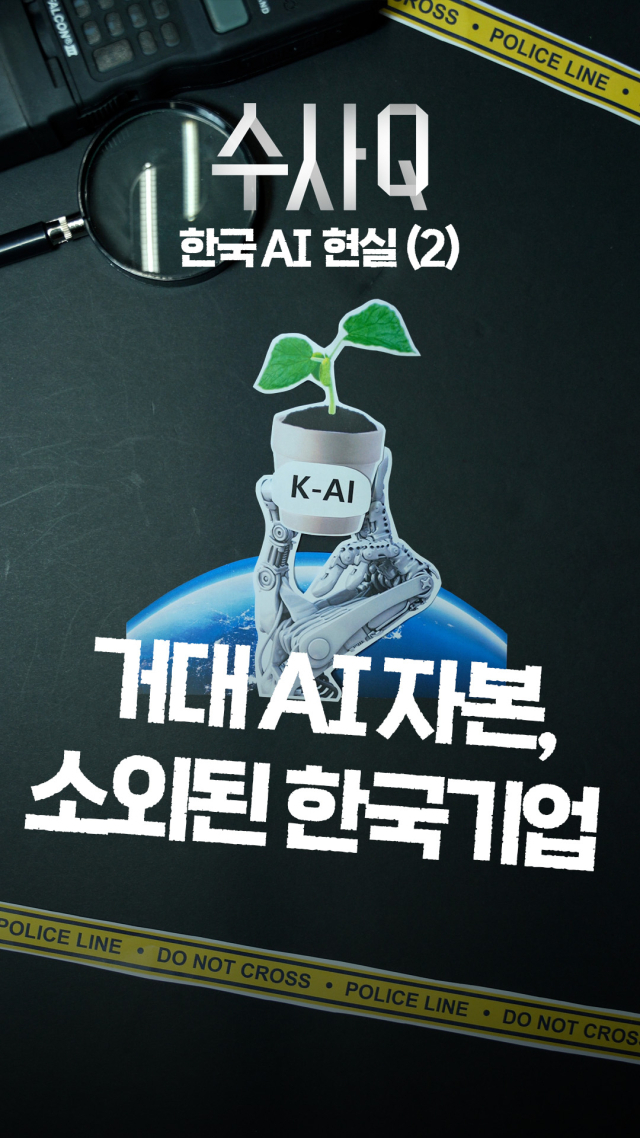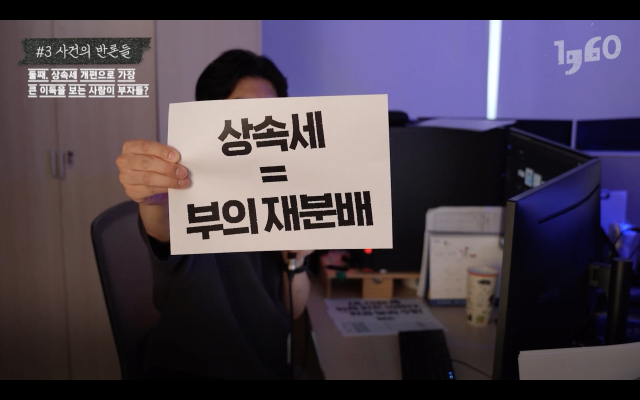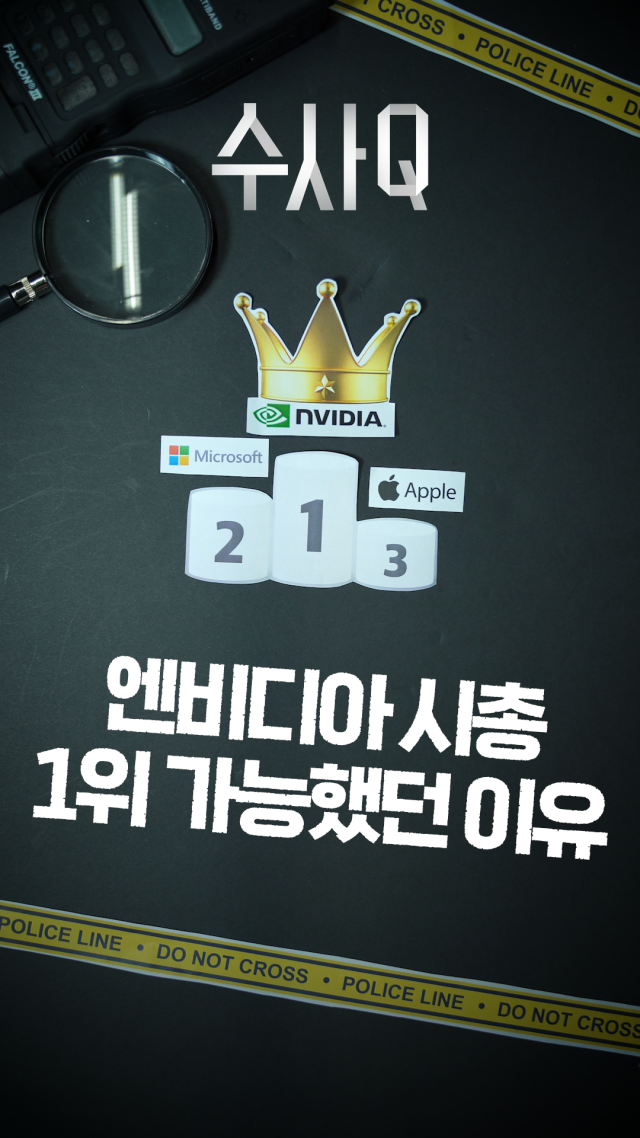작자 미상의 ‘중묘조서연관사연도’라는 그림에는 경복궁 근정전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젊은 당하관(堂下官·조선 시대 정3품 이하의 품계를 보유한 관원) 세 명이 그려져 있다. 이날 행사는 1534년 중종이 왕세자(후에 인종) 교육을 담당한 서연관에게 베푸는 잔치였다. 왕이 내린 술이니 각자의 잔으로 마시지 않고 하나의 술잔을 상급자부터 ‘원 샷’으로 돌리고 돌리다 보니 술이 약한 관리는 하인에게 실려 나간 것이다. 이는 조선 중반까지도 술 문화가 관직의 높낮이를 가리지 않고 너그러웠음을 알려준다.
신간 ‘그림으로 맛보는 조선음식사’는 음식 인문학자인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그림을 통해 16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조선 시대 식생활을 분석한 책이다. 의외로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와 같은 방대한 내용의 문헌에도 조선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어떻게, 왜 먹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저자는 왕실과 사대부 행사를 기록한 궁중 기록화, 서민들의 일상을 담은 풍속화 등 작가와 시기가 분명한 그림 22점을 통해 조선 음식 문화와 풍속사를 들여다본다.
날씨 좋은 날 소고기와 한잔 술로 야유회를 벌이는 사대부들, 어부들의 밥도둑이었던 숭어찜 요리, ‘유사길(위스키)’ 한 잔에 곁들인 커틀릿 등 그림을 보다 보면 조선 시대 생활상과 역사까지도 엿볼 수 있다. 가령 드라마 ‘대장금’ 등 대부분 사극에서는 여성 나인이 음식을 만들지만 왕실의 핵심 요리사는 남성이었다. 공식 직책 대부분은 남성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조선 초기 왕실은 불교를 숭상해 육식을 기피하던 고려 왕조와 달리 고기와 술을 선호했다. 술로 정치를 펼쳤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였다. 이러한 풍경은 ‘기영회도’와 같은 그림에 남아 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조상은 주로 목축을 하던 두만강 일대에서 거주했는데 그 지역 식습관을 물려받은 탓이다.
17세기 중반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대기근은 조선의 정치경제는 물론 식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원산지가 아메리카 대륙인 새로운 작물들이 시차를 두고 들어왔고 이 중 고추·옥수수·호박·감자·고구마 등은 18세기 이후 식탁에 일상적으로 오르는 식재료가 되었다. 19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의 그림은 백성들이 굶주리는데도 세도가는 사치스러운 식생활을 누렸음을 말해준다. 19세기 후반 이후 20세기 초반에는 와인·코냑과 같은 술과 캔에 담긴 서양 음식들이 유입됐다. 1만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