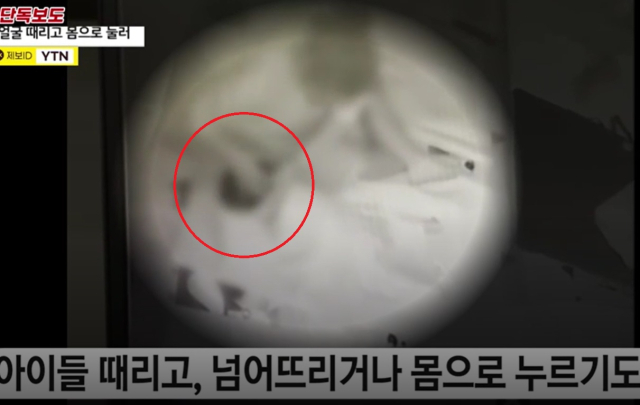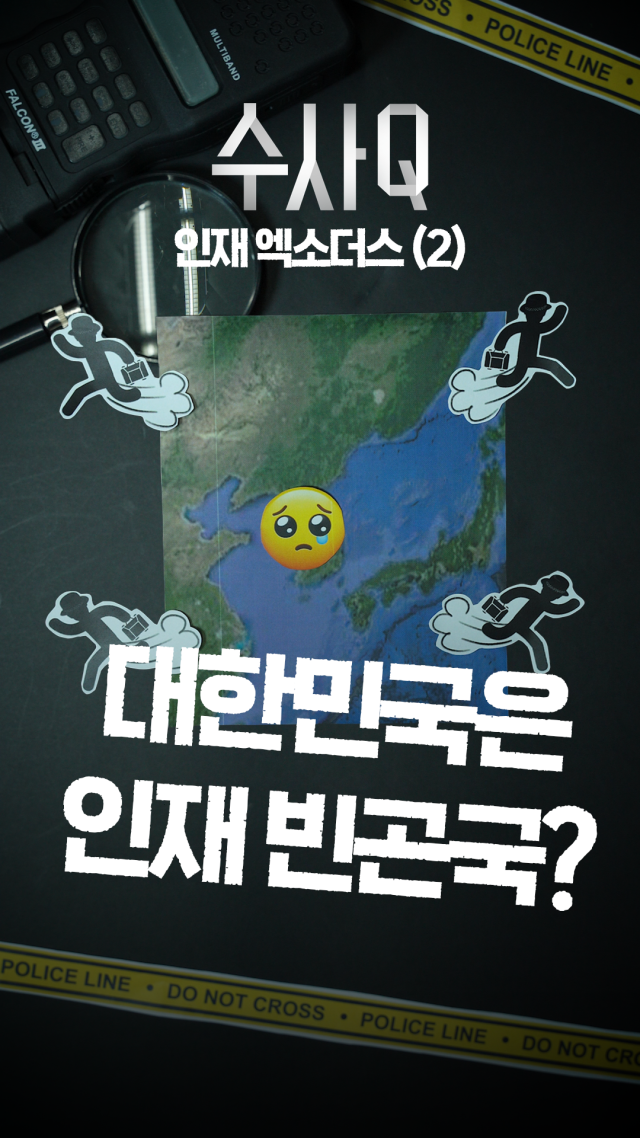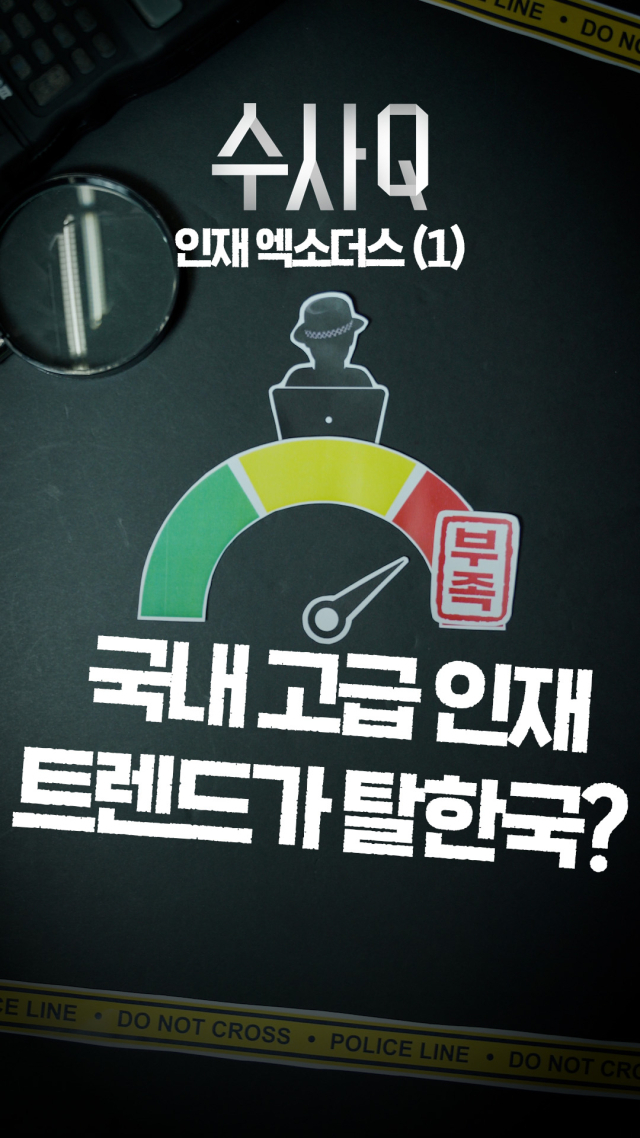|
'탐욕 경영에서 윤리 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진화된 새로운 시장 경제,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공생 발전'의 골자다. 취지에 공감할 수 있지만 우려가 앞선다.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는 하나같이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책수단도 마땅치 않다. 일부라도 성공시킬 수 있다면 노벨 경제학상에 평화상까지 얹혀줄 법한 난제다. 그뿐만 아니다. '어느 나라도 가지 않았던 길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찾아낸 새로운 자본주의'가 과연 가능할까. 수출입 의존도가 110%에 이르는 소규모 개방경제에 머물고 있는 마당에 한국적 자본주의를 모색하겠다니 수사학처럼 들린다. 혼돈과 불확실성, 불신 두 번째 벽은 불확실성이다. 모든 것이 혼돈스럽다. 'MB노믹스'는 사라진 것인가. 정권의 지향점,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하다. 만약 전임과 전전임 대통령이 비슷한 말을 했다면 '좌파 정책'으로 뭇매를 맞았음직한 정책들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는가. 정말 왼쪽일까. 역사적 흐름에서 보자면 이번 순서는 왼쪽이 될 것 같다. 자본주의의 출발점은 오른쪽. 자유방임 속에서 반복된 불황 끝에 찾아온 지난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흐름은 왼쪽으로 옮겨졌다. 수정자본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론을 제시한 존 메이너드 케인즈와 정책에 접목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기업인∙금융가들로부터 '빨갱이'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다. 1960~1979년대 각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겪게 되며 등장한 것이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자는 신자유주의. 오른쪽으로 돌아온 셈이나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은 2008년 이후 신자유주의는 생명을 다해가고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모색이 한창이다. 문제는 우리다. 세계경제의 흐름이 우-좌-우를 거쳐 다시 왼쪽으로 기우려는 이때, 어느 나라보다 앞서서 좌측 깜박이를 켠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의 경제개발을 주도한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검든 희든 쥐를 잘 잡는 게 좋은 고양이)처럼 좌파경제학의 요소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국이 누구보다 빨리 방향을 변환한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정부의 초기정책과 공생발전도 서로 상충된다. 세 번째는 신뢰의 문제다. 주요 인사 때마다 위장전입, 군 미필, 투기 혐의를 지켜봤던 국민들이 '탐욕에서 윤리'로의 전환을 믿어줄 수 있을까. 공생은 장벽은 넘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위기를 견뎌낼 기초자산인 재정건전성을 향한 의욕은 높이 살 만하지만 오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에 도달한다는 목표는 벅차다. 확대균형을 택할 경우 감세 취소나 세목 신설 또는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고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짙다. 기업 투자 위축 우려도 공생의 벽은 당장의 현실이다. 무엇보다 기업이 불안해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업을 자극하는 발언들도 연이어 나왔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3대 세습이 말이 안 된다(여당 의원)' '재벌이 정신 안 차리면 동반성장 강제로 할 때가 올 것(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등의 발언이 그것이다. 기업의 행태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재산이 자식에게 세습되는 것도 자본주의의 생리이자 장점이다. 스웨덴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발렌베리그룹은 6대째 세습되고 있다. 불필요한 자극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다. 공생이 공허한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를 원하지만 무수한 난제는 '무한대=불능'이라는 공식을 떠올리게 만든다. 공생의 벽에 갇히지 않으려면 불확실성부터 제거하는 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