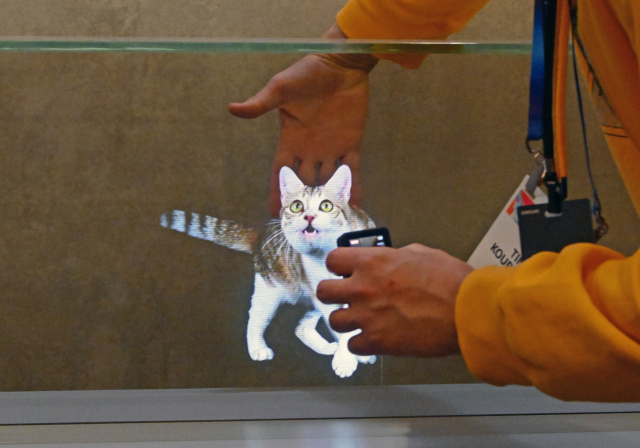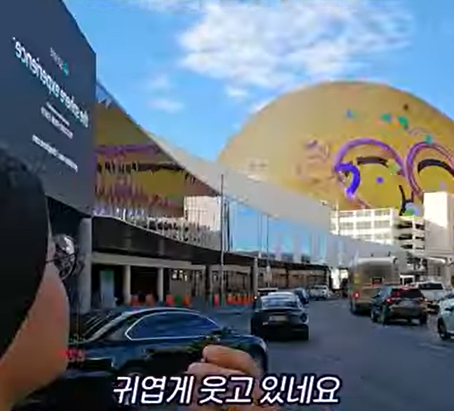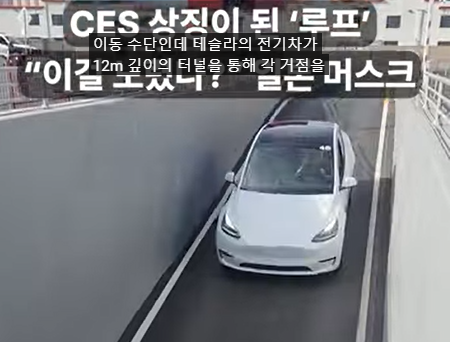영화 크래쉬<br>올 아카데미 작품상… 이분법적 시각 피하며 모순된 감정 드러내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탄 영화 ‘크래쉬’. 미국에선 이미 2004년에 선보였던 이 작품이 국내에선 7일 지각 개봉한다. 인종 차별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는 정도로만 알려진 영화. 일각에선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 가운데 가장 뒤떨어지는 영화”라는 혹평까지 받았지만 영화를 뜯어보면 그렇게 평가절하될 영화만은 아니다.
LA 교외의 한 도로변. 흑인 시체 하나가 발견됐다. 흔할 법한 살인사건 현장. 그 곳에 도착한 수사관 그레이엄(돈 치들)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시체엔 무슨 사연이 숨겨 있었을까. 영화는 정확히 36시간 전으로 시계바늘을 돌린다.
백인 검사 릭(브랜든 프레이져)과 아내 진(산드라 블록)은 한밤중 두 흑인청년에게 차를 강탈당한다. 이후 아내는 남편도 짜증나고 집 문 열쇠를 고치러 온 멕시칸 남자나 가정부가 혐오스럽다.
같은 시간, 흑인 방송국 PD 카메론(테렌스 하워드)와 아내 크리스틴(탠디 뉴튼)은 백인 경찰에게 치욕에 가까운 검문을 당한다. 아내는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남편을 비난한다.
백인 경찰인 라이언(맷 딜런)은 아버지 병 수발에 지쳐 점점 성격이 난폭해진다. 지나가는 흑인에게 모욕적 검문도 서슴지 않는다. 동료경찰 핸슨(라이언 필립)은 라이언에게 분노한다.
등장 인물이 너무 많아 자칫 산만해질 수도 있었지만, 영화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나로 녹여낸다. 그 방점은 ‘미국 사회의 오늘’. 세계를 향해 ‘아메리칸 드림’을 외치며 자유와 인권의 상징임을 자처하는 미국. 그러나 영화 속 미국은 쉽게 씻겨지지 않을 인종간의 갈등과 편견, 무지까지 서로간의 에피소드를 통해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그 갈등과 편견이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색인종을 증오하는 백인이 절대악이고 백인에게 당하는 흑인이 무조건 동정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이분법이 아니다.
백인 검사 릭이 흑인 청년들에게 차를 도둑맞고도 가만히 있는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 때문이다. 아내 진은 이런 남편에 질리고 그 상처가 애꿎은 열쇠 수리공과 가정부에게 전가되지만, 결정적인 순간 유색 피부의 가정부는 진이 유일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차를 훔친 흑인 청년들도 알고 보면 순진하기 이를 데 없는 인물들. 자신들이 훔친 차에 인신매매된 동남아계 불법이민자들이 갇혀 있는 걸 알고는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아이러니한 메시지는 이들 흑인청년들이 제대로 보여준다. “여기는 미국이야. 시간이 돈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은 이들 입에서 가장 미국적인 구호가 나온다.
백인 형사 듀오인 라이언과 핸슨은 영화 속 선악 상대주의의 최극단이다. 인종차별주의자인 라이언이 자신이 성추행했던 크리스틴을 목숨을 걸고 구하는 장면이 그것. 라이언을 증오하며 자신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고 자부했던 핸슨은 죄없는 흑인을 편견에 사로잡혀 총으로 쏴 버린다.
문제는 선과 악이 한 자리에 공존한다는 이유만으로 서로간의 갈등이 너무 쉽게 낫는다는 것이다. 10명이 넘는 서로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그들의 편견과 오해를 세심하게 포착해 낸 감독의 솜씨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순진한 처방전이다. 감독이 원했던 게 이 정도의 순진한 평화였다면, 영화가 다룬 인종 문제는 또 다른 ‘미국 제일주의’일 지도 모른다. 할리우드는 분명 변하지만, 그 변화가 ‘현재완료형’은 아직 아니다. 그래도 ‘람보’나 ‘인디펜던스 데이’를 생각하면 이것도 ‘천지개벽’이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