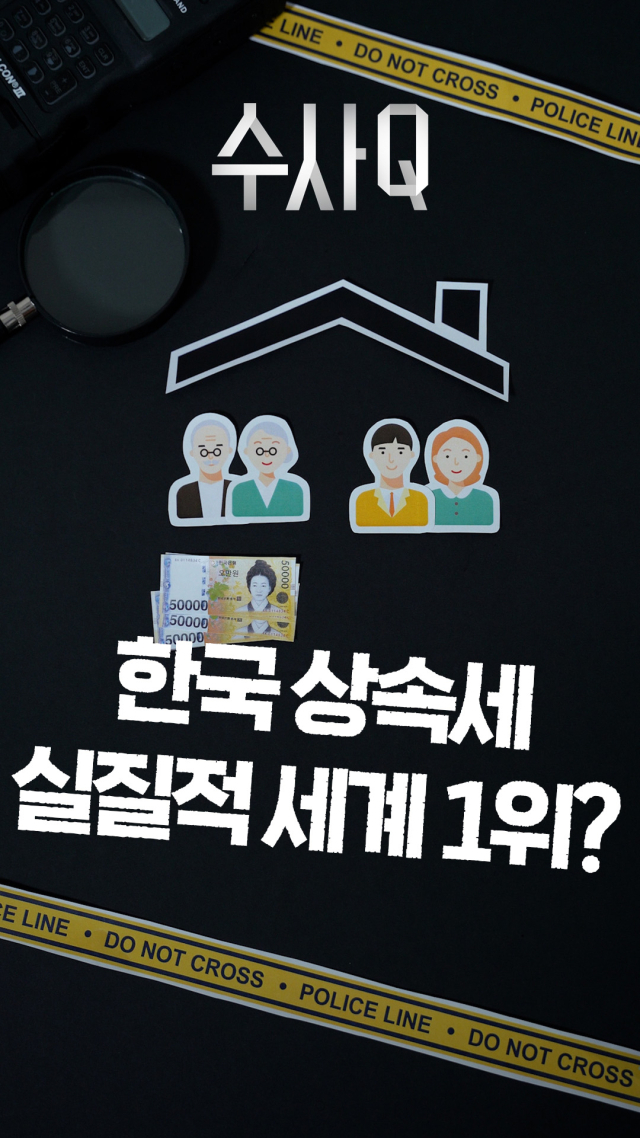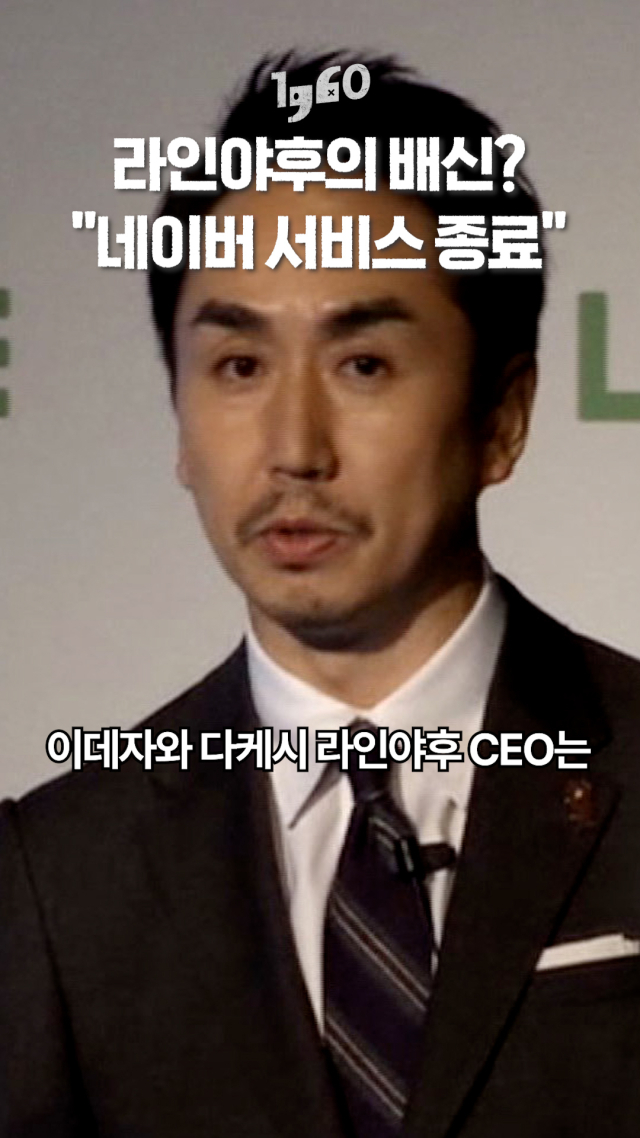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국정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의 신당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당적정리가 조건이라면 차라리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 필요할 경우 탈당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집값이) 더 올라가면 더 강력한 것을 준비해서 내겠다”면서 “(서민들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사지 말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확신하고 있으며 “거품이 갑자기 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해 부동산 경착륙 가능성도 철저하게 배제했다.
하지만 이날 신년기자회견은 대체로 정치적 현안에 집중되어 경제비전을 제시하는데 미흡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이틀 전 신년연설의 대부분을 경제에 할애한 만큼 상대적으로 신년기자회견은 선거의 해에 걸맞게 정치현안에 논의를 집중하는 게 자연스러웠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선거의 핵심 쟁점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라고 하는데… 경제정책에 무슨 차별성이 있느냐”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경제는 기본일 뿐 정치논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사회복지, 사회투자가 확실히 차별성이 있는 것이며 사회적 자본, 민주주의, 공정한 사회질서 등에서 역사적 차별성을 갖고 전선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을 보면 더욱 그렇다.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 이처럼 편파적인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물론 경제정책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겠지만 나라마다 정치인마다 경제를 바라다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신년연설에서도 노 대통령은 국민들의 시각과는 차이가 있는 경제인식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지금 우리 경제는 투자와 소비 부진으로 성장잠재율이 떨어지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도 저하되는 불황의 긴 터널 앞에 있는지 모른다. 경제선진국으로 비약하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연이은 국민과의 소통에서 경제비전 제시가 빈약한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