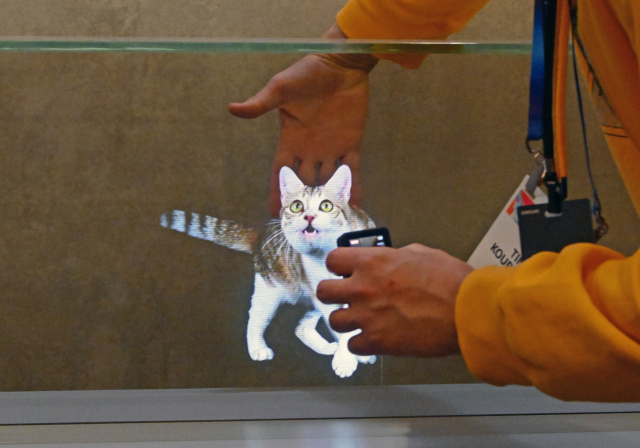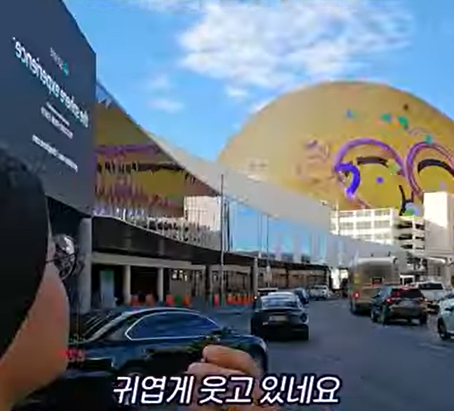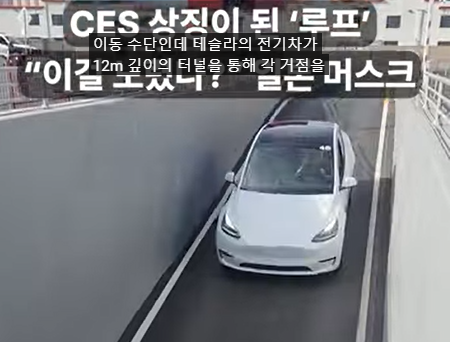타임머신이 있다고 치자. 뭘 실어야 돈이 될까. 설탕이다. 6세기께 유럽의 설탕 값은 금보다 비싸다는 후추 이상이었다고 전해진다. 14세기에도 설탕 1㎏을 사려면 소 10마리가 필요했다.
면직물ㆍ소금과 더불어 3대 세계상품이라는 설탕을 퍼뜨린 것은 전쟁. 인도를 침공한 알렉산더의 군대에 의해 존재가 알려진 ‘꿀벌 없이 꿀을 만드는 갈대(사탕수수)’는 사라센제국의 영토확장 과정에서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 스페인 지역까지 퍼졌다. 십자군 원정에도 술탄의 사탕수수밭을 빼앗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전쟁으로 확산된 사탕수수는 경제전쟁을 낳았다. 르네상스를 일으킨 이탈리아 지역의 경제적 풍요도 설탕 덕이다. 설탕 공급이 늘어난 결정적인 계기는 신대륙 발견과 스페인의 유대인 추방. 아메리카 대륙에서 기대했던 만큼 금이 나오지 않자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사탕수수를 심기 시작했다.
쫓겨난 유대인들도 서인도제도에 집단 이주, 농장을 차렸다. 생산이 늘어도 수요는 무궁무진. 중남미가 사탕수수로 뒤덮이고 설탕 산업은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올랐다. 뒤늦게 경쟁에 뛰어든 영국은 유대인 사탕수수 농장주 10명에게 남작 작위까지 내리며 생산을 독려했다. 1653년 영국과 네덜란드간 1차 영란전쟁도 카리브해 설탕산지의 주도권 다툼으로 일어났다.
경제전쟁의 이면에는 흑인들의 비애가 깔려 있다. 사탕수수 농장의 노예로 끌려간 흑인이 2,000만명에 이른다. 흑인들이 새하얀 저주에서 풀려난 것 역시 설탕 덕분. 독일인 약제사 아카드(Franz Karl Achard, 1753~1821.4.20)가 추운 기후에서도 잘 자라는 사탕무에서 설탕을 정제해내는 방법을 발명한 후 사탕수수 전쟁도, ‘설탕의 잔혹사’도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