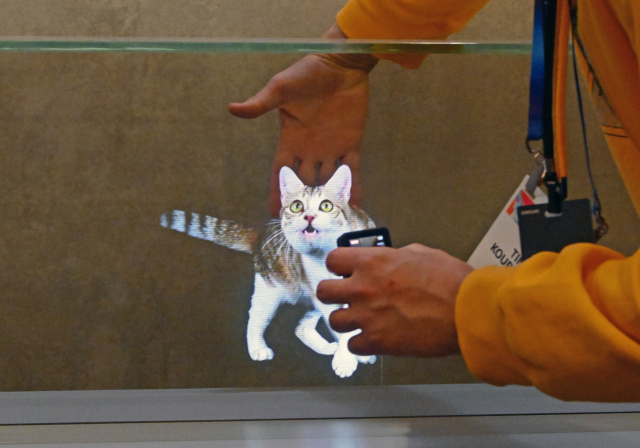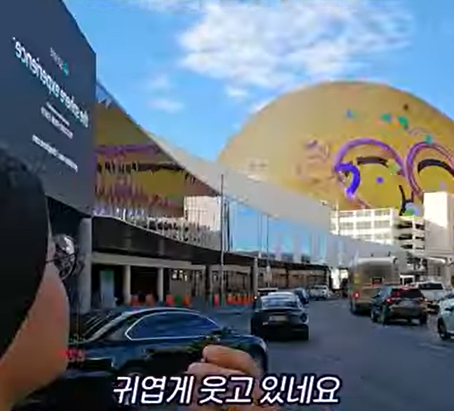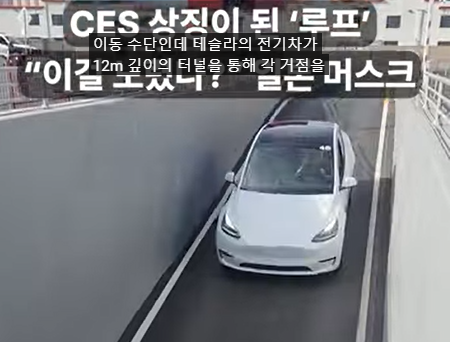오랜 진통 끝에 새만금방조제가 연결됐다. 환경과 개발의 논란을 떠나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새만금방조제 끝 물막이는 1회 조석량만도 18억톤으로 네덜란드 압슬루투 방조제(5억톤)의 3.6배에 달하며 유속이 초당 7m 정도나 되는 바닷물에 맞서야 하는 사상 유례없는 어려운 공사였다.
15톤 덤프트럭 21만대분에 상당하는 3~6톤 규모의 돌망태 27만개와 암석 237만톤을 29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방조제 개방구간에 투입했다. 국내에 20대뿐인 35톤 덤프트럭 중 16대, 2,000톤급 해양대형바지선 19대 등 총 8,010대의 중장비와 연인원 2만4,000여명이 동원되는 등 단일공사로는 최대의 물동량이 투입된 최대 규모의 공사였다.
뿐만 아니라 최첨단 장비를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의 새만금수리시험장을 조성, 5년간 방조제 연결구간에 대한 수리모형 실험과 함께 국내외에서 내로라하는 간척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일궈낸 대역사이자 광대한 국토확장을 가져온 쾌거였다.
끝막이 공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외국의 전문기술진이 방문해 참관할 정도로 우리나라 토목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
지난 91년 12월 첫 삽을 뜬 새만금사업은 많은 논란과 함께 사회적 갈등을 대표한 사업이었다. 결국 법적인 판단에 맡기는 사태까지 진행됐지만 새만금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은 소득도 매우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
새만금은 우리 사회가 환경과 개발이라는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으며 국가적 갈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되짚는 계기가 됐다.
이번 새만금방조제 연결을 계기로 새만금사업이 화해와 상생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수질문제에 대해 더 이상 국민적 우려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생태공원과 습지공원 등 다양한 친환경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새만금지구가 세계적인 친환경 개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새만금이 갈등을 넘어 미래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하다. 눈을 돌려 세계를 보자. 세계는 지금 국가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지역발전에 국가적인 역량을 모으고 있다.
새만금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지만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미 자리잡은 상하이의 푸둥지구를 비롯, 눈부신 성장으로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지역들의 공통점은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 그리고 국민적 성원이 전제돼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방조제가 완공됨으로써 새만금 지역에는 내부간척지 2만8,300㏊와 담수호 1만1,800㏊ 등 모두 4만100㏊(1억2,030만평)의 땅이 새롭게 조성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00배, 서울의 3분의2에 해당되는 광활한 면적으로, 우리 국민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규모이다. 더욱이 고군산군도 등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어우러진 천혜의 입지조건으로 부가가치가 높으며 향후 동북아시대를 열어갈 전진기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갖추고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이 새로운 국토를 어떻게 관리하고 경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바뀔 수 있다. 새만금 개발은 성급하게 논의하기보다 장기적이고 치밀한 국가 미래 발전전략과 연계해 국가 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글로벌시대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상상해보자. 미래는 꿈꾸고 도전하는 자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