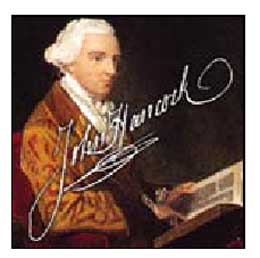|
올 여름 개봉작 ‘핸콕’의 한 장면. 주인공은 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상태다.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하는 말. ‘Put your John Hancock on this paper(이 서류에 사인하세요).’ 잘못 알아들은 주인공은 자기 이름을 ‘존 핸콕’이라고 여겼다. 영화 제목도 그래서 ‘핸콕’이다. ‘핸콕’이 관용구로 자리잡은 이유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사람으로 추앙 받는 존 핸콕 때문. 누구보다 강경하게 독립을 주장한 그는 독립선언문에도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다. 독립선언문의 첫 서명자이기에 관용어가 생긴 것이다. 무엇이 핸콕을 급진적 분리주의자로 만들었을까. 돈이다. 삼촌에게 조선업과 해운ㆍ무역회사를 물려받아 식민지에서 손꼽히는 갑부였던 그는 영국에도 거주했던 친영(親英) 성향의 기업인. 한창때 식민지 전체의 관세 3만파운드보다 많은 연 3만7,500파운드의 수입을 밀수를 통해 거두던 그는 영국의 감시가 심해지지 반영(反英) 대열로 들어섰다. 1768년 그의 밀수선 ‘리버티호’가 세관에 압류 당한 뒤부터는 적극적인 행동파로 변했다. 동인도회사가 싣고 온 실론산 차(茶)를 바다에 던져버려 독립전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보스턴 차 사건’도 차 무역이 활성화할 경우 타격을 우려한 그의 주도로 일어났다. 독립전쟁 이후 의회 의장,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지낸 그는 1793년 10월8일 자손을 남기지 못한 채 56세로 사망했으나 소설가 헤밍웨이를 포함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다. 보험회사와 뉴욕의 건물은 물론 구축함에도 그의 이름이 걸려 있다. 기업 출신 미국 정치인들의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 강경성향도 여전한 것 같다. 밀수업자에서 영웅으로 변한 그와 석유업을 거쳐 대권을 잡은 부시 대통령 부자도 닮은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