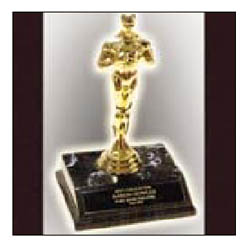|
1929년 5월16일 저녁, 할리우드 루스벨트호텔.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열렸다. 행사 소요시간은 단 15분. 긴장감도 없었다. 수상자와 수상작이 2월 말에 발표됐기 때문이다. 여우주연상을 받은 22세의 신인 여배우 재닛 제이너마저 고향인 함부르크를 방문한다며 불참하고 행사 후 식사도 부실했지만 주최 측은 ‘성공’을 자축했다. 무엇보다 밑지지 않았다. 거저 빌린 호텔에서 참석자들에게 요즘 가치로 380달러에 해당되는 1인당 10달러를 참가비와 식대 명목으로 받았으니까. 대회를 주관한 스타 출신의 영화제작자 페어뱅크스부터 이재에 밝은 사람이었다. 미국 정부가 1차 대전 전비조달을 위해 발행한 ‘자유공채’를 일반국민에게 쪼개 팔아 채권대중화 시대를 열고 증권브로커회사까지 차렸던 그의 영향 때문일까. 아카데미상은 처음부터 짙은 상업성으로 출발했다. 호황의 끝자락에서 진행된 1회 시상식과 달리 2회부터는 대공황기에 열렸지만 오히려 관심은 더 높아졌다. 라디오 생중계가 시작된 덕분이다.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아카데미상 트로피를 받은 작품들은 불경기에도 대박을 터뜨렸다. 흥행 보증수표로 떠오른 것이다. 요즘도 마찬가지다. 창고로 보낸 필름마저 오스카상을 받으면 재개봉되고 관객이 몰려든다. 76회 시상식에서 11개 부문을 휩쓴 ‘반지의 제왕’이 촬영된 장소인 뉴질랜드는 관광수입 증대는 물론 콘텐츠 사업 진흥이라는 덤까지 얻었다. ‘미국 문화제국주의의 상징’ ‘예술성을 중시하는 유럽의 영화제와 달리 미국 일변도’라는 비평과 수상작의 흥행효과가 이전만 못하다는 지적에도 아카데미상의 위력은 여전하다. 한국은 80년 역사의 아카데미상과 인연이 거의 없다. 단 한번 호주 교포가 애니메이션 부문 감독상 후보에 올랐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