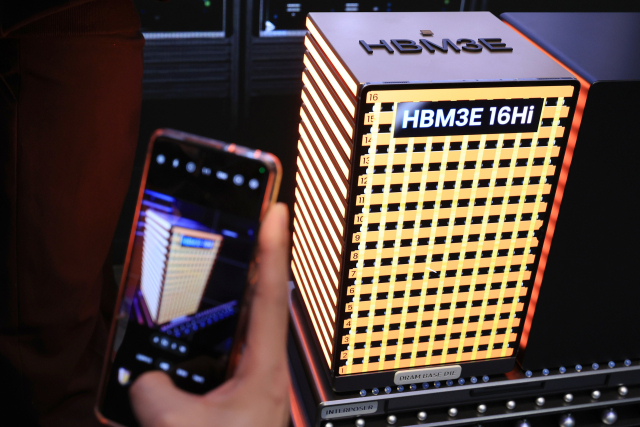오바마 "실업률 치솟는 상황 지켜볼수만은 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자리 만들기에 정책의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달 실업률이 10.2%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은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각료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실업률이 치솟는 상황을 앉아서 지켜볼 수는 없다"면서 "우리는 이제 경제를 치료하는 첫 단계를 시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가 국가 안보나 내년 예산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방점은 실업문제에 찍었다. 그는 "기업들이 투자를 재개하고 고용을 늘릴 때까지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일자리 문제를 강조한 것은 미국의 실업률이 26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해결될 조짐은 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규모 부양정책으로 지난 3분기 미국 경제가 3.5% 성장하는 등 경제의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고 있지만 이것이 신규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높은 실업률은 점차 고착화하고 있다. 전미실물경제협회(NABE)가 48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업률은 내년에 평균 9.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이번 침체로 발생한 730만 명의 미국인 실업자가 완전히 구제되려면 2012년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늘어난 실업자로 인한 사회 불안도 높아지고 있다. 재취업 기회가 줄어들면서 실업수당마저 끊긴 실업자들은 거리의 부랑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생계형 범죄 증가로 인한 치안문제도 걱정이다.
위기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실업자가 늘면서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WSJ은 2008년 자살 관련 통계가 나온 19개 주의 기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만5,3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전년 대비 2.3%의 증가를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에서 자살률이 늘어 플로리다는 6%가 증가했고, 노스캐롤라이나는 7.8%, 아이오와는 13%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크리스토퍼 럼 교수는 경기침체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논문에서 "실업률이 1% 높아지면 자살률은 1.3%가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럼 교수는 과거 대공황과 마찬가지로 이번 금융위기에도 증시 폭락 등 위기의 실체는 금세 다가오지만 실업률은 한 두 해가 지나면서 더 높아지게 돼 경기침체가 자살로 이어지는 현상은 점증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업자 증가는 정치적으로도 큰 짐이다. 이달 초 실시된 버지니아ㆍ뉴저지 주지사, 뉴욕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모두 패배한 것도 경기침체로 싸늘해진 민심이 집권당에서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8,00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자금을 쏟아 부은 결과 소비가 살아나고 경기가 회복되는 등의 성과를 얻었지만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벤트를 만들어 대통령과 집권당이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최선인 셈이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추수감사절을 앞둔 상황에서 민심을 다독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아시아 순방 직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12월 중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중소기업 대표, 경제학자, 금융전문가, 노동계 및 공익기관 대표 등이 백악관에서 모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