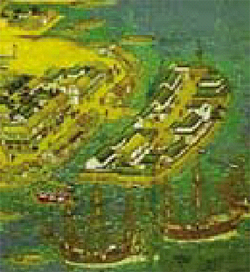|
1634년 6월23일 나가사키. 인부들이 바다를 메우기 시작했다. 목표는 미니 인공섬 건설. 기독교금지령에도 몰래 선교에 나서는 포르투갈 상인들을 몰아넣기 위해서다. ‘출도’(出島ㆍ데지마)로 이름 붙여진 인공섬의 면적은 3,969평. 매립과 부채꼴 부지 조성, 숙소ㆍ창고 13동 건립에 은(銀) 300관(3억7,756만원)이 들었다. 1636년 완공된 데지마에 갇히게 된 포르투갈 상인들은 불만이었지만 더 큰 일이 터졌다. 시마바라에서 기독교도의 반란(1637년)이 일어난 것. 가까스로 진압한 막부정권은 포르투갈을 영구 추방하는 한편 쇄국령을 내렸다. 데지마의 다음 주인은 네덜란드. 유럽식 건물을 포함, 주거용과 창고 50동이 넘는 대형 히라도(平戶)상관을 유지해온 그들은 데지마로 옮기라는 명령에 낙담했지만 누계 707척의 선박으로 대유럽 무역을 독점하며 막대한 이익을 쌓았다. 연간임대료 은 80관(1억여원)은 껌값. 1715년에는 은 3,000관의 수익을 거뒀다. 일본의 주수출품은 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1776년)에 ‘일본의 은’이 언급될 정도로 세계로 퍼졌다. 조선 도공의 후예가 만든 도자기 3만점이 한꺼번에 실려 나간 적도 있다. 막부는 수입 후추 등을 조선에 재수출,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일본이 얻은 가장 큰 이익은 지식. 총과 대포 등 무기류는 물론 1만여권의 서양 서적이 난학(蘭學ㆍ서양학) 붐을 일으켰다. 개항(1854년) 당시 네덜란드어를 구사하는 인력이 수백명 있었다. 데지마는 세계를 엿듣는 감청기지였던 셈이다.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송곳만한 땅을 통해 세상을 파악하고 있었던 일본, 그리고 소중화의식에 젖어 있던 조선. 데지마는 양국의 차이를 함축한다. 근대화의 속도 역시 여기서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