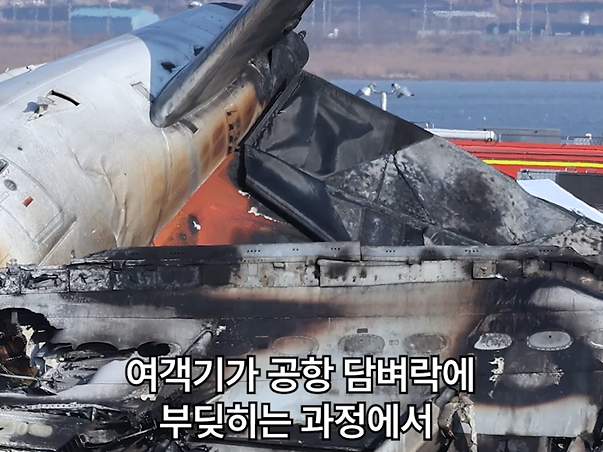달라진 경제현실을 반영하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는 이 총재의 인식에 공감한다. 현재의 GDP 통계 방식으로는 인터넷·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공지능(AI) 등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한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경제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데 80년 묵은 GDP 잣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는 격이다.
원래 GDP는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의 생산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졌다. 프랑스·미국 등에서 수년 전부터 GDP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온 것도 GDP의 효용성이 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2011년 아예 “GDP는 틀렸다”고 단언했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특집기사에서 GDP의 오류를 집중 분석하기도 했다.
이 총재의 언급을 계기로 우리도 GDP 대체지표 개발을 고민해야 할 때다.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통계는 정부의 정책오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장바구니 물가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물가통계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국가예산처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체감물가가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런 통계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