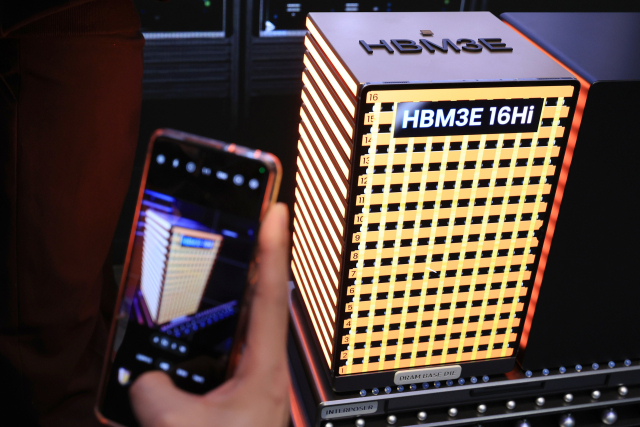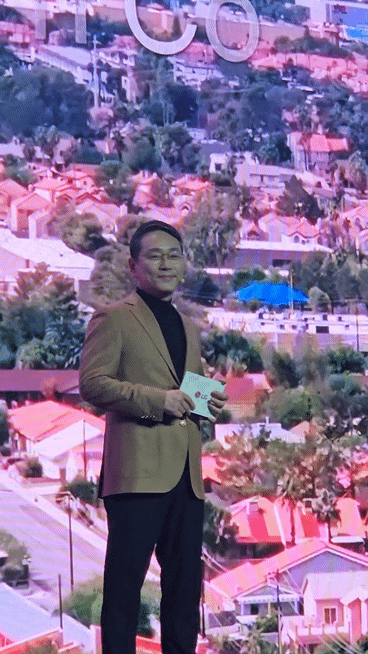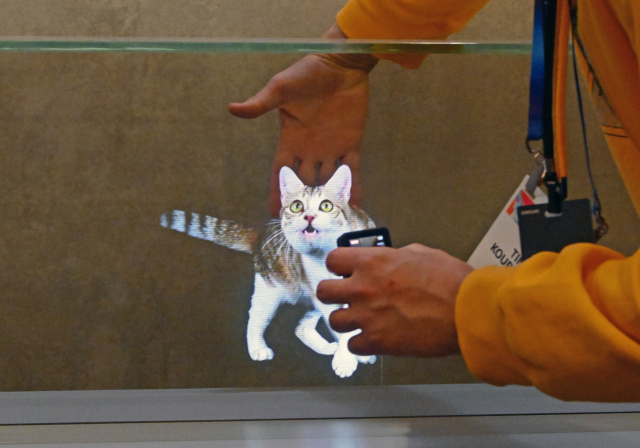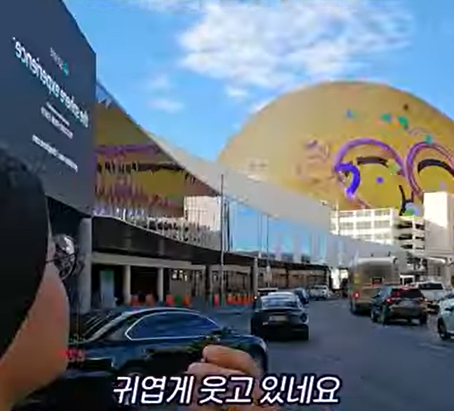이렇게 따오기는 설화·민담에 자주 등장할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겨울 철새였다. 19세기 말 한국을 답사한 폴란드 조류학자 부아티수아프 타차노브스키는 서울 근교에서 따오기떼를 자주 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따오기는 사람과 친해지면 경계심을 푸는데 이 때문에 사냥꾼에게 쉽게 노출된 모양이다. 1880년대 조선에 머물던 영국의 조지프 캠벨은 ‘따오기는 사냥총에 밥이 되는 새’라고 썼다.
그렇게 하나둘 보이지 않더니 1978년 12월 경기도 파주에서 한 마리가 관찰된 후 아예 사라졌다. 일본도 마찬가지여서 에도시대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서식했으나 남획과 환경변화로 급감했다. 2003년에는 마지막 남은 한 마리마저 죽었다고 한다. 중국 역시 상황은 비슷했지만 대처는 달랐다. 멸종 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해 1989년 세계 최초로 인공번식에 성공한 것.
천신만고 끝에 종(種) 보존에 성공한 중국은 따오기를 판다·황금원숭이·타킨과 함께 4대 보물로 애지중지하며 외교에 활용하고 있다. 1998년 장쩌민 당시 중국 주석이 따오기를 일본에 우정의 징표로 기증하겠다고 약속한 게 시작이다. 우리에게도 2008·2013년에 선물한 바 있다. 중국 따오기를 번식시켜 우리나라와 일본은 현재 200~300마리가량으로 개체 수를 늘린 상태다.
9일 한중일 정상회담차 일본을 찾는 리커창 중국 총리가 따오기 2마리를 추가 기증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소식이다. 양국관계 악화로 ‘따오기 외교’가 끊긴 지 11년 만이다. 마침 올해가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이어서 좋은 기회로 판단한 듯하다. 일본도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니 동물을 이용한 중국 외교술이 효험을 발휘하는 것 같다. /임석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