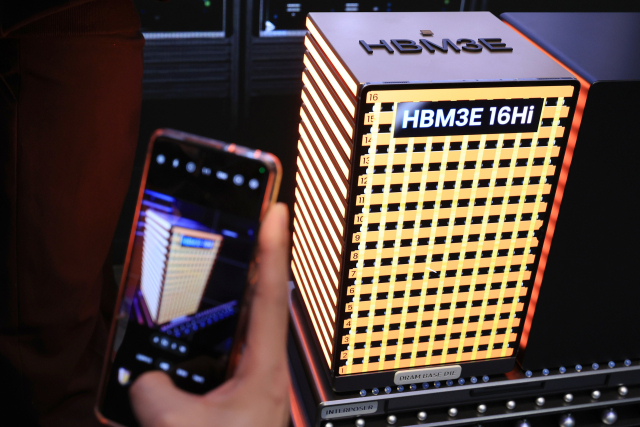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
처음에는
없는 것이 생겼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그래도 남아 있는 모래언덕처럼
우리는 조용한 모래 꿈꾸는 모래였지
고요한 곳에서 혼자 멈춰 있던 고운 입자
바람과 만나야 살아나서
둘이어야 춤추게 되어서
그러다가도
또 바람 때문에 모든 것이 부서져서
오랜 시간 속에서 곱게 다듬어져
안 보이는 손에 의해 의미를 가지다가
바람과 모래의 인연이 우리를 여기로 불렀지
이렇게 함께 겪는다는 것이
또 어렵사리 처음이 되는 것이지
저 수많은 모래알들이 낱낱이 이별로 이루어져 있군요. 한때는 견고한 무엇의 일부였으나 기어코 손을 놓쳐 버렸군요. 멀어질수록 부서지고 작아지면서 속울음 울던 것들이었군요. 슬픔도 슬픔끼리 모이니 비빌 언덕이 되는군요. 강의 하류엔 젖은 사연들이 떠올라 풀등이 되었는걸요. 슬픔도 가벼워지니 바람을 타기도 하고, 파도에 춤추는군요. 오래된 이별끼리 만나 다시 처음이 되는군요. 오월 바람에 날아오는 정향나무 꽃향기는 무엇과 이별하고 새로운 처음을 찾아오는 걸까요. <시인 반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