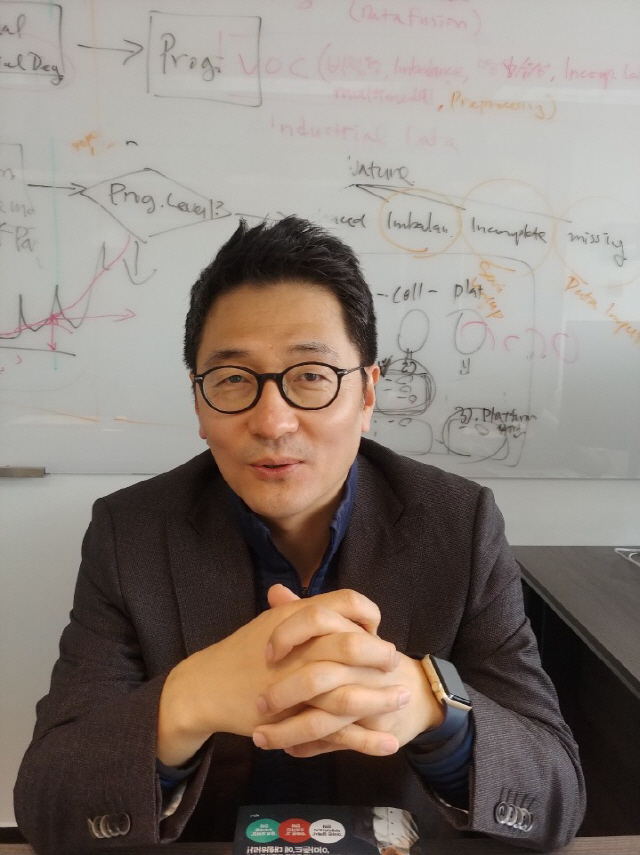“교수에게 정부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줄 때나 대학의 승진 업적평가에서 이공대조차 창업 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혁신성장’하겠다며 대학의 도전정신이나 창업가정신을 아무리 강조해도 허공에다 외치는 것밖에 안 돼요.”
벤처기업가인 윤병동(49·사진)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지난 20일 서울대 연구공원에서 기자와 만나 “교수 업적평가나 R&D 과제평가가 논문이나 특허 위주여서 교수의 기술이전은 물론 연구실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매출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 등을 거친 그는 2016년 공장 등 산업현장의 오류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첨단 솔루션 기업인 원프레딕트를 창업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미국·독일 등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며 고용도 이미 30명이나 창출했다.
글로벌 강소기업을 꿈꾸는 윤 교수는 “서울공대마저도 400명 가까운 교수 중 창업자는 수십 명 있으나 진지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몇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전했다. 정부가 교수나 연구원의 기술 기반 창업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평가 시스템을 바꿔야 벤처 창업 문화도 조성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교수 업적평가가 좋아야 정부 과제도 잘 따는 현실에서 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이 창업 등 책임자의 우수성을 일정 부분 반영해 이공계 교수가 창업에 도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교수나 연구원이 창업해도 당장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논문이 줄어 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굳이 감수하겠느냐는 게 그의 지적이다. 미국이 교수 평가에 논문 등 정량적 평가는 물론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 특허 사업화, 매출, 사회 기여, 콘텐츠 등에 대한 정성평가를 포함하는 점을 참고하라는 얘기다.
윤 교수는 “정부나 대학이 정량평가에 치중하는 바람에 이공계에 창업 아이템이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벤처지원금이 있는데도 창업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기술이전이나 기술 기반 창업 모두 태부족인 게 대학의 현실”이라고 털어놓았다.
정부가 현장 맞춤형 리더십을 행사하고 대학에서도 창업과 기술이전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단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왔다. 정부 연구비를 따면 약 30%는 산학협력단(단과대와 학과 포함)이 간접비로 징수하는데 여전히 연구자가 행정업무를 하느라 낭비가 크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대학은 전반적으로 미국처럼 특허 출원을 잘 돕거나 교수의 기술을 기업과 연결해주는 것이 부족하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실제 대학이 교수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만큼 미국처럼 교수와 기업을 잘 연결하면 모두 윈윈할 수 있는데 국내 대학은 특허를 관리·활용하지 못하고 3년 이상이 지나면 헐값에 처분하고 마는 게 현실이다.
결국 교수의 논문이나 특허가 산업에 거의 활용되지 못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윤 교수는 “특허를 위한 특허, 논문을 위한 논문을 만드는 것이지 산업에 기여하기 위해 특허나 논문을 내는 게 아니다”라며 “(연 6만개가 넘는) 정부의 R&D 과제 성공 판정률이 98%라고 하는데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열에 하나도 안 될 것”이라고 답답함을 표시했다. 국내 최고의 서울대조차 특허수입이 연 50억원 정도에 그치는 등 국내 대학의 특허 사업화 부진은 고질병이 됐다.
그는 “정부 R&D 시스템도 미국처럼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부정이 있으면 엄격히 단죄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반대”라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정부가 교수와 연구원의 창업이나 기술이전이 원활히 이뤄지게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혁신성장의 선순환을 꾀할 수 있다”며 “학생들도 처음부터 창업에 도전하는 것보다 좋은 벤처에 들어가 충분히 경험을 쌓은 뒤 창업을 해야지 섣불리 뛰어들면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