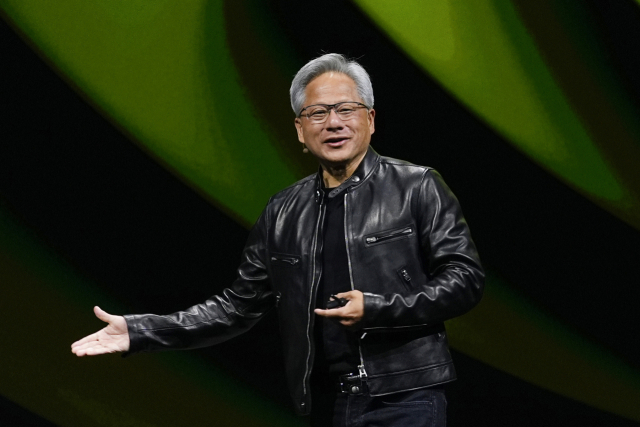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막히면 돌아서 간다. 직진만 하거나 거슬러 오르는 물줄기도 없다. 산꼭대기의 작은 샘물이 거대한 바다를 이루는 이치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국가의 정책이나 정치 역시 그래야 한다. 그래서 노자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上善若水)’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물’인가. 최근 2년 동안 가파르게 뛴 최저임금과 노동집회의 폭증, 각종 경제지표, 적폐청산 등을 보면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과 지금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데는 따뜻한 가슴 못지않게 냉철한 머리가 필요하다. 모든 것은 상황과 처지에 맞게 물 흐르듯 실행돼야 한다. 그래야 길게 갈 수 있고 비로소 세상이 바뀐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말이다.
얼마 전 이사를 했다. 2년 전 이삿짐을 맡긴 업체에 다시 문의를 했다. 그동안 이삿짐이 변한 것은 별로 없다. 이사하는 위치도 집 주변이다. 그런데 이삿짐센터가 부른 값은 2년 전보다 20%나 높았다. 이유를 묻자 대뜸 “최저임금이 올라서요”라는 생뚱맞은 대답이 돌아왔다. 하루 8시간 일해 15만원 정도 받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핑계를 댄 것이다. 값을 올리고 싶으면 무조건 최저임금을 갖다 붙이는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다. ‘기승전 최저임금’ 사회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다. 현 정부 출범 후의 급격한 인상을 감안해 동결론은 물론 깎아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하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전과 달리 수세에 몰렸다. 그만큼 2년간 30%가량 급하게 오른 최저임금의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얘기다. 위원장마저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총은 급기야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밀어붙인 정부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이제라도 새로운 최저임금 물줄기를 만들어야 한다. 막히면 돌아가거나 잠시 쉬어 가는 것도 괜찮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회신고는 총 6만8,315건으로 5년 전의 4만3,071건에 비해 57%나 급증했다. 올해도 전체 집회는 지난달까지 3만4,275건이나 신고됐다. 이 가운데 노동집회는 1만6,580건으로 비중이 해마다 늘어 48%를 넘어섰다.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는 방증인데 이 가운데서도 ‘촛불 청구서’로 불리는 노동계의 요구가 가장 많다는 것이 데이터로도 입증된 셈이다.
하루 평균 100여건의 노동집회가 전국 도심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은 현 정부가 지향하는 노동 존중과 인권 신장, 그리고 표현·집회의 자유의 확대에 따른 결과다. 제 목소리를 자유롭게 낸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문제는 이렇다 할 브레이크가 없다는 점이다. 민주주의는 들판에 내버려진 풀이 아니다. 무성한 잡초는 뽑아주고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도 해야 하는 나무다. 자유와 인권의 확대에 어울리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라야 한다.
최근 한 진보인사와 저녁 식사를 같이했다. 그는 선거에서 뽑힌 단체장이다. 이름만 대면 금방 알 만한 유명인사다. 술이 몇 순배 돌아가자 대뜸 그는 ‘과잉’을 화두로 꺼냈다. 단기간에 각종 인권과 자유로움의 과잉이 발생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 남녀, 학생,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곳곳에서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다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의 규제 혹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솔직한 진단이었다. 하지만 그는 ‘진보의 배신’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 두려워 이를 감히 함부로 입 밖에 꺼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개인과 집단의 자유가 확대되는 만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공공의 질서가 유지된다. 공권력 강화나 불법 폭력집회에 대한 엄중한 단속 등이 그것이다. 이는 시골 장터든 광화문광장이든 진보든 보수든 평등하게 적용돼야 할 황금 잣대다. 우리가 누릴 더 큰 자유로움을 위해서다. 자유와 질서는 날아가는 새의 두 날개와 같다. 어느 하나가 다치면 방향을 잃거나 추락한다. 우리는 어느 순간 한쪽 날개만 커져 방향을 잃은 새가 된 것은 아닐까. /han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