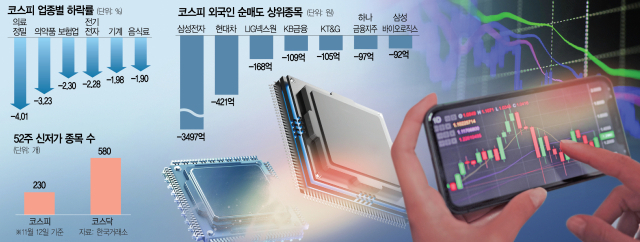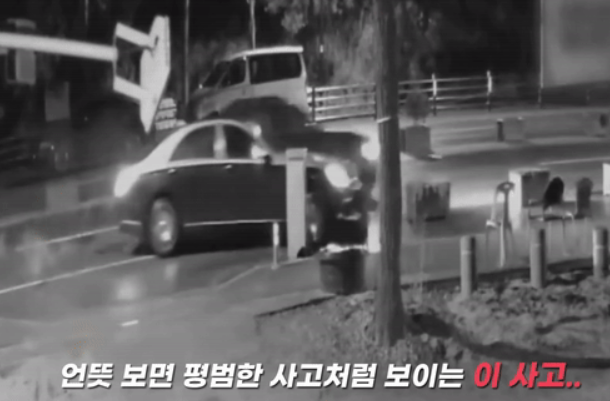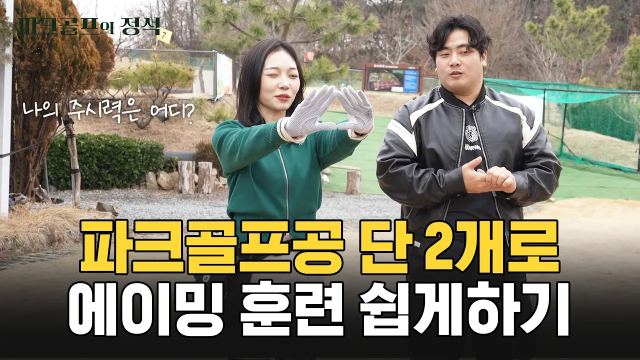1960~80년대 재무부(기획재정부의 전신) 이재국에는 예금과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사무관이 한 명씩 있었다고 한다. 이들이 칠판에 금리를 적으면 은행은 그대로 예대 금리에 적용했다. 과장을 조금 보태면 사무관 한 명이 나라 전체 돈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던 시절이었다.
그 때의 추억이 달콤해서일까.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금융정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금융위원장이었던 최종구 전 위원장은 2019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췄다. 자영업자들은 정부를 추켜세웠지만 비용은 국민이 지불했다. 수수료 인하로 수익원이 줄어든 카드사는 ‘60개월 무이자 할부’와 같은 일반 고객 혜택을 줄여 손실을 보전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때는 15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금지(2019년 12월) 조치가 나왔다. 부동산과 가계대출을 제어하기 위한 극약처방이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초고가 주택은 거래 절벽 속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금수저’와 현금부자, 해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이들 주택을 사들여 단기간에 수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도 주담대가 막혀 좋은 주택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풍선효과로 중저가 주택 가격이 들썩여 관련 주담대도 급증했다.
고승범 현 금융위원장은 마이너스통장 한도 5,000만원 일률 규제를 들고 나왔다. 연봉 수억원의 전문직도 5,000만원까지 밖에 마통을 뚫을 수 없게 됐고, 신용도가 높으면 그만큼 넉넉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금융 상식’을 왜곡시켰다. 규제 시행 전 막차 수요도 몰리며 현장의 혼란도 커졌다.
문 정부 금융정책을 돌아보면 박수 받을 일도 분명 있었다.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과감한 조치로 조기에 시장 안정을 이끌었다. 인터넷은행 출범으로 금융권에 혁신도 촉진했다. 그러나 개발경제시대 식 투박한 규제는 아쉬운 부분이다. 고도화된 경제에서 행정편의주의식 규제는 부작용과 풍선효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다음 정부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