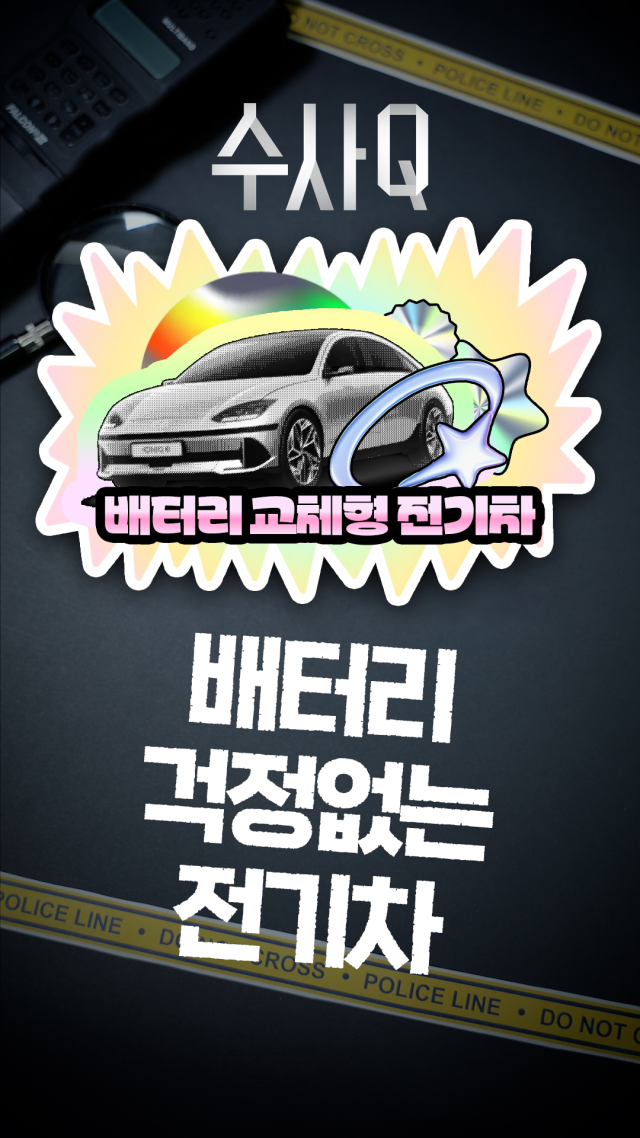“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는 고도 50㎞ 이상의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인데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들은 모두 최고 고도가 40㎞ 이하입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북한이 지난 1월에 일곱 차례나 미사일 도발에 나선 가운데 윤 원내대표는 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하며 사드 도입 무용론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발사한 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드 추가 도입 등을 주장하자 공개 반박에 나선 것이다. 안타깝게도 윤 원내대표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관련기사 6면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1월 일곱 차례 발사한 미사일 중 세 차례에서는 최고 고도(11일 약 60㎞·17일 약 42㎞·30일 약 2,000㎞)가 40㎞를 넘었다. 이 중 30일의 최고 고도 약 2,000㎞는 북한이 화성-12형을 일반적인 발사 각도보다 높이 쏘는 고각발사 방식을 통해 구현했다. 이를 통해 화성-12형을 마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처럼 사거리를 약 800㎞까지 줄여 탄착시켰다. 북한은 앞서 2017년에도 화성-12형을 고각발사해 사거리 700㎞로 비행시켰다. 약 700~800㎞의 사거리라면 북한 북단의 청진 지역에서 발사 시 서울은 물론이고 주한 미군이 있는 평택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2010년부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등을 참조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왔다. 그 결과 하층 영공에 대해서는 촘촘한 요격망을 갖춰 가고 있다. 최대 요격 고도가 35㎞인 기존의 미국산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함께 최대 40㎞ 고도까지 방어할 수 있는 국산 ‘천궁-2(M-SAM PIP)’ 미사일이 전력화하면서 하층 방어망은 튼튼해졌다.
그러나 40㎞ 이상의 상층 영공에 대한 우리 군의 독자적 방어는 아직 공백 상태다. 공군이 상층 영공 방어를 담당할 국산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의 소요를 제기해 현재 체계 개발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L-SAM의 요격 가능 고도는 약 40㎞ 이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격 가능 고도가 최대 10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계 일각에서는 L-SAM의 최대 유효 요격 고도가 100㎞보다 낮은 70~80㎞ 안팎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70~80㎞ 이상 혹은 100㎞ 이상의 상층 영공에서 한 차례 더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기회를 가지려면 현재로서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육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사드(요격 가능 고도 40~150㎞)나 이지스함에 탑재해 해상에서 발사하는 ‘스탠다드미사일(SM)-3(〃 70~500㎞)’이다. 해군은 SM-3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장착할 수 있는 이지스함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둘 중 어느 하나도 우리 군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그나마 주한 미군이 박근혜 정부 임기 말에 사드 1개 포대를 국내에 반입해 성주 기지에 배치했다. 다만 해당 지역 일부 주민과 시민 단체 관계자들이 수시로 기지 주변 도로를 막고 농성 등을 벌여 주한 미군은 정상적인 사드기지 운용을 위한 물자 반입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조기에 포착할 감시·정찰 자산의 조기 확충도 절실하다. 우선 공군이 지난해 야심 차게 추진했던 ‘E-737’ 조기경보통제기 신규 도입 사업은 반 토막이 났다. 신형 E-737 4대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이었는데 2022년도 정부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사업이 축소되면서 2대만 도입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공군은 현재 또 다른 핵심 감시·정찰 자산인 국산 초소형 위성 사업도 추진 중이다. 총 40여 개의 초소형 위성을 저궤도에 올려 수십 분 단위로 북한의 동향을 탐지하는 프로젝트다. 초소형 위성의 다소 낮은 촬영 영상 해상도는 소프트웨어 기술로 한층 선명하게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초소형 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을 탐지할 수는 있어도 해당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할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이 ‘끈질기게’ 완성형의 미사일 공격 체계를 갖춰가는 동안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은 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냉정한 평가는 현실이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시험대에 서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