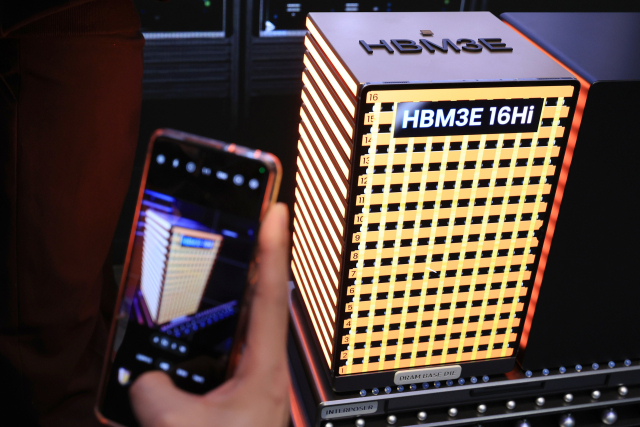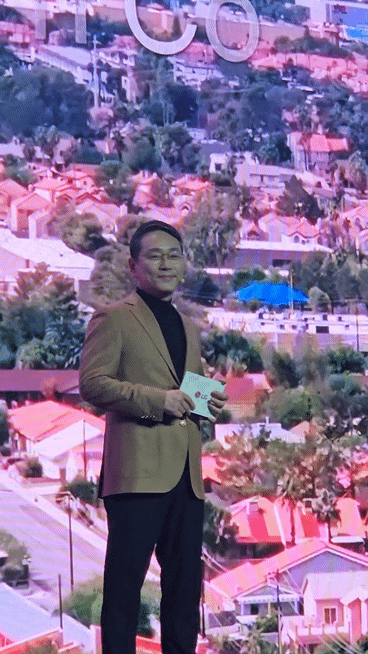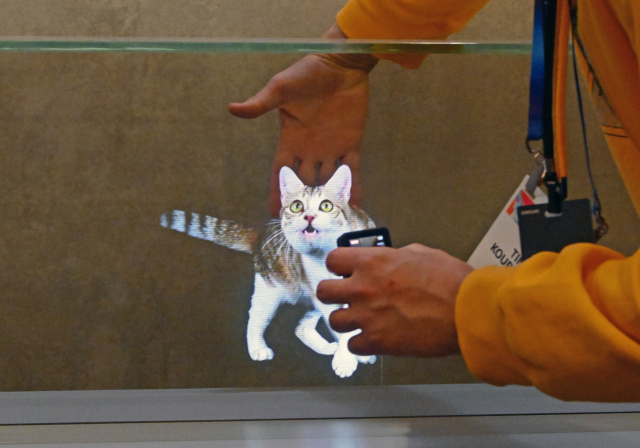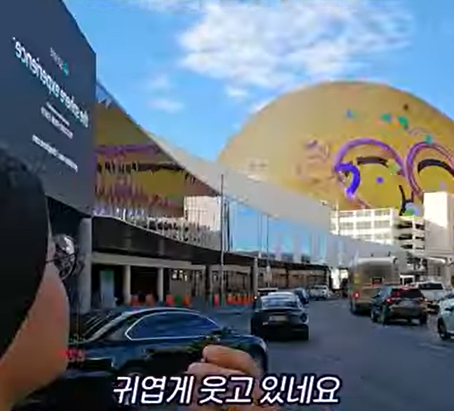유럽이 심상치 않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공포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럽 각국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감소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사상 최악의 폭염, 이탈리아 등 역내 주요국들의 정치 혼란 등 쏟아지는 악재로 유독 혹독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최악의 고비를 맞은 시점에 11년 만의 금리 인상에 나선 유럽중앙은행(ECB)의 결정이 유럽 경제를 어디로 이끌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 1월 5.1%였던 유로존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6월 전년 동월 비 8.6%까지 치솟으며 21일(현지 시간) 금리 인상을 앞둔 ECB의 고민을 깊게 했다. 이날 2011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ECB는 이미 긴축 속도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한참 뒤처져 있다. 연준은 3월 0.25%포인트 인상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1.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공격적인 긴축에도 6월 CPI가 9.1%까지 치솟았다. 11년 만에 겨우 0.25~0.5%포인트를 올린 금리로 유럽의 고물가가 잡힐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경기 침체 우려와 이탈리아·스페인 등 재정이 취약한 회원국 부담 때문에 ECB의 운신은 연준에 비해 훨씬 큰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다. 이날 러시아가 노르트스트림1을 재가동하며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재개했지만 클라우스 뮐러 독일 연방네트워크청장은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가스 공급량이 통상 수준의 30% 정도라고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앞서 공급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어 유럽의 에너지 부족과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앞으로도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중단될 경우 슬로바키아와 체코 등 취약국들이 최대 GDP의 6%에 달하는 타격을 받아 심각한 불황에 빠질 것으로 추정했다.
사상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산불은 가뜩이나 취약한 유럽의 에너지난과 경제 부담을 증폭시키고 있다. 영국은 섭씨 40도의 전례 없는 폭염으로 학교와 병원이 폐쇄되고 기차·항공편도 취소되는 등 경제 활동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경우 가뭄으로 라인강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선박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키엘세계경제연구소는 1개월간 라인강 수위가 낮게 지속돼 독일의 산업 생산량이 약 1% 감소했다고 밝혔다. 루크레지아 레이클린 런던비즈니스스쿨 경제학 교수는 "폭염이 이미 취약한 상태인 유럽 경제를 한계에 이르게 하고 있다"며 "팬데믹에 이은 에너지 비용 대처로 정부 재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재확산되며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에 따르면 유럽 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는 6주 만에 3배나 증가한 상태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도 유럽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당장 이날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의 사임이 확정되면서 금융시장에 불안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ECB 총재 출신인 ‘재정 위기 소방수’ 드라기의 퇴장은 “10년 전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나쁜 기억을 되살린다"고 AP통신은 평했다.
9.4%까지 치솟은 물가 상승률로 곳곳에서 파업이 확산되고 있는 영국 역시 보리스 존슨 총리의 뒤를 잇는 차기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사실상 국정이 마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총리 후보는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과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으로 좁혀진 상태지만 차기 총리가 취임하는 10월까지 정부의 정책 대응은 전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