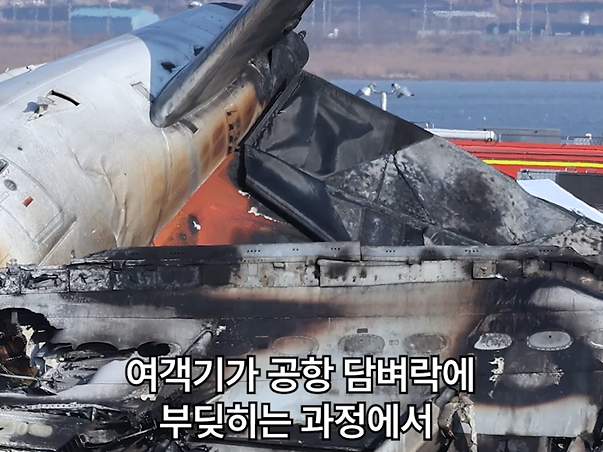오는 2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는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모여 북핵문제에 대한 첫 번째 다자협상을 갖는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벼랑 끝으로 전개되던 북핵문제가 드디어 `다자협상의 시대`로 돌입한 것이다.
그런데 설마하고 우려하였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대한민국 외교사에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 다시 일어난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국민의 생존과 안녕에 직결된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직접적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중국, 북한 3자가 논의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외교사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21세기 한국외교가 다자협상이라는 시험무대 위에 올라서기도 전에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국익을 담보하기 위한 외교적 권리를 상실하고 만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53년, 지금과 똑 같이 한국을 배제한 3자회담이 진행된 적이 있다.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 사령부와 중국, 북한은 한국의 참여 없이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그 당시에 남한의 이승만 정권은 남북통일에 반한다는 이유로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정전협정에 한국이 불참함으로써 우리는 지난 50년간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마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엄청난 외교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50년이 지난 오늘 북핵문제 논의를 위한 다자회담에서 한국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모양새와 체면보다는 회담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북핵문제는 “애당초 북미양자(사이의 문제)였으며 새삼스럽게 (우리가)끼어들겠다고 하면 처음 논리에 맞지 않고 (회담의) 성격을 흐릴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는 논리적 모순일 뿐이다. 과연 우리가 북핵 관련 다자회담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라는 사활적인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체면이나 모양새를 위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 그렇다면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주장하던 당사자 해결 원칙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론은 체면과 모양새를 위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
민족의 생존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이라면 우리의 국익을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다자협상에서 한국의 참여를 주장해야 했다. 최소한 남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관철시켰어야 했다.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
<박진(국회의원ㆍ한나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