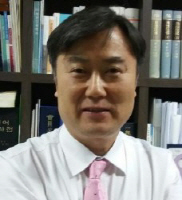1592년 4월 13일(음력) 일본은 15만 대군을 이끌고 기습적으로 조선을 침입한 후 불과 18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다. 그러나 조선의 반격 또한 매서웠다. 전쟁개시 20여일 후 조선해군은 옥포 앞바다에서 한 척의 전함손실 없이 무려 26척의 적함을 격파한다. 그 후 연이은 해전에서 일본해군은 속절없이 무너진다. 개전 3개월도 되지 않아 한산도에서 주력이 궤멸되고, 안골포와 부산포의 패전으로 재기불능 상태가 되는데, 이는 조선의 국력이나 과학기술이 일본보다 한참 앞섰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바다를 통한 병참지원이 불가능해 전쟁능력을 상실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침략을 보다 못한 조선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자 일본군은 고립무원의 신세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적장인 고니시 유키나가는 200년 전 진포해전과 황산전투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악몽이란 근 10만의 왜군이 고려를 침공했다가 진포해전에서 최무선 장군의 함포공격으로 수백척의 군선을 몽땅 잃는 바람에 지리산 골짜기에 숨어들었다가 일본으로의 도주로를 뚫기 위해 벌인 황산전투에서 깡그리 섬멸된 일이었다. 그러나 굳이 이런 역사가 아니더라도 제해권을 뺏긴 일본군이 독안의 쥐를 면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일본은 조기철수를 시도하지만 진격보다는 후퇴가 더 어려운 게 병법의 기본이라 낭패가 이만저만 아니었다.
그런데 이 때 일본에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왔다. 조선의 조정이 자국 해군에 힘을 실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견제하고 나섰다. 그 바람에 조선의 해군은 전투보다는 식량과 군사를 이천리 북쪽의 왕에게 보내고, 매사를 사사건건 조정에 보고하느라 일본군의 해상보급로 차단에 나서지 못했다. 게다가 조선조정은 전쟁의 주도권은 물론 강화협상권을 명에 넘겨버렸다. 이를 본 일본은 쾌재를 부르며 명조에 뇌물을 뿌리고, 명군을 구워삶았다. 이 때문에 조선해군은 바다를 차지하고도 15만에 이르는 일본군 철수선단을 공격하기는커녕 구경도 못했고, 일본은 대병력의 무사철군은 물론 재침의 기회까지 갖는 기적같은 행운을 누렸다.
세계사에서 해전의 패배로 보급이 차단되면서 고립된 군대가 참패를 면한 예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당시의 조선은 자국군을 억압하면서 막상 명군에게는 막대한 식량과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명의 파병은 일본이 제해권을 잃은 후 이뤄진 일이라 전쟁의 대세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조선의 조정은 명조와 명군에게 아첨하기에 바빴다. 왜 그랬을까?
그 까닭은 역사에 있다. 당시 조선의 위정자들은 200년 전의 진포해전과 황산전투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있었다. 더 나아가 진포해전을 깎아 내리고 황산전투의 승리를 부각시킴으로서 변방의 일개 장수에 불과했던 이성계가 정권을 잡고, 왕조를 연 일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다 수도와 백성을 내팽개치고 맨 먼저 도망을 쳤던 조정으로서는 백성의 손으로 이뤄지는 승리야말로 반역의 씨앗이자 자신들의 치욕이라고 단정했던 것이다.
이러한 조선 권력자의 인식은 얼마 안 있어 비극을 몰고 온다. 1596년 전쟁의 참화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실정을 감추기 위해 왕실의 서얼(이때 왕도 서얼의 자식이었다)인 이몽학에게 백성을 선동했다는 구실을 붙여 역모로 몰아 조정에 비판적인 백성들과 함께 학살했다. 그 틈에 역도를 동정했다는 이유로 백성의 신망이 높은 의병장들을 남김없이 체포한 뒤 김덕령과 최담령의 목숨을 앗고, 곽재우, 홍계남을 불구로 만들었다.
더 나아가 이듬해 초에는 일본의 간계에 속는 체하면서 해군사령관 이순신을 죽이려 하지만 백성들의 원성이 높자 겨우 목숨만 붙여놓는다. 그 뿐 아니다. 이순신의 투옥에 자신감을 얻은 일본이 재침을 해오자 이순신 대신 지휘봉을 쥔 원균에게 졸병들 앞에서 곤장을 쳐서 치욕을 안긴 후 무작정 진격을 명했다. 이 때문에 정찰도 없이 전투에 나섰던 조선해군은 1597년 7월 칠천량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1592년 봄에 시작된 전쟁은 1598년 말에 종지부를 찍고, 그 후유증으로 일본은 토요토미 가문이 멸망하고 도쿠가와 가문으로 정권이 바뀐다. 그리고 중국은 명조가 망하고 청조가 들어선다. 하지만 조선의 권력은 요지부동이었으니, 나라와 백성이야 어찌되었건 권력자의 의도는 기대이상으로 충족된 셈이다. 이런 역사를 본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나라의 주적이 과연 호전적인 외적인지, 이기적인 권력인지, 아니면 둘 다 인지를 냉정히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다./문성근 법무법인 길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