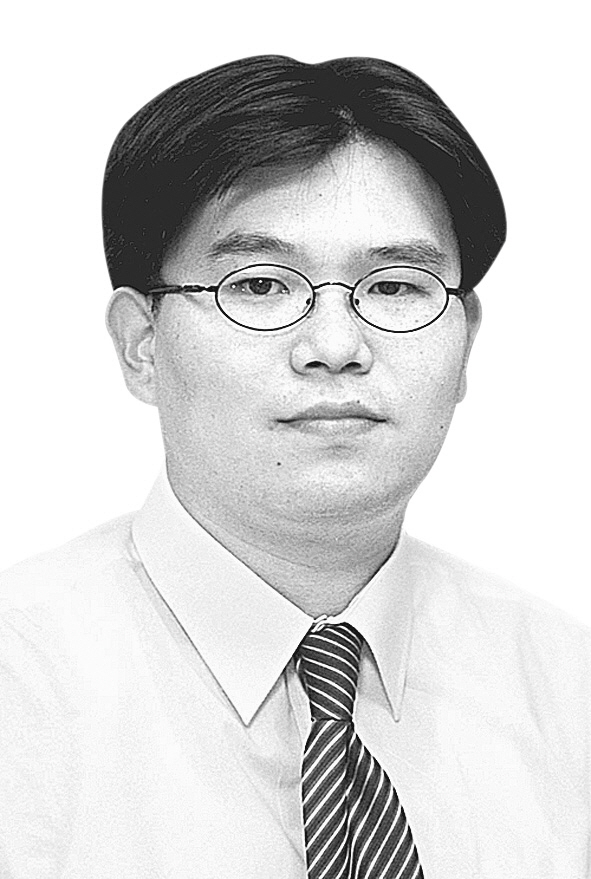최근 전기차 보조금 논란이 뜨겁다.
우선 국적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부 국가들이 이미 노골적으로 자국 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 근거다. 비싼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보조금의 목적이 전기차 보급을 통한 환경보호인 만큼 중저가 모델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얼핏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사정이 달라진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에 판매된 전기차 중 전기승용차는 총 1만6,35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크게 꺾지는 못했다.
판매량은 큰 변화가 없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전기승용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무려 564% 급증했다. 시장점유율도 불과 1년 만에 완전히 역전됐다. 지난해 상반기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국내 전기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94%에 달했지만 올해는 54.6%로 쪼그라들었다. 그 사이 수입차는 같은 기간 6.7%에서 45.4%로 약 7배 성장했다. 주인공은 단연 테슬라다. 테슬라는 보급형 전기차 ‘모델3’를 앞세워 올 상반기 7,080대를 팔아 국내 전기승용차 시장점유율 43%를 달성했다. 테슬라에 이어 아우디·푸조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홍수처럼 한국 시장에 전기차를 쏟아내고 있다.
이쯤 되면 왜 지금 전기차 보조금 논란이 불거졌는지 감이 온다. 이대로 가다가는 현대·기아차(000270)로 대표되는 국내 자동차 업계가 안방에서 전기승용차 시장 주도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적별·가격별 보조금 차등지급 아이디어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다. “이미 다른 나라들도 시행하고 있다”는 변명거리도 부족함이 없다.
다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졌다. 바로 고객이다. 올 상반기 극적인 변화를 만든 것도, 앞으로 다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도 고객이다. 전기차 보조금 논란의 맨 위쪽에 고객의 이해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 작업이 여론의 동력을 얻으려면 기술력에 따라 보조금 차등 규모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행거리, 배터리 수명, 품질 안정성 등 고객에게 이익을 주는 기술력을 평가해 보조금 차등을 크게 두는 방식이다. 현재 국가 보조금은 기술력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예 없다.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것은 기술발전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시장 육성도 함께 유도할 수 있다. kmh20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