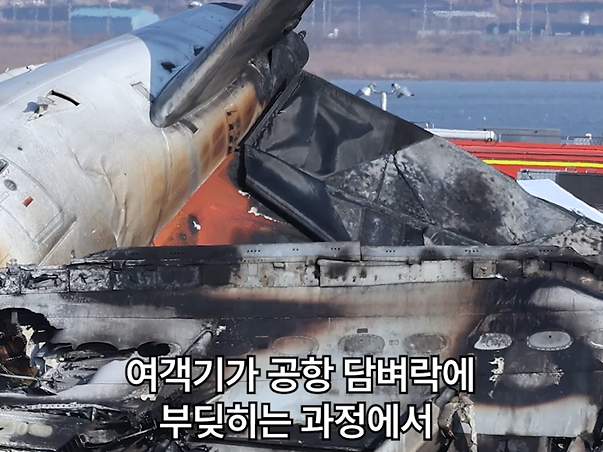◎자금조달 쉽고 규제없어 업체마다 발행 남발/만기짧아 상환부담 “결국 자금난 부르는 극약”「입에 단 것은 몸에 해로운 법」 손쉬운 자금조달수단으로 각광을 받아왔던 기업어음(CP)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기업 부도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진로, 대농, 기아가 한꺼번에 무더기로 교환 회부된 CP를 결제하지 못하면서 부도유예협약 대상으로 선정되자 CP가 비난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의 주요 단기자금 조달원인 CP가 어느 순간 기업의 목을 죄는 극약으로 돌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기업들이 CP 등 단기자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설비투자에 무리하게 단기자금을 끌어 쓰다보니 자금의 조달과 운용의 기간 불일치(mismatch)현상이 심화돼 결국 자금난에 봉착하게 된다.
기업들의 무절제한 투자행태가 1차적인 원인인 셈이다.
제도적인 허점도 CP로 인한 기업 부도를 부추기고 있다. 기업들의 대표적인 단기자금조달창구인 종금사들은 동일기업에 대해 CP할인은 자기자본의 25%, CP매출은 50%로 제한돼 있지만 기업차원에서의 CP발행규모는 제한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개별 기업으로서는 마음만 먹으면 30개 전체 종금사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게다가 할부금융사나 파이낸스사 등 중소금융기관들의 어음할인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어 급하면 이곳저곳에서 마구잡이로 단기자금을 끌어쓸 수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제도적 허점이 기업들의 자금조달 단기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기업들만의 책임으로 몰아부치기도 어렵다. 기업들이 장기로 필요한 자금을 단기자금으로 메꾸는 것은 장기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회사채 발행의 경우 과거에는 기채조정협의회의 물량규제를 받아야 했고 발행절차가 까다로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달부터 회사채발행물량규제가 폐지됐지만 요즘처럼 금융기관들의 신용민감도가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는 손에 꼽을 정도의 기업이 아니고서는 보증기관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다른 자금조달창구가 빡빡하다보니 기업들이 손쉬운 CP발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져 현재 CP를 이용한 자금조달규모는 8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자금사정이 좋을 때야 전혀 문제가 안되지만 조금이라도 자금사정이 악화될 때에는 기업들, 특히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들은 교환에 회부되는 어음을 결제하기에 급급한 처지로 전락하게 되는 상황이다. 종금사 등에 애걸복걸해 만기를 겨우 연장시키더라도 통상 3개월인 만기가 심할 경우 3일짜리로 초단기화되면서 원리금상환부담이 일시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장 금융시장을 뒤흔들면서 대기업 연쇄부도공포를 불러오고 있는 CP에 대해 정책당국의 적절한 통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개별 기업의 CP발행규모 자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 기업의 CP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이를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들의 자금회수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