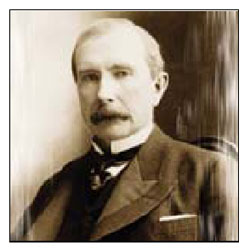|
록펠러(John D Rockefeller). 현존하는 최고 갑부인 빌 게이츠보다 3배나 많은 부를 쌓았다는 그에게는 상반된 평가가 따라붙는다. 자선사업가라는 찬사도 있지만 미국 대통령이 ‘록펠러가 아무리 자선을 해도 죄과는 씻기 힘들 것’이라고 단언한 적도 있다. 1839년 7월8일 독일계 미국인의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그는 16세부터 작은 무역회사에 들어가 회계를 익힌 후 독립, 농산물을 군납하며 30대에 매출 100만달러를 거두는 알부자로 떠올랐다. 인생의 전기는 1863년. 석유가 성장사업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정제업에 진출, 닥치는 대로 정유소를 사들였다. 한때 미국 정제시장의 95%를 차지했던 록펠러식 기업사냥의 특징은 사람과 조직을 그대로 살려줬다는 점. 상대방을 인수하고도 지역 경영은 그대로 맡긴 게 성장의 밑바탕이다. 등유가 범지구적인 상품으로 자리잡은 것도 국내외를 망라하는 그의 광대한 영업망 덕분이다. 초기의 미국 석유업자들이 멕시코와 베네수엘라 등지의 유전 개발에 나선 이유 역시 미국 내에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독과점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국내시장 점유율이 차츰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조명용으로만 사용되는 석유의 쓰임새가 자동차용 휘발유로 넓어지면서 록펠러는 세계 최고 갑부의 자리를 굳혔다. 대법원의 해체명령(1911년)으로 스탠더드 오일이 34개 회사로 쪼개졌을 때도 록펠러의 재산은 오히려 늘어났다. 독립된 회사들의 주가가 두 배로 뛴 덕분이다. 말년의 그는 자선사업에 뛰어들어 99세라는 천수를 누리기까지 전재산을 사회에 바쳤다.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총칼로 진압했어도 그는 자선사업가로 기억된다. 자선과 기부의 생명력은 풍요와 악명보다 훨씬 오래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