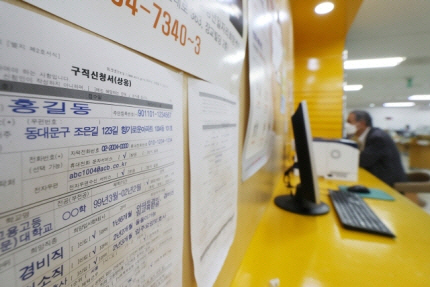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맹점은 ‘고용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실업급여를 타가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역차별 우려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한 번도 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직이 잦은 특수근로종사자(특고)의 경우는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이직률은 5.3%로 집계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의 이직률은 퀵서비스 기사가 63.2%, 생명보험설계사가 57.7%, 택배기사가 34.5%에 달했다. 일반 근로자와 특고종사자의 이직률에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고용부의 이직률에는 일시휴직도 포함되므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 ‘비 자발적 이직’으로 한정하면 비율은 더욱 떨어진다. 지난 7월 기준 비 자발적 이직자는 49만3,000명으로 전체 종사자 1,844만6,000명과 비교하면 2.6%에 불과하다. 기간제를 제외한 상용근로자로 한정하면 0.51%다.
고용보험법은 해고일 전 18개월의 단위기간 중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특고종사자에게 24개월의 단위기간 중 12개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조건을 엄격화했다. 문제는 이직이 잦을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된다는 데 있다.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와 같이 이직이 잦거나 여러 회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는 회사를 옮기고 쉬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재계는 일찌감치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정부 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일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입법 추진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내고 특고종사자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은 별도의 회계를 통해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료를 모아놓은 회계에서 나가는데 특고는 일반근로자보다 이직이 잦으므로 하나로 합쳐서는 안 되고 따로따로 회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회계를 분리할 생각은 없다”며 “사회보험의 특성상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나 고용의 형태별로 고용보험률이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임금의 0.8%를 고용보험료로 부담하는데 재원을 합치고 있으니 특고의 경우에도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 근로자의 역차별 문제는 구직급여 부정수급 논란과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 정규직 사이에서는 일부 비정규직들이 ‘꼼수’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채우고 회사를 나가지 않아 해고 처리되면 이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규직들은 월급에서 원천공제되는 고용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대상이 확대되면 이 같은 ‘역차별’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 캠핑에서 즐겁게 놀자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왜 돈을 내가 잔뜩 부담해야 하느냐’라는 것”이라며 “내가 낸 건강보험료를 갖고 외국인들이 수술을 저렴하게 받는 것과 비슷한 모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