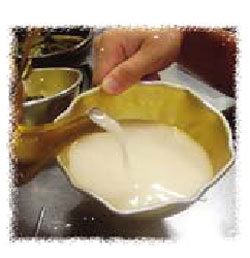|
1977년 12월8일, 전국의 대포집이 북새통을 이뤘다. 14년 만에 등장한 쌀 막걸리를 맛보려는 고객들은 기쁜 마음으로 잔을 따랐다. 1963년 양곡관리법에 쌀로 술을 빚는 행위를 금지한 이래 밀가루 막걸리만 마셔왔으니 맛도 맛이지만 감회가 앞섰다. 쌀의 자급자족을 위해 술 제조를 금지하고 혼ㆍ분식을 장려하던 정부가 규제를 해제한 것은 연이은 풍작 때문. 통일벼 보급으로 생산이 늘고 쌀 재고량도 적정 수준을 초과하자 막걸리 제조 금지를 풀었다. 기대와 호기심이 유발한 쌀 막걸리 선풍은 오래 가지 않았다. 금지의 세월 동안 도수가 높은 독주에 익숙해진데다 막걸리의 품질도 좋지 않았다. 많이 마신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편두통에 시달렸다. 막걸리는 숙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술일까. 그렇지 않다. 제조와 유통의 문제 탓이다. 막걸리의 생명인 효모가 숙성되기 이전에 출고하거나 제조과정에서 잡균이 들어가 효모 생성을 억제했으니 인체에 들어간 후에는 소화가 안되고 머리까지 아플 수밖에. 빨리 숙성시키기 위한 장삿속으로 카바이트 막걸리까지 판매되며 인식은 나빠질 대로 나빠졌다. 요즘 막걸리의 품질은 이전과 딴판이다. 깨끗하고 숙취도 없으며 몸에 좋다. 지역공급제한도 없어졌다. 빚은 지 일주일부터 보름 사이에 소량으로 마시는 생막걸리는 보약만큼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두부 같은 간단한 안주를 곁들이면 한끼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다. 지난 2001년을 바닥으로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현상도 ‘막걸리=웰빙 술’이라는 인식 덕분이다. 아직도 국산 쌀을 100% 사용하는 막걸리는 많지 않은 형편이지만 막걸리의 미래는 밝은 편이다. 양조기술 발달로 유통기한도 다소나마 길어졌다. ‘제대로 만들고 마시면 정말 좋은 술, 우리 막걸리’가 시나브로 부활하고 있다.